김훈의 문장이 좋았다. 부러 따라한 건 아니었다. 그저 가슴에 맺히다 보니 어느새 조금 닮은 듯 했다. 내 글을 쓰는데 남의 문체를 차용한다는 건 생각의 뿌리마저 남의 것이 아닐까란 의심을 낳는다. 하나의 의심은 미욱한 마음을 낳고 나를 채찍질하기 보단 글쓰기를 두렵게 한다. 글쟁이도 아닌 자연인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건 사치일 수도 있다. 허나 누군가에게 사치로 보이는 그 유유자적함이 본인에게만은 절실함일 수 있다. 삶과 바투 이어진 일상의 잗다란 고민을 글로 눅여왔기에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



밥벌이를 하게 됐다.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다들 걱정하지 말란다. 죽을 병 아니면 취업 시켜 준 덴다. 근데 내겐 지극히 걱정되는 사안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를 방기(放棄)하며 살았기에 그렇다. 그건 하늘을 원망함과도 닿아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수렁에 빠지는 일련의 사안들 앞에서 생의 의지가 무참히 흩어졌던 계절이 있었다.
한 때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뒷담화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처음엔 다들 축하를 해주던 이들이었다. 박수가 삿대질로 변해가며 내 마음은 나날이 핍진해져 갔다. 내 선택이니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세상의 짐이었지만 가뭇없이 바뀌는 세상의 인심 때문에 나날이 야위어 갔다. 글에 드러나듯 나는 지극히 섬세하고 인간적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그런 생의 버팀목이 내 선택으로 침강되었으니 애꿎은 하늘만 원망했다. 나를 변명하지 못하고 아픔마저 숨기려하다 보니 구접스런 일상이나마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기 힘들었다. 시절은 그렇게 잔인했다.
그러다 아비가 병이 났다. 나를 감당하기도 힘든 시절에 아비의 아픔은 삶을 뒤흔들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듯 아비는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나는 아비의 어깨에 기대는 게 지극한 공리(公理)였다. 공리가 무너지려하니 핍진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나를 놓기로 했다. 세상이 흘러가는 데로 나를 맡기다 보면 언젠가 벨에포크(La belle époque)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찬란한지도 몰랐던 그 시절이 절절히 그리워 나는 심리적 퇴행을 겪었다. 도망쳤었다.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의 나무람은 여전했다. 삶이 진정 비루했다. 아비를 지키기도 나를 감당하기도 버거웠다. 아비는 끝내 귀천(歸天)했고 그제서야 그들의 언어는 온건해졌다. 허랑한 삶이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봤다. 허나 고민만 깊게 했다. 그런 것들이 미웠다. 최선의 복수는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탐닉이었다. 여전히 인간관계는 두터웠었다. 그래도 상처는 깊었다. 나도 모르게 벽을 쌓았다. 그 벽은 그들만이 아닌 나를 향해서도 겹을 이루었다. 무얼 하고 싶지도, 나를 돌보기도 싫었다. 상처는 곪아갔고 심신을 피폐하게 했다.
르상티망. 난 그렇게 르상티망을 안고 살았다. 패자의 원한이었다. 세상을 감내하지 못한 모자람을 탓하기 보단 세상 그 자체를 욕하는 게 오롯이 정당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지레한 언어에 상처를 받을 때도 나는 안으로 침강하기 바빴다. 그래서인지 니체에 매혹을 느끼는 자들에게선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곤 한다. 그들 각자의 르상티망. 사회적으로 도태된 자들의 자위현상이 니체에 대한 갈망을 낳은 게 아닐까 하는. 결국 사람은 제 자신의 삶으로 타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내게 니체 애호가와 니체란 사람 자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헌데 어느 날부터 그런 미욱함이 시나브로 사위어갔다. 아마 나를 돌아보는 글을 쓰면서일 테다. 블로그에 쓰던 글들은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굿윌헌팅’에서 맷 데이먼이 로빈 윌리엄스의 그림에서 그의 상처를 읽어낼 수 있었듯 내 글에선 나만의 상처가 문장으로 녹아있다.



티핑 포인트가 찾아왔다. 세밑 어느 새벽, 내 베프는 내 옆에서 곤히 잠을 잤다. 책도 티비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움은 실로 간만이었다. 책에 치이고 일상에 근심하던 나를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를 사랑해라’는 잠언이 그렇게 내게로 왔다. 그 이후로 나는 좀 더 열심히 책을 보고 하루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주위 사람을 살갑게 대하며 몇 년간 방기했던 스스로를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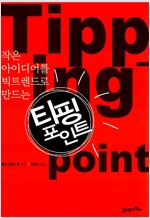


결심은 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한 가여운 마음다짐일 뿐이다. 그렇기에 살도 빼고 다크써클도 없애고 소위 말하는 ‘몸짱’이 되기로 했다. 미디어가 창출해 낸 이상적 신체에 대한 탐닉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바를 증명키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3주 정도 밖에 하지 않았는데 꽤나 갑작스레 밥벌이를 하게 됐다. 툭하면 끼니를 거르고 운동할 시간엔 책 한권이라도 더 읽고 음주가무를 즐기던 생활을 했기에 내 몸은 아직 온전치 못하다. 그 온전치 못함이 신검을 통해 숫자로 드러날까 다소 걱정이 된다. 3주간 무산소운동만 종일 했더니 몸은 더 불었고 혈압은 정상치를 벗어나는 양태(130에서 140사이)를 보였기에 남들이 말하듯 지나친 걱정만은 아닐 테다.
4년 정도 나를 방기했으니 갑절의 시간을 들여 그 그릇됨을 갚아야 한다. 밥벌이를 하며 오히려 더 튼실한 스스로를 발견하고프다. 벤자민 버튼처럼 내 생체 시계도 거꾸로 가게끔 해야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장을 입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곰비임비 일어난다. 약간의 불안과 함께.
덧붙여 나를 언제나 아껴주시고 대학가 두 달 치 월세에 값하는 정장을 사주신 베프의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두 분은 아비의 장례식장에서 6학기에 걸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신다 하시곤 기부가 아닌 나눔으로 그 말을 증명하셨다. 일방적 베풂이 아닌 충실한 말의 이행이었다. 거드름이나 젠체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마냥 그저 당연한 일을 행하듯 그분들은 나를 뒷바라지 해주셨다. 친구 또한 그런 베풂을 한 번도 티내지 않았다. 심리적 우월감이 생길 법도 한데 그는 그전보다 더 자신을 낮췄다. 일전에 이야기했듯 ‘바밤바’란 닉네임은 친구 별명에서 유래했다. 내 베프가 바밤바다. 조르바란 별명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렇듯 나를 지나치게 방기하지 않은 데는 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씀씀이가 부담보다 자랑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밥벌이를 하더라도 글은 꾸준히 쓰련다. 삶과 부딪히며 벼리는 사유가 책과 대화하며 누리는 명상보다 더 살가운 이야기를 해 줄 듯하다. 첫 문단은 우울하고 중간 부분은 침울하며 그 이후론 밝은 이 글의 전개마냥 삶 또한 그리되길 기원해 본다. 마음을 써 누군가에 의탁하는 일의 미욱함을 알지만 그런 미욱함마저 사랑하련다. 불행한 이성주의자보다 행복한 자연인이 되련다. 오늘 점심에 상경해야 한다. 서울도 이곳만큼 따뜻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