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다 훔멜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요한 네포무크 훔멜(1778~1837). 얼마 전 구입한 샨도스 30주념 기념 앨범에 들어가 있던 작곡가다. 그의 이름은 낯설었기에 나를 잡아끌지 못했다. 그저 이런 작곡가가 있거니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헌데 훔멜은 살아 있을 당시 베토벤의 인기를 능가했다고 한다. 피아니스트로도 인기도 많았다. 헌데 그의 인지도는 베토벤의 한 계단 밑은커녕 음악가라고 불리기도 마뜩찮을 정도다. 물론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할 테다. 우선 나와 내 주위 사람들부터 한 때 찬란히 빛나던 시절보다 그 황홀함이 바래진듯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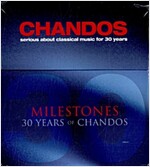
그의 음악은 친절하다. 베토벤처럼 준엄하게 들어라 강요하거나 모차르트처럼 부지불식간에 마음을 앗아가지도 않는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눅인 채 들으면 어느 샌가 사뿐히 얹힌다. 마치 뉴에이지 아티스트의 곡을 듣는 것처럼 미끌거린다. 청신(淸新)한 음의 향연이 자연스레 귀를 이끈다. 마음이 간다.
확실히 모차르트나 베토벤과는 다르다. 줄듯 말듯 사람을 녹이는 피아노 선율은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제법 바삐 움직이게 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3악장의 독주를 떠오르게 하다가 쇼팽의 흐느적대는 감성과도 비슷한 울림을 준다. 2악장 같은 3악장이 곡의 낭만성을 미만하게 하고 따로 제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작곡가가 아닌 청중을 위한 음악이다. 협주곡에도 청량한 음표가 만연하니 하나의 독주곡처럼 어울림이 지극히 일방향적인 매력이 있다. 새롭다. 다만 피아니스트가 고생할 듯하다.
이런 곡이 왜 널리 회자(膾炙)되지 못하고 더 많이 연주되지 못하나? 고전 음악가들이 지금의 자리를 차지한 건 음악의 진보를 믿고 음악 자체가 국가의 뽐냄을 위해 쓰였던 19 세기경이었다. 제국주의가 만연하면서 예술인조차 종족과 자문화의 우월성을 위한 도구로 쓰이곤 했다. 문학도 마찬가지였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자랑이 되고 괴테는 독일의, 볼테르는 프랑스의 자랑이 되었다. 누군가가 대중의 극찬을 받고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예술가는 자연스레 잊혀져갔다. 자본주의가 종종 언급하는 자연 독점이 기괴한 형태로 예술 세계에서도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슈만과 니체가 미치고 말러가 죽음을 걱정하여 스스로 사위어 간 건 시대의 폭력이 낳은 결과라 하겠다. 다만 이들은 이런 기구한 운명으로 제 분야의 위대한 아이콘이 되었다. 니체 또한 스스로가 약자의 원한(Ressentiment)을 언급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철학사(哲學史)의 강자가 되었다. 허나 나머지 패자 혹은 약자들은 제 존재증명도 못한 채 훔멜처럼 사라졌다. 이들은 아마 후세의 박절함에 대해 원한을 지닐지 모른다. 기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이 사회 전체가 약자의 원한이 모순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거짓 ‘이데아’일지도 모를 일이지만.



샨도스의 30주념 기념 앨범은 이러한 약자의 원한을 위한 하나의 진혼곡이다. 나또한 이 앨범이 없었다면 훔멜을 알지 못했을 거고 잗다라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무시했을 테다. 기실 모두가 약자다. 알라딘 내에서도 강자는 몇몇이고 다들 ‘인정투쟁’을 위해 노력한다. 누군가가 공들여 쓴 좋은 글 한편이 단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널리 읽혀지지 않는 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물론 알라딘의 강자들은 자기반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덕에 지극히 옳은 강자다. 허나 사회는 다르다. 소수의 강자들이 사회의 명망을 오롯이 가져가는 현실이다. 좀 더 낮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화 평론가 정성일이 김혜리 기자와의 씨네21 인터뷰에서 했던 “모차르트의 가장 나쁜 곡조차 살리에리의 명곡보다 훌륭하지 않습니까?”라는 말은 그래서 거북하고 그 엘리트 의식의 조야(粗野)함이 역겹다. 범인(凡人)의 최고 작품이 천재의 그저 그런 작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논박하고 민주주의를 믿는 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 음악에 대한 달콤한 연서(戀書)가 지극히 온당치 못한 기질 때문에 약자의 원한으로 점철(點綴)되었다. 글로써 나를 벼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