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청소년 소설 몇 권을 읽다. 아니 성장 소설이라고 해야 하나.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소설?

이 현, <전설의 고수>
사실 작은넘이 읽기에는 좀 난이도 하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현 작가가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종이책으로 구입했다. 내가 먼저 읽었고 아이는 아직이다. 재미는 있으나 어쩐지 별 다섯을 줄 수가 없다. 별 기준도 책마다 다르기도 하고. ㅋㅋ 작은넘 읽히고 나중 기회 되면 조카에게 넘길 예정. 덧) 나도 초능력 있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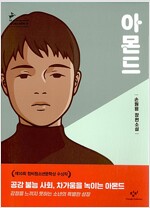
손원평, <아몬드>
기대에 못 미친 책. 나도 아이 따라 반응 시큰둥. 눈물 많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울기는 했다. 그러나 좋은 소재 좋은 캐릭터를 이야기가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지나치게) 많이 봤다 싶은 부분들이 아쉽다. 다 읽었으니 이 책도 조카에게 주도록 하자.

배유안, <스프링벅>
슬픔이 이야기에 녹아 있으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덤덤하게 묘사한 것이 좋았다. 바꾸어 말하면,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점이 객관적이었달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교육, 역시 문제구요. 아이들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황영미,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우리집 복도에는 체리새우들이 살고 있다. 가끔 어항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체리새우들의 생태를 잘 알기 어렵지만, 몇 년 지나니 이 새우들은 대체로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제목이 체리새우,인데 조금 더 체리새우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처음 새우의 탈피한 껍데기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온몸의 모양이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얇은 껍데기라니.
책을 읽으며 얼마 전 보았던 드라마 [언어의 온도]가 생각났다. 학년만 다르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말과 글, 사랑, 꿈과 희망 같은 것들이 아주 비슷하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요즘 학교 생활 정말 힘들구나 싶다. 튀지 않으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말과 시선 위에서 굴러다니게 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엔 '너'의 차례라는. 따지고 보면 학생일 때 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다.
<아몬드> 읽을 때도 그랬고 이 책 읽을 때도 내 아이들의 힘들었을 학교 생활이 떠올라, 나는 그냥 옆에서 훔쳐보고 얻어들은 간접경험밖에 없는데도, 그때의 기억에 가슴이 저려와 혼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