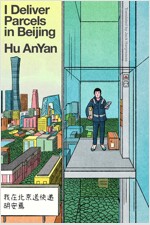엊그제 한 것 같지만, 미처 못 했던 것 비소설 위주로 뽑아놓았던 것 올려본다.
박선영 기자의 <그저 하루치의 낙담>
이 책 이야기가 계속 보이길래 궁금해졌다. 장일호 기자의 <슬픔의 방문> 이 좋았던 것도 생각나고.
그저 '하루치의' 낙담인데, 가슴에 불을 안고, 머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
"모든 지긋지긋한 것들은 그 위치에너지의 힘으로 끝내 우리를 구원한다. 너무나 지쳤다는 것,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난다는 것. 입을 뻥긋할 기운도 없는 깊은 절망과 피로.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다. 세상의 많은 혁명은 넌덜머리의 에너지로 발발했으며, 지긋지긋의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도록 만드는 가공할 힘, 넌덜머리. 지긋지긋."


천젠, 저우언라이
필로스 시리즈로 나온 저우언라이 평전이다. 1068쪽, 78,000원
저우언라이에 대해 잘 몰라서 보고도 지나쳤는데,중요한 책이라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책이라고 자꾸 탐라에 올라와서 일단 담아본다. 저우언라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의 주역이자 초대 총리였고, '영원한 인민의 총리'이자 '독재자(마오쩌둥)의 부역자'라는 모순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고 한다. 한 정치가의 생애를 넘어 20세기 중국 정치사에 대한 결정적 기록.

웬디 희경 전, 차별하는 데이터 :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방송문화진흥총서의 책은 생소한데, 이 책 추천으로 떠서 어떤 책인지 보고 있다. '차별하는 데이터'라는 제목은 직관적이라 어떤 이야기 할지 짐작 가지만 '차별의 증거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알고리듬과 기계학습의 절차와 논리, 예측의 수준에 내재된 편견을 해보' 한다고 한다. 관련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책소개나 목차만으로는 어떤 책일지 긴가민가한다.
AI 관련 이슈들은 팔로업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읽어야 하나도 긴가민가중

존 버거 <세상 끝의 기록>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들인데, 찾아보니, 2004년에 나왔던 <세상 끝의 풍경>이 새로 나왔나보다.
존 버거 한참 많이 읽을 때 나왔던 책이라 다시 보니 반갑다.


제임스 우드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
삶과 문학, 읽고 쓰기에 관한 네 번의 강의, 신형철의 해제가 있다.
"나의 이상적 자아(되고 싶은 나)에 가까운 비평가"라고 했네.
"문학, 특히 소설은 은폐와 거짓의 습관에서 잠시 벗어나 숨 쉴 틈을 허락해주었는데, 부분적으로 소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은유적 버전이라 할 수 있었고 책이라는 세계는 의미 있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혹은 픽션)을 사용하는 곳이었다. 청소년기에 장편소설이나 단편소설이 완벽히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숭고한 발견을 했을 때 온몸으로 느꼈던 전율이 아직도 기억난다. 소설이라는 무한한 자유 공간 안에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있었다."

그레이스 조 <유령 연구> - 비밀에 부쳐진 말들, 삭제된 존재의 배회, 트라우마의 체현
그렇게 좋다던 <전쟁 같은 맛>도 몇 번 빌리기만 하고, 결국 못 읽었는데, 그레이스 조의 두 번째 책 <유령 연구>가 소개되었다. <전쟁 같은 맛> 보다 먼저 나왔던 책이라고 하니, <유령 연구> 읽고 읽으면 좋겠다.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침묵이 어떻게 내 일상의 짜임을 규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트라우마의 주체가 보고 듣지 못한 트라우마를 대신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삭제된 층들이 셀 수 없이 많을 때 진실에 이를 수 있는가?


로맹 가리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
세계문학전집 읽기가 올 해의 책목표라서 새로 출간되는 세계문학전집들 계속 체크하고 있다.
아, 얼마만의 로맹 가리인가. 문동에서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 새로 나왔고, 깃털 이미지가 멋지다.
찾아보니 <자기 앞의 생> 새로 나온 것도 멋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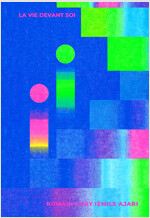
지난 주는 방학 끝나고 일상 복귀 주간이었는데, 어영부영 보낸 것 같다. 설마 적응 주간?
1년에 방학이 일곱 번 있는데, 방학 있을 때마다 적응 주간 보내면 1년에 14주를 적응만 하다가 보낼 작정이냐고.
나는 야간 쉬프트도 아니고, 그냥 아침과 저녁을 오가는 것 뿐인데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라가기 버거운데,
나이트 쉬프트는 얼마나 더 힘들단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 를 읽고 있어서 아, 힘들다. 아, 힘들어. 반나절만에, 혹은 2-3일만에 할 일을 막 보름 넘게 걸려서 겨우 시작하고, 무급 일하고, 물류, 택배, 아.. 힘들다. 저자의 글이 좋아서 술술 읽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들고 있다.
이 동네는 다들 일찍 자서, 해 지면 조용해지고, 거리에 사람 없고 (아, 해 있을 때도 사람 없구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만 많다.) 저녁 9시, 10시만 되어도 아파트 모든 동의 불이 대부분 다 꺼진다. 이번 주 수면 패턴 박살나서 (아니, 사실 지난 주부터, 터) 밤 늦게까지 깨서 책 읽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깜깜한 중에 쿠팡 트럭이 열두시 넘은 시간에 불을 밝히고 와서 배달 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보았다. 날도 따뜻하고, 고양이도 재촉해서 창문도 열어놓고 있었어서 깜깜한 어둠 속의 노란 불빛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시스템 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밤을 밝히고 다니는 개인들이 아프지 않고, 낮에라도 잘 자고, 잘 보답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