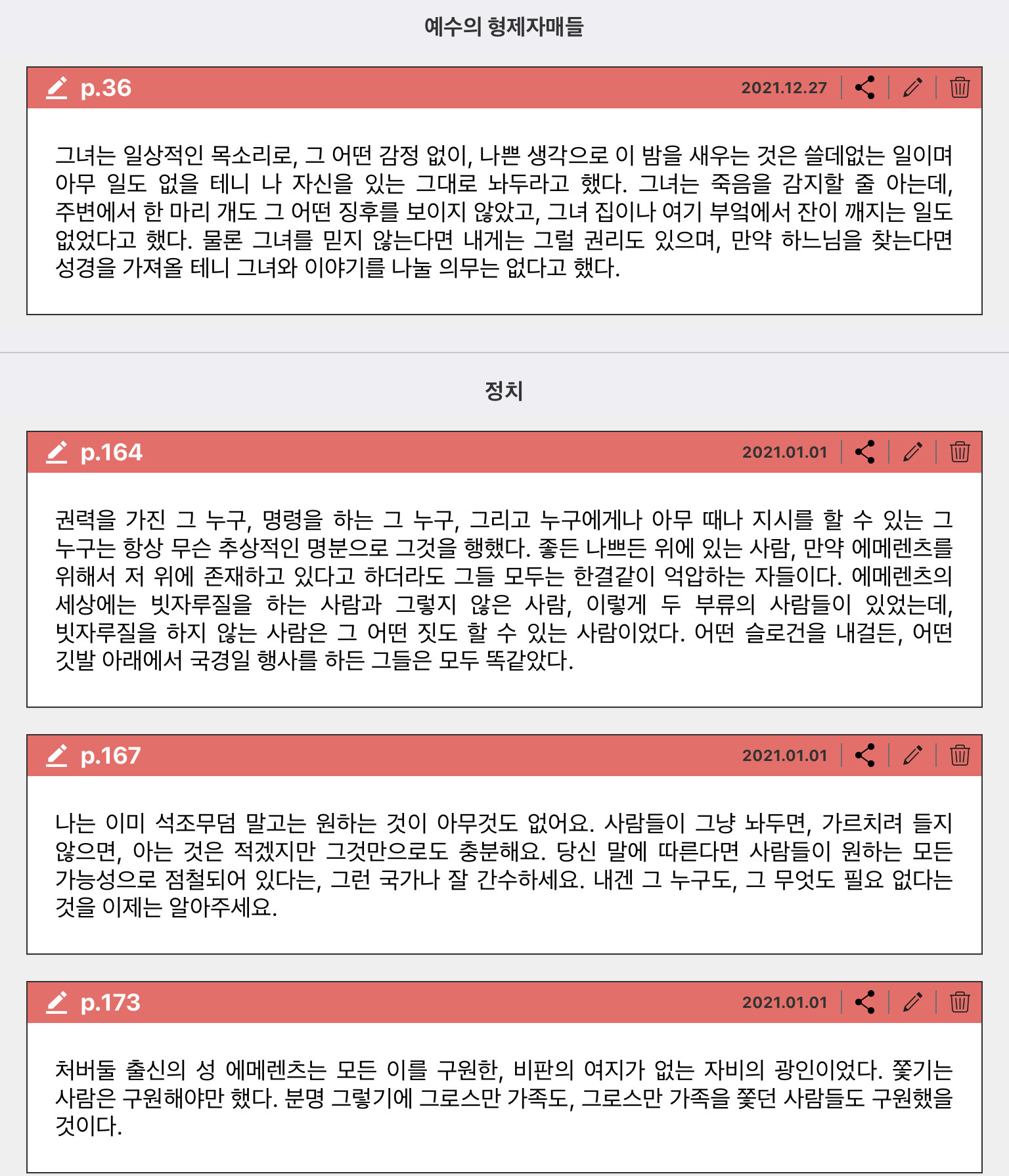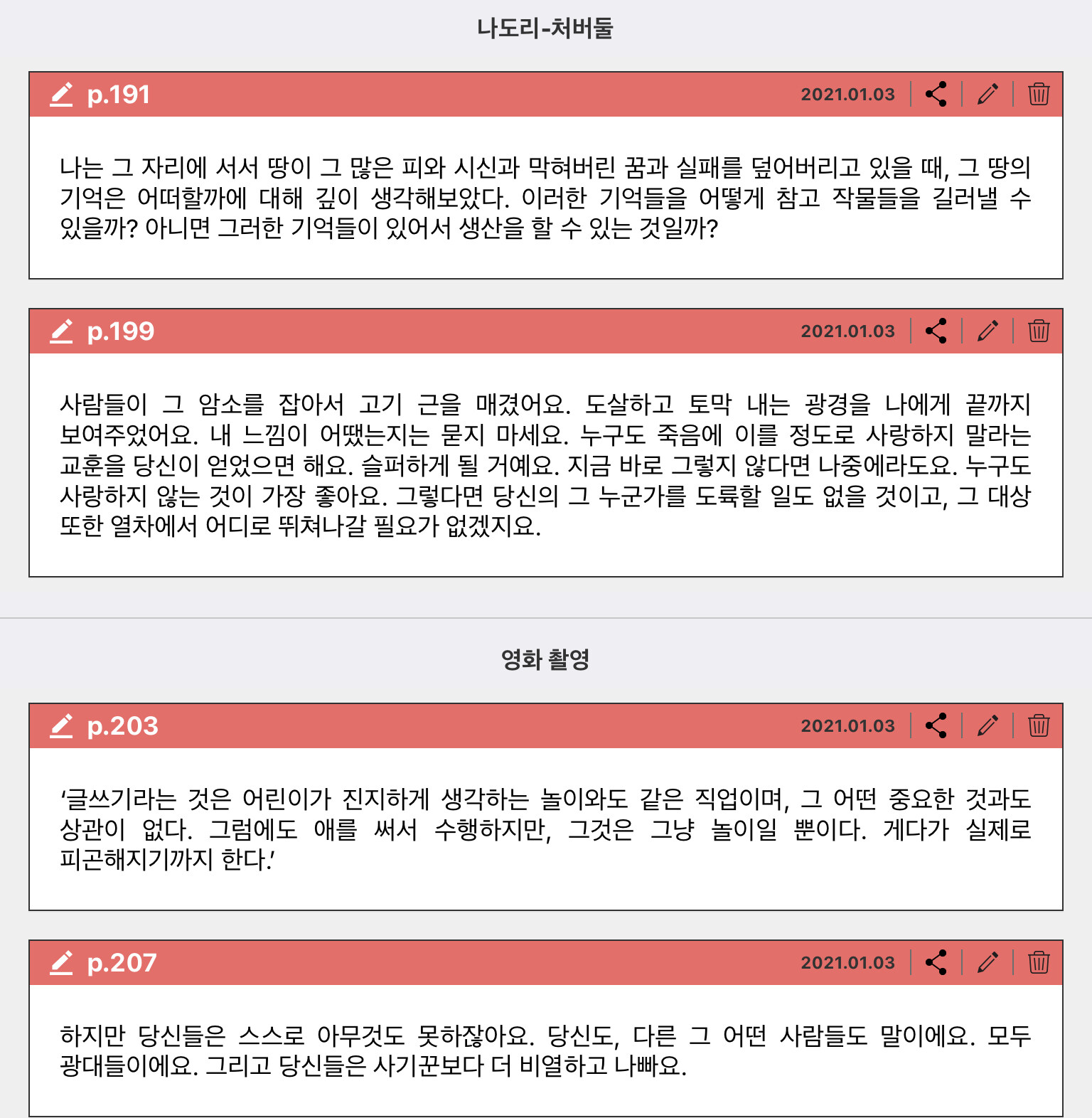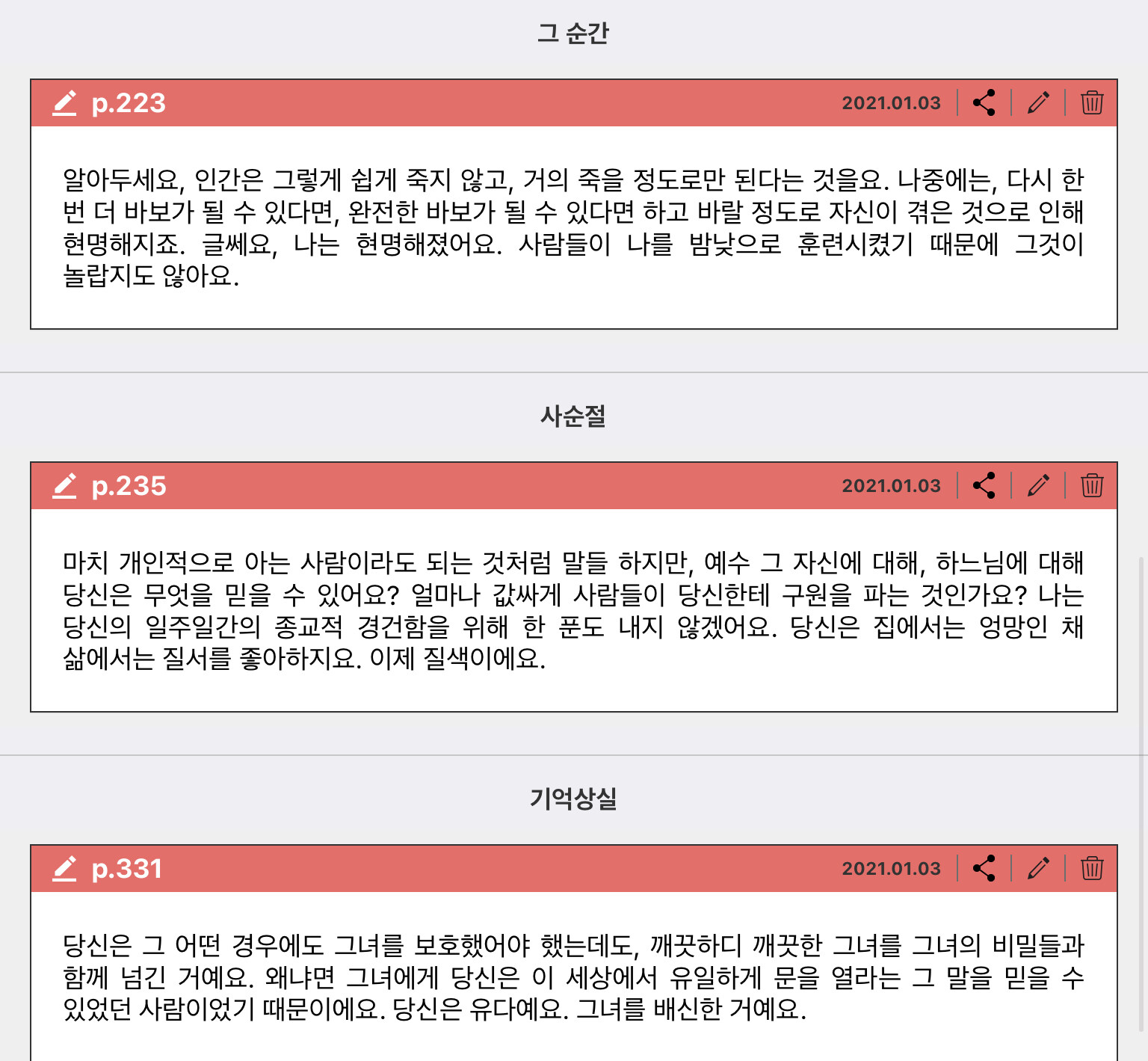-

-
[전자책] 도어
서보 머그더 지음, 김보국 옮김 / 프시케의숲 / 2019년 12월
평점 :



-20210104 서보 머그더.
새벽에 눈이 내린 날이었다. 아침까지 추웠고 출근길이 미끄러울까 걱정이 되었다. 바깥으로 나섰을 때 걱정과 달리 내 발이 닫는 곳마다 비로 그린 지그재그 무늬로 눈이 쓸려 있었다. 길이 아닌 화단, 나무, 세워둔 차 위는 아직도 새하얬다. 단지 안은 경비 아저씨들이 부지런히 쓸었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육교는 내린 눈이 얼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가로지르는 육교 위, 그리고 건너편 내려가는 계단까지 눈이 모두 치워져있었다.
누군지 모를 눈을 치워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아침이었다. 문득 나는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지면 집 주변의 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며칠 지나고 보니 왜 나중에인가, 싶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잊어버리고 나중에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감사와 따뜻함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가, 결국 나중으로 미루는 나는 비겁하고 나약하다.
눈이 오고 얼마 후 이 책을 읽으며 책 속 공동주택 관리인이자 화자의 집안일을 돕는 에메렌츠가 밤이든 새벽이든 이웃의 눈을 쓸어주는 장면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볼 뿐 한 번도 빗자루 들고 함께 눈을 쓸지 않은 화자의 모습은, 나를 닮았다. 읽는 내내 작가인 화자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는데 그 이유를 뒤늦게 알았다. 제일 나쁜 부분들만 나 같아서 그랬다. 에메렌츠에게 오롯이 기대고 있지만, 그에 대해 궁금하지만 직접 다가서고 묻는 대신 뒷문이나 옆문을 곁눈질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그를 자기 방식대로 책을 읽게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는데 텔레비전 선물하면 좋아할 거라고 믿거나, 교회에 함께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그의 호의와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화를 내고 삐지고 의심한다. 으으으, 그게 다 나였어ㅋㅋㅋㅋ
한편, 권위와 권력과 종교와 남의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서겠다고 고집부리는 에메렌츠의 개샹마웨 하는 반골 기질을 보며 저것도 또 나야ㅋㅋㅋ했다. 다만 에메렌츠는 자기 자신만 일으키고 챙기는 대신, 온 마을 온 세상 어려운 사람을 다 돌보는 이였다. 한 명이 한다고 믿기지 않을 에너지와 체력, 거의 고행과 극기에 가까운 일에 대한 집요함. 그런 모습은 사실 익숙해서 더 슬펐다. 돌아가신 할머니, 구십이 훌쩍 넘은 외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랬지. 지금도 그렇지. 여럿의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끝없이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아픈 이를 돌보았지. 그런데도 철딱서니 없는 자손들은 그들을 비참한 순간에 내버려두고 유다처럼 배신 때리고 아픈 말을 쏟아 놓곤 했다. 새삼 너무 슬프고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 책의 존재는 알았었는데 읽을 마음은 없었다. 그러다가 읽게 된 건 오은이 진행한 황정은 작가 인터뷰를 우연히 본 이후였다. 황정은 작가가 지난 해 읽은 책 두 권을 꼽았는데 하나는 이주혜의 ‘자두’, 또 하나는 바로 이 책이었다. 읽고나서 일 년에 한 두 번 하던 육식마저 끊었다고 해서 작가가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든 부분이 정말 궁금했다. 짐작컨대 비올라에 얽힌 에메렌츠의 어린 시절 이야기일 것 같다. 인상적이고 잔혹하고 슬픈 삽화이긴 했지만 나는 그 정도로 큰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결심하고 달라지는데, 그만큼 섬세한 감수성이 있는데, 나는 아직 멀었다.
작가인 화자에게 에메렌츠는 그의 작업과 예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듯 하면서도 거짓된 무언가, 그 무용함에 대해 뼈 때리는 말을 자주 남긴다. 에메렌츠가 돌봐주지 않으면 작가는 생활을 유지할 수도, 창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없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 에메렌츠가 완전 을이 아니라 자기 주관과 의지를 가지고, 제 고집대로 일하는 것처럼 작가가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관계와 신분의 한계 같은 게 느껴졌다. 결국 화자가 에메렌츠로부터 불편하고 무례하게 느끼는 부분은 에메렌츠가 자기 생활에 훅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있겠지만, 가사일을 명한 자와 돈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자 사이의 상하 관계가 개입되는 부분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존에 읽었던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나 손보미의 ‘가정 교사’ 같은 글도 읽는 중에 조금씩 생각났다. 결국 먹물들은 손에 물 묻히고 몸 쓰는 위치보다는 누군가의 육체적 조력에 기대는 입장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화자도 그렇게 고용주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일해주는 사람에게 기대고, 그가 안쓰럽고, 고맙고, 그래도 친밀하게 느껴지고, 고용인을 대리 엄마처럼 여기게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에메렌츠의 입장에서 글을 풀어갔다면 화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하고 다정한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남이지. 소모되고 착취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패대기치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뭉치는 거지. 흠 이건 너무 나갔을까. 엄마가 몇 년 간 남의 아기 보는 일을 하셨었는데 오래 좋은 분들 아이를 돌봤지만 계약이 끝나면 결국 남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니컬한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런 관점이라 그런지 일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루시아 벌린의 ‘청소부 매뉴얼’의 등장은 진짜 반가웠다. 정신 없이 바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한 60살 까지는 일하다가 남은 생애는 자기가 일하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써서 건네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가능할까. 꿈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