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분야의 주목할만한 신간 도서를 보내주세요
소설 분야의 주목할만한 신간 도서를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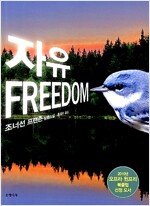
자유 / 조너선 프랜즌 / 은행나무
솔직히 처음 들어본 작가다. 대표작이라는 <인생수정>도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동세대 최고' '미국 최고'라는 과한 수식어가 과연 가당한 작가인지 아닌지 또한 알 수 없겠다. 그럼에도 이 책에 관심이 가는 건 한 가족을 통해 미국의 현재를 이야기했다는 작품 소개 때문이다. 미국의 현재라...그리고 가족이라. 세상에 던져진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갈등 그리고 파멸을 통해 당대 미국사회의 폐부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학의 전통은 굳이 그 근원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유장하다. 대중문학과 장르문학을 막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족 이야기가 녹아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이러한 소설을 통해 우리는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쉽게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자유'라는 소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미국인, 더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 전체에게 제법 커다란 울림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의 고전'이라는 수식어에 과연 걸맞기만 하다면, 이라는 전재가 꼭 필요하긴 하겠지만.

낯익은 세상 / 황석영 / 문학동네
아직도 황석영의 '장길산'을 밤새 읽던, 지금보다 많이 젊던 그때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한 군대 시절이었기에 나는 그야말로 탐욕스럽게 '장길산'을 통째로 들이마셨더랬다. 그러니 그 객관적 사실 여부를 떠나 장길산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장 재미나게 읽은 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황석영이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런데 황석영은 정말 여전히 '그런 황석영'인가? 잘 모르겠다. 변함없는 말빨과 글빨로 읽는 이들을 현혹시키지만, 갈수록 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 모르게 껍데기만 요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고개를 쳐든다. 직전 작인 '강남몽'은 그러한 염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태작이었고, 책장을 덮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황석영을 읽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던 터였다.
그런데도 또 황석영은 소설을 내놓았다. 이번엔 우화에 성장소설이란다. 과연 어떨까. 절독 선언을 했음에도 슬며시 또 궁금증이 인다. 결국 나는 이놈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박지성을 끌어다 붙여보기로 한다. 그래, 박지성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슬며시 절독 선언을 번복할 요량인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황석영을 읽는다. 속는 셈 치고 혹은 속는 줄 알면서도.

미칠 수 있겠니 / 김인숙 / 한겨레출판
좋아하는 김인숙의 신작 장편이다. 난 어떻게든 이 책을 읽겠지만 기왕이면 많은 이들과 함께 읽고 싶다. 김인숙의 작품들을 닥치고 무조건, 까지는 아니더라도 늦게라도 꼭 손에 쥐고마는 이유를 나말고 다른 이들도 이 소설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뭐랄까, 여성 작가에게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참 듬직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가녀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참 선이 굵다고 해야할까. 또 아니면 분명 내면으로 침잠하는 묘사로 가득한데도 장쾌하다 싶을 만큼 뚜렷한 서사의 힘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뭐 써놓고보니 결국 같은 말일 것이다. 여성성과 남성성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시원하면서도 섬세한, 모호하면서도 뚜렷한, 그만의 만만치 않은 내공. 이것이 바로 김인숙의 매력일 터이다.
잠시 책 소개를 보아하니, '미칠 수 있겠니'는 어쩌면 바로 이러한 김인숙만의 강점이 극대화된 작품이 아닐까, 라는 확신이 든다. 이러한 설레발이 설레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