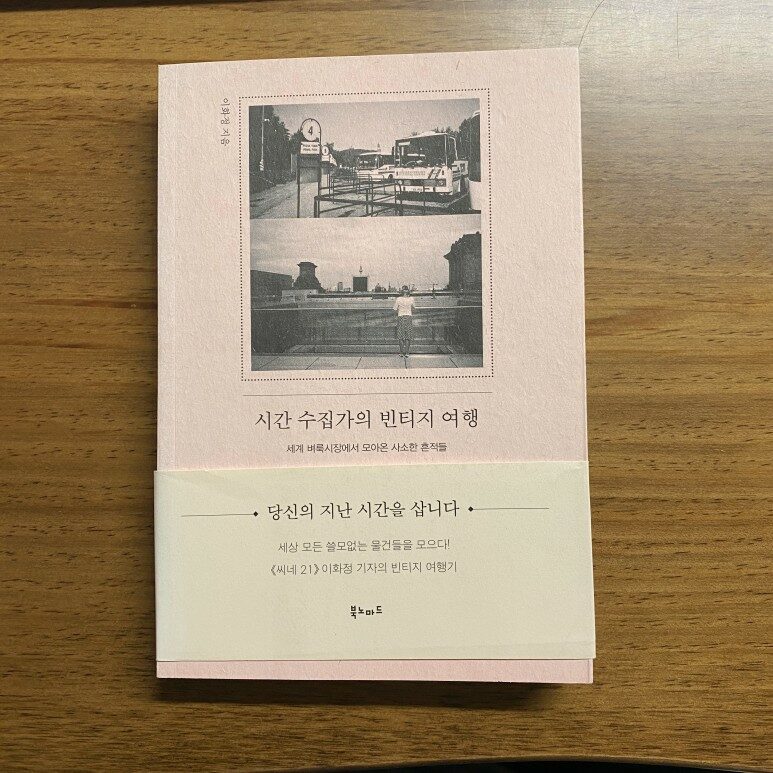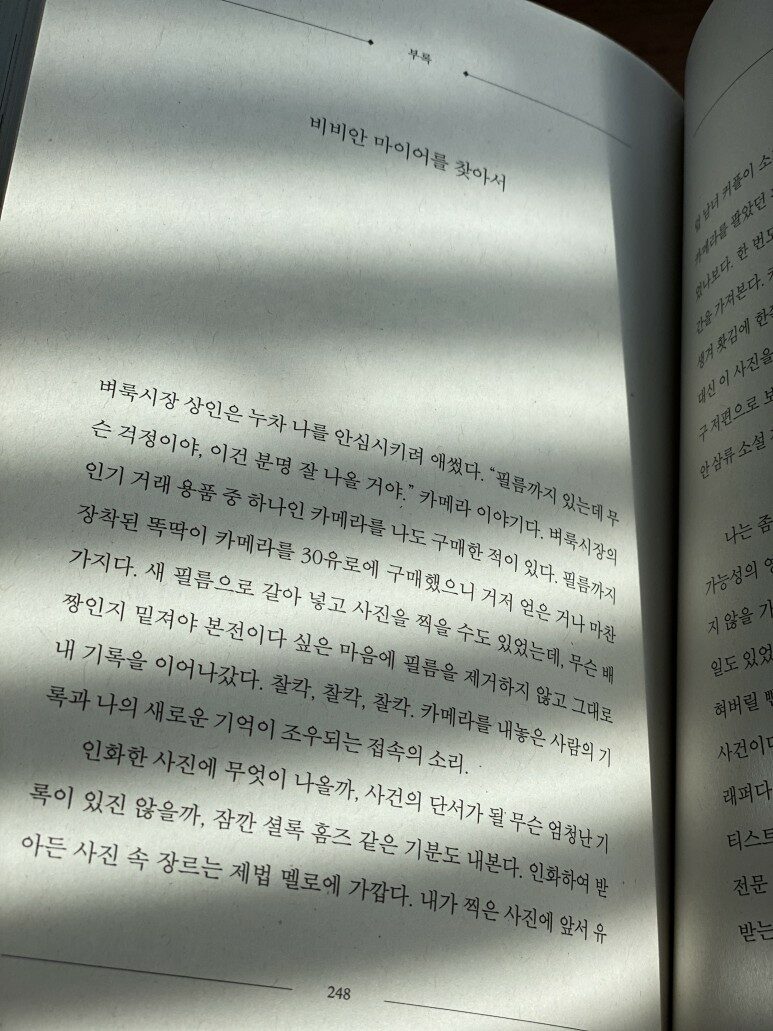여행 에세이를 좋아했던 시절, 이 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절판이라 구하지 못했다. 이 책의 2편쯤 되는 책을 찾아 읽었다.
https://blog.aladin.co.kr/jiyuu/10302351
구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달 난 느낌이 들었을 때, 우연히 경의선 책거리에 있던 작은 서점에서 딱 한 권 있는 이 책을 발견했다. 누가 집을 새라 얼른 집었다. 책방 사장님께 이 책이 절판된 책이라 사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 놀란 듯, 출판사에서 1권 가져왔고, 책 내지가 금방 누래질 것 같은 질감이라 비닐로 포장해 두었다고 했다. 후작인 <언젠가 시간이 되는 것들>도 빈티지 콘셉트에 맞춰 갱지 같은 속지였는데, 이 책도 누리끼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래된 책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 질감이었다.
그렇게 애타게 찾은 책이었는데, 이제서야 읽었다. 그런데 책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 에세이 종류의 책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 그런 유의 책에 조금 싫증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 책은 내가 한참 에세이를 좋아했을 때 산 책이었다. 심지어 이 책을 읽으면서 병렬독서의 안 좋은 경험도 했다.
분명 저자가 물욕이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물욕이 있다고 하지?라며 책의 앞 쪽을 들추다가 내가 다른 책의 저자가 물욕이 없다고 했다는 것과 헷갈린 것을 알았다. 물욕이 없는 저자의 글과 물욕이 많은 저자의 글을 동시에 읽다 보니 생긴 해프닝.
꼭 이 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에세이에 대한 감정이 시들해진 이유는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하지?'라는 심드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책을 보는 이유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서인데, 내가 좀 건방져진 것 같았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심드렁한 감정을 안고 책은 끝까지 읽는다.
아마 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몰입해서 읽었을지 모르겠다. 갱지 같은 속지도, 필름 사진(같은?) 가득한 이국적인 풍경도 조금 다르게 다가왔겠지. 그래도 저자가 빈티지 물품을 찾고 애틋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책을 찾고, 손에 넣은 과정이 떠오른 추억이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