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교, 는 영화를 보고 읽은 책이다. 언젠가 옆자리 선생님과의 술자리에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소설보다 못하다, 고 했다가 '국어선생'들은 문학에 대한 맹신, 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 아무튼, 고심 끝에 읽은 책인데, 음... 내가 생각할 땐, 영화와는 '다른' 소설이었다. 읽는 내내 내 노년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평균 기대수명의 반환점을 돌았으니, 이제는 더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지?
빈곤의 종말, 은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 온 저자의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나라마다 빈곤의 원인이 다르고, 또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제각각인데, 지금껏 그 대처방안이 획일적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집행했던 저자의 경험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면서 나도 '저금통'-진짜 집에 저금통이 있다-을 털기로 결심했다.
불편해도 괜찮아, 는 읽는 내내 불편하지 않았다. 김두식 교수의 책은 그래도 서너 권 읽었는데, 이번 책이 제일 흥미로웠다. 자기가 정해 놓은 선을 넘는다는 게 보통 일인가? 더구나 그 선이라는 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영역이라면 더욱 더 선의 경계에서 외줄을 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 선을 넘어 이쪽으로 오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존재도 필요한 법이다.
조지 오웰, 은 조지 오웰에 대한 평전이다. 나는 조지 오웰을 좋아한다. 오웰을 좋아한 건 최근의 일이다. '1984'은 예전에 읽었지만, 사실 그리 큰 감흥은 없었다. 그런데 위건 피어로 가는 길,을 읽고부터 연달아 오웰의 저작을 읽었다. 그리고 그가 더 멋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 책도 초반에는 대강 알고 있는 오웰의 생애부터 차근차근 소개되어 있다. 책을 덮으니 그를 좀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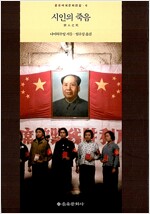



시인의 죽음, 은 막판에 살짝 울었다. 교무실이었나 교실이었나 책을 읽는데, 죽음(자살)을 앞둔 시인의 행동을 읽으면서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서 울컥했다. 교조주의적인 혁명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소설이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참으로 알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다이허우잉(저자)은 문혁에 꽤 깊은 상처를 받은 거 같다.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4, 는 가볍게 읽었다. 이제는 십자군 전쟁에 맞서 싸운 이슬람의 영웅, 술탄 '살라딘'이 등장한다. 역시나 어려운 내용도 만화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 아쉬운 점은, 전편들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앞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촌철살인의 풍자,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점! 어쨌든 나올 때마다 읽고, 완결되면 다시 정주행을 해야 할 작품이다.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책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편안히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감천동에 있는 '우리누리' 공부방 이모인 '최수연'선생님이 쓰신 이 글에는 거짓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좀 알고 있어서-물론, 최수연선생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뵈었다- 더 마음이 쓰였다. 공부방을 위해서도 이런 책은 세상에 나와야 하고, 또 읽혀져야 한다.
로마제국쇠망사1, 은 스스로에게 방학을 기념해서 산 책이다. 이번 방학엔 이 책 1-6권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매일 하루에 100쪽씩 읽어야 겨우 다 읽을 수 있을 듯한데, 벌써 계획에 조금씩 차질이 생기고 있다. 생각보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다 읽고 나면 무엇이 기억에 남을 지 궁금하기는 하다.

흔치 않게 선물로 받은 책이다.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신 정OO 선생님이 알라딘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법륜 스님이 부산대학교에서 이 책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하는데, 함께 가보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우리나라', '강대국', '발전' 이라는 단어들에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 읽고 나서 인터뷰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끼리 좋아서 맞장구치면, 마음은 참 편하고 좋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인터뷰어가 반대편의 논리로 치열하게 공박을 펼쳐야 독자들이 인터뷰이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 통일, 새로운 100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막 뛰어야 한다는데, 나는 조로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