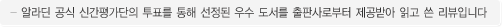[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김수영을 위하여 -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강신주 지음 / 천년의상상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김수영을 모른다. 하긴 나에게 누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김수영을 모른다 함은 그가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에 대해서 모름을 의미한다. 아니, 솔직히 그가 한국문학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른다.
그의 전집만으로는 더욱 그렇다. 시가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그렇다. 그전에는 그의 시 '풀' 정도만 알았다.
풀은 노래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뜻도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것 같다.
이렇듯 무엇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하물며 현대시인의 그거라면 더욱 그러할터.
대중적 글쓰기(애매하긴 하다. 대중에게 좀더 친숙히 다가간다는 측면에서)를 해온 철학자 강신주는 이런 사정을 잘 아는듯 아주 친절하게 김수영을 읽고 있다. 아니, 읽었던 바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주장은 사람은 모름지기 팽이 처럼 스스로 돌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온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야말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다.
온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치열하게, 가열차게. 고민하면서,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뜻인가? 비슷하면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어찌 살라는 것인지.
곳곳에 배치된 그림들은 본문의 내용과 묘한 합일을 이룬다. 주로 현대미술 같은데 처음엔 이상하여(조잡한 삽화의 느낌?)본문가 별 상관없으리라 그냥 지나쳤는데 몇 장 보다보니 앞에서 보지 못한 작품과 작가가 기입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다시 보게 되었다. 어떤 명명을 통해서 즉, 알게 되어서 깨우친 사실일 것이다. 애써 그리 자위해 본다.
책을 만든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처음 본 것 같다. 신선한 시도로 느꼈다. 책만든 사람과 작가의 관계가 다양하게 해석 될수 있겠지만 지은이와 만든이의 그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듯 하다. 두사람은 일종, 의기투합하여 그리 한것이겠지만 신선한 시도로 보였다.
지은이의 주장을 따라 가다보면 무리없이 읽을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시를 읽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더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과연 온몸으로 밀어부치는 삶에 동의 하는지, 치열함만이 난무하는(또는 그렇게 과장되는)형국에서 그것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의문이기도 하다. 석달전부터 소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온몸을 사용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월급은 많이 깍였다. 마음은 조금 편하다. 내가 온 몸을 사용해 일을 하는 것과 김수영과 강신주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