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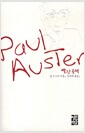
-
빨간 공책
폴 오스터 지음, 김석희 옮김 / 열린책들 / 2004년 10월
평점 :

절판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지난해의 어느 전시회장에서 였다.
그날, 흠모하는 열린책들 출판사의 부스는 화려했다. 국제도서전 첫 방문이었고 나는 백수라는 신분도 잊은채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올해는 책에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당연히 실패다.
이지적이고 이국적인 외모의 사진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열린책들 부스에서 단연 인기가 높은 그의 책은 한켠에 섬을 쌓고 있었고 두툼한 책을 만지작거리다가 미리 구입하고자 결심했던 도스토예프스끼의 빨간전집만 몇권 집어들고 온 기억이 난다. 서운함을 감출길이 없었는데 마침 부스 귀퉁이에 엽서와 스탬프가 놓여있었다. 개미로 유명한 베르베르를 비롯한 열린책들의 작가를 대표하는 소설과 이미지를 엽서에 찍어서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유독 폴 오스터의 이미지 캐릭터가 파여진 도장이 마음에 들어서 말라붙은 잉크를 고집스럽게 도장에 쳐발라가며 몇장이고 찍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지. 그의 프로필 사진만 보아도 여성독자라면 마음이 설렐만하지 않은가. (아니면 할수없고.)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을 본 것처럼 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린다.(외모와 문체가 닮은 얼마 안되는 작가랄까.) 그래서 그 후 그의 책을 한 권 구입했다. 그것이 바로 '달의 궁전'이다.
지난번 <왜 쓰는가> 서평에서의 표현을 반복하자면,
'달의 궁전'은 그가 쓰고 내가 산 첫번째 책이고
'왜 쓰는가?'는 그가 쓰고 내가 읽은 첫번째 책이다.
조금만 두꺼운 책에도 놀랄 정도의 새가슴인 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달의 궁전은 조용히 장식용 책이라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 '왜 쓰는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빨간공책'은 소설이 아니다. 그의 일상과 경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와 생각들이 적힌 책이다. '빨간공책'은 폴 오스터의 글쓰기에 영감을 줄만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인듯 하다. 그가 아는 친구와 지인에게 얻은 믿기 힘든 우연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한 에피소드들은 그 흔한 액자식 소설처럼 "이건 내 친구가 겪은 일인데" 혹은 "이 이야기는 내가 열두살 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를 사칭한 사기극을 보는 듯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다. 폴 오스터의 책이라고는 읽었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얇은 이 두 권의 책 뿐이지만 나는 이것으로 그를 전부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에게 반했다. 담담한듯 하면서도 마음을 후비고 들어오는 어린아이같고, 냉소적인듯, 관심없는 듯 하면서도 자상한 그의 문체에 반해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영미 소설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일본작가들의 문체와 유럽작가들의 문체, 한국 작가들의 문체에 대해서는 조금씩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 작가에 대해서는 금붕어도 웃고 갈 정도로 무식하니까.
문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 해준다. 작가의 심리 상태, 그의 무의식, 그가 살아온 배경은 기본이고 폴 오스터로 치면 그가 지낸 뉴욕이라는 도시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문체는 '장소'와도 연결된 것 같다. 그곳의 공기, 도시의 음침한 정도, 소음들, 음식냄새 등등... 이를테면 하루키하면 그가 쓴 소설의 문장 몇개를 떠올리는 것 보다는 재즈나 고양이, 위스키, 마라톤 등을 연상하는 것이 수월하듯 말이다.
헬렌 한프의 <채링 크로스 84번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행자들은 늘 자기가 무얼 보아야 하는지를 미리 정하고 오기 때문에 진정 여행지를 느끼고 갈 수 없다는 누군가의 말에 헬렌은 그동안 읽은 책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확인하려고 영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되돌아온 대답은 '그럼 거기에 있어요' 였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 그런 내용 이었다. 그가 말했듯 내가 상상하는 폴 오스터 속의 뉴욕을 보려면 영원히 이곳에서 그의 책 속의 뉴욕만 구경해야할지도 모르겠다.
또 한명의 사랑하는 작가를 맞이하는 기쁨. 나는 애정을 듬뿍 담아 폴 오스터를 '2007년 나의 작가'로 임명한다. 누군가 '폴 오스터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여자건 남자건 나는 분명 질투를 할게 뻔하다.
'빨간공책'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42~43쪽에 있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도서관에 앉아 읽은 책이어서 발췌하지 못했다. 연필과 연습장이 있었음에도, 옮겨 적어오려고 연습장 두장을 뜯어서 옆에 두기까지 했으면서도 적지 않았던 것은 나의 게으름 탓이다. 언제라도 누군가가 이 서평을 읽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문단들이 바로 이것이에요"라면서 42~43쪽의 내용을 발췌하여 선물로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서평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