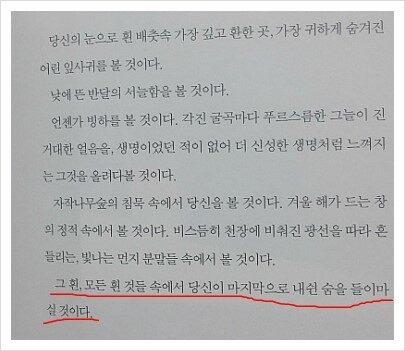-

-
흰 - 한강 소설
한강 지음, 차미혜 사진 / 난다 / 2016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흰> - 한강
The Elegy of Whiteness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흰>의 목록
목록에 글이 채워저 어떤 것은 에세이가, 어떤 것은 시가 되었다.
흩어진 목록이 모여 소설이 됐다.
힘껏 써내려간 생이 된 소설 <흰>

<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계절에 한강의 소설 <흰>을 만났다.
이제막 더위가 시작되려 하는 때 머리에, 심장에, 온몸에 차가운 예방 접종을 맞았다.
내가 읽은 <흰>은 "틈"이다.
벌어지지도 좁아지지도 않는 틈.
연고를 바르고 솜으로 덮어도 매울 수 없는 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견뎌내는 '틈'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틈.
그 틈속에서 힘껏 눌린 검정의 선
흰 바탕에 어지러이 퍼져가는 선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더 어리러이 퍼지는 선,
놓칠까봐 부랴 부랴 쫒아가다가도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선이 지나간 자리는 하얗게 지워진다.
힘껏 쓰여진 <흰>문장들 틈사이에서 힘껏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 본다.
의미가 없었던 듯한 삶, 순간의 의미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 삶의 한 자락들...
지나온 삶은 그렇게 틈 속에 있었다.
남은 것은 다가오지 않은 삶. 아직 한번도 살지 못한 미래의 삶.
<흰>것에 힘껏 삶을 채워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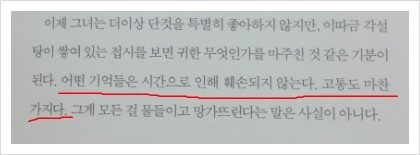
흰 것은 눈을... 머리를... 생각을 피곤하게 만든다.
아니다. 환상을 만들게 한다. 잠잠하던 생각의 흐름을 빠르게 한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온몸이 긴장을 하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 진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흰" 것.
'백(白)'도 아닌 '하얀'도 아닌 "흰"이여만 하는 것. ...
한강은 이렇게 또 한번 다그친다.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도망쳐서는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삶과 죽음이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용기를 준다. 충분히 마주 할 수 있다고, 온 힘을 다해 한번 살아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