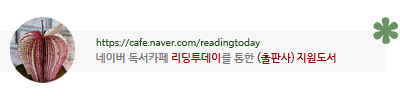-

-
카미노 아일랜드 - 희귀 원고 도난 사건
존 그리샴 지음, 남명성 옮김 / 하빌리스 / 2022년 9월
평점 :




서평을 쓰려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스포 없이 어떻게 쓸지 막막한 느낌이다. 읽는데 너무 집중해서 체크를 못했다. 참고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다시 찾아야 했다. 찾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다시 읽어도 처음 읽는 것처럼 긴장감이 조여왔다.
위대한 개츠비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친필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 작가들의 친필 작품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5편의 피츠제럴드의 친필 원고가 감쪽같이 도난당한다. 그런데 범인이 너무 쉽게 잡힌다. 이렇게 잡히면 뒷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도난당한 책일까? 서점 주인일까 헷갈리게 한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도난당한 원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도난된 원고의 행방은 잠시 접어두고 어느 서점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지루해지고 끊어질 것 같았지만 책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서점의 뒷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글의 마지막에 가서야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였다. 여자친구와 그녀의 직업 등이 모두 복선이었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계획의 시작이었을까?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책장 사이를 여기저기 찾아보다 짚이는 곳이 있어 펼쳐보니 생각했던 곳이 시작이었다. 서점과 집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책을 당겨 펼쳐진 분량을 확인하니 초반부였다. 이때부터 시작했었는데 몰랐다니 허탈하였다. 복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에 주의 깊게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작가가 강조한 부분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부분인 듯 가볍게 적어 놓았다.
도난 사건인데 경찰이나 FBI 등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은 점도 좋았다. 주변에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 스파이를 한다? 어설퍼도 엄청 어설퍼 보일 것이다. 근데 읽는 동안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미노 아일랜드에 스며들어 그들과 함께 하는 일상은 평범해 보였다. 브루스가 눈치챌만한 사건도 없었다. 단 하나 이상했던 부분은 <우리 둘만 본 거야.>라는 문장이었다. 둘만의 비밀을 만든다면 나중에 비밀이 탄로 났을 때 누가 발설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딱 여기까지만 생각했다. 이때 좀 더 추리를 했어야 했다.
사건 해결 방향이 조금 엉뚱하게 되긴 했지만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다소 과격한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케이퍼 픽션」이라 전체적으로 유쾌한 질주극이었다. 치밀하게 얽힌 구성에 추리를 하며 읽어야 해서 빨리빨리 책장이 넘어가지는 않았다. 책 소개 페이지 중에 <다빈치 코드와 셜록 홈스의 만남 - 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소설 - 리터러리 리뷰> 두 문장이 이 책을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