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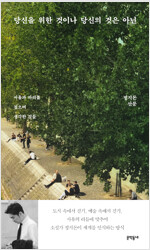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중 하나인 정지돈의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이하 《당신》)은 '서울과 파리를 걸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서울'과 '걷기'와 '파리'에 대한 작가의 일상, 단상, 인용이 나열된다. 이미 그의 소설집을 읽어봤었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보았고 에세이도 역시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예술과 삶의 뒤섞임을 인용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그의 작법은 에세이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절반 가량 읽으면서 내가 얻은 수확이 있다면 '플라뇌르(flâneur)'와 파리에 관련된 책들에 대한 호기심 정도? "솔직히 말하면 플라뇌르는 지겨운 개념"(46쪽)이라고 저자는 한탄하고 백인 이성애자 남성에 한정되었던 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읽으면서 종종 나는 저자가 21세기적인 의미로 플라뇌르를 재개념화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책에는 산책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쇼핑몰과 소비문화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어느새 그는 자신의 '글쓰는 친구들'(오한기, 금정연, 이상우, 그리고 가끔 박솔뫼)의 이야기로 빠진다. "걷는 이야기는 언제나 길을 잃고 헤맨다"(리베카 솔닛, 《걷기의 인문학》, 25쪽)는 말처럼.

의외로 정지돈의 이번 에세이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인물은 고다르가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었다.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걷기라는 행위에 대한 두툼한 책을 이미 냈기도 하고, 책의 한 꼭지를 '플라뇌르, 또는 도시를 걷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할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신》에 종종 등장하는 인용구가 인상 깊게 남아서 주문을 했고, 오늘 첫 꼭지를 읽었다('플라뇌르~'도 궁금하지만 《개념어 사전》 같은 책이 아니면 목차를 구성하는 저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편). 솔닛을 읽는 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이후 두 번째인데, 역시 나의 에세이 취향은 《당신》보다는 이쪽인 듯했다. 솔닛의 에세이가 가진 힘은 아마 글에서도 보이는 행동력과 에너지, 명쾌하면서도 생각의 깊이가 보이는 문체 때문이 아닐까.





《당신》에서 등장하는 서울 얘기보다 파리 얘기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읽으면서 내가 잠시 보았던 파리를 떠올리며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년째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뚜벅이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각종 도로들(이를테면 차를 타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강변북로)도 낯설고, 의외로 '서울로7017'도 낯설다. 오히려 파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 드골 공항에 내려서 TER을 탔을 때 보았던 더러운 좌석, 맡았던 악취,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싶었던 두려움을 떠올리고, 지하철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 역에서 맡은 악취를 떠올리고, 넓은 광장과 돌길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오래되어 보이는 정경을 보며 부풀었던 마음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런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지돈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는 책에는 메리 매콜리프의 《예술가들의 파리》 시리즈와 아녜스 푸아리에의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 좌안 1940-50》이 있었다. 전자는 예전부터 모아놓고(만) 있었고(4권을 마저 사야 한다), 후자는 《일기日記》에서도 언급된 책이어서 구비해놓고 있다. 새해를 막 넘길 무렵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독서 목표 중에는 '파리와 관련된 책들이 좀 모였으니 몰아서 읽어보자'라는 것도 있었다. 정지돈의 책이 생각만 하고 있던 목표를 다시 떠올려줬다고 해야 하나. 파리에 유독 관심을 두는 건 3년 전의 여행에서 가장 많은 인상을 남겼고, 꼭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나는 정지돈처럼 스탕달 신드롬이 오지는 않았다...
소설이든 에세이든 정지돈의 책을 읽는 의의는 몰랐던 작가나 책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정리한다. 그만큼 사고 싶은 책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것이 흠이지만. 이번에 끌린 솔닛의 책은 이미 내가 좋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니 나름 성공적이었다. 다만 남은 절반에서 《당신》에 대한 나의 평가가 달라질지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독서모임에서 다루려면 완주해야 한다. 차차 읽어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의 발견인 《걷기의 인문학》으로 마무리하자. 이 책의 아래에는 '걸어가는 인용문'이 있다. 본문의 아래쪽에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걷기에 대한 인용문의 연속. 오늘 나의 눈길을 끌었던 인용문은 개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의 것이었다. "어릴 때 우리가 한 장소에 대해 알게 되는 방법, 공간 속의 관계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은 걸으면서 떠올리는 것뿐이다. 장소를 가늠하고 장소의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은 우리 육체와 우리 육체의 역량뿐이다."(〈블루마운틴스의 쉼 없는 발걸음〉)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이것이었다.
다시 말해, 걷기를 주제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보편적 행동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먹는 일, 숨을 쉬는 일과 마찬가지로 걷는 일에도 성애적 의미에서 영적 의미까지, 혁명적 의미에서 예술적 의미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걷기의 역사가 생각과 문화의 역사(다양한 보행, 다양한 보행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시대에 추구한 다양한 기쁨과 자유와 의미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 두 발로 지나간 곳에 장소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소가 다시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다. 걸었기에 골목과 도로와 무역로가 뚫린 것이고, 걸었기에 현지의 공간 감각과 대륙 횡단의 공간 감각이 생겨난 것이고, 걸었기에 도시들, 공원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걸었기에 지도와 여행안내서와 여행 장비가 생긴 것이다. 멀리까지 걸어갔으니 걷는 이야기책들과 시들이 쓰인 것이며, 순례와 등산과 배회와 소풍을 기록한 방대한 분량의 책들이 쓰인 것이다. 역사의 풍경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다. (리베카 솔닛, 《걷기의 인문학》, 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