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반쪼가리 자작》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9.

이탈로 칼비노의 《반쪼가리 자작》은 메다르도 자작이 포격을 받아 몸이 반으로 잘리면서 악한 반쪽과 선한 반쪽 자작으로 나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결말에 이르면 두 자작은 한 여인을 둘러싸고 결투를 벌이다가 서로의 단면을 베면서 쓰러지고, 의사가 두 자작을 결합시켜 완전한 몸을 찾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선과 악의 이분법보다는 완전성을 잃고 분열된 현대의 인간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히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 발표된 이 작품에서 칼비노는 고대의 조화로운 인간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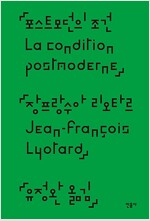

그런데 현대란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적 가치들이 무너지고 단 하나의 보편적인 이론보다 개별적인 실존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대가 아니었던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소외된 가치에 눈을 돌리고 이성이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대.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전체성보다 파편화가 더 익숙하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고 더욱 현명해진 메다르도 자작과 나무 위에서 세계와 거리를 두고 조감하며 저항하는 코지모 남작에게 눈길이 가는 건 완전성, 전체성을 향한 욕망 때문일까? 복잡다단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1의 원리, 또는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완전무결한 가치에 대한 욕망 같은 것 말이다.
아마도 우리는 자작이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옴으로써 놀랄 만큼 행복한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아주 복잡해져서 온전한 자작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 이탈로 칼비노, 《반쪼가리 자작》, 114쪽


고체처럼 단단하고 굳건했던 질서들이 액체처럼 유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까? 전쟁 이후의 세계에서 칼비노는 완전성과 조화로운 인간의 회복을 말하고, 거대 서사가 붕괴된 시기를 포스트모던이라 이름 붙인 리오타르는 담론의 파편화를 증대시켜 사회가 다원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거칠게 표현하자면). 전체가 아닌 파편,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우리의 눈길이 가도록 이끄는 것이 문학이 아닌지를 잠시 생각하고, 그럼에도 세계를 조감하는 이성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파편화(혹은 개별화)와 완전성(또는 전체성)이 아니라 둘 사이의 긴장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길이 아닌 것인지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일천한 지식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흐름 없는 생각에 이름을 붙일 언어와 지식이 더 쌓인다면 파편과 전체에 대한 미완의 논의를 머릿속에서 다시 풀어낼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