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뤼시스>와 친(親)하다는 것[1/5]
-천병희의『뤼시스/라케스/카르미데스>』

木蓮: 꽃들 모두 보내고야 알았네, 그대
또한 연꽃이었음을. 사진과 글: 타임로드
□<뤼시스>와 <라케스>와 <카르미데스>까지, 플라톤 대화편 셋이 묶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천병희 원전번역으로 만나는 『뤼시스/라케스/카르미데스』 얘기다. 낯설기만 한 이 제목들은 고대 그리스의 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이름들이다. 플라톤의 대화편들 대부분의 제목이 인명에서 따온 것들이다. 책의 제목이기도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각 대화편에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자신의 사상을 주창하기도 하고, 해당 대화편의 주제와 연관된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대화마당에는 어김없이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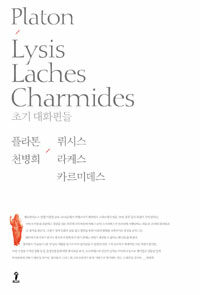
□ <뤼시스>와 <라케스>와 <카르미데스>는 초기·중기·후기로 나뉘는 플라톤 대화편들의 ‘초기’에 해당한다. 인간(사물)이 갖춰야 할 탁월하고 유능한 성질, 곧 미덕(arete)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뤼시스>는 우정이, <라케스>는 용기가, <카르미데스>는 절제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이들 셋 외에도 미덕에 속하는 덕목들은 여럿 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조직)이 셋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을 만하다. 한 가지를 제대로 갖추기도 쉽지 않은 까닭이다.
□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생각보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의 내로라하는 인물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일은 가슴 설레는 일이 된다.” 무슨 소리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독자들에게 ‘플라톤은 어렵다’. ‘플라톤은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 그것이 ’선입관‘이라고 강변해도 어쩔 수 없다. 사실 플라톤은 쉽지 않다. 다만, 플라톤의 원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은 ’진행중‘이었고 무엇보다 우리말로 와 닿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없었기에, ‘플라톤은 어렵다’는 부담감은 현실이 되었다.
□ 그러므로 이들 세 편의 대화편은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난해해지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독서에) 참여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해야겠다. 생각해보면 2500년 전 소크라테스-플라톤의 시대나 지금이나 태어나 살고, 살다가 죽어가는 필멸의 존재인 우리 삶의 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후대에 이를수록 선배들이 물려준 앎과 깨달음의 유산들 덕분에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날마다 그날의 괴로움을 맞아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지 싶다.

←<뤼시스>를 읽은 다음에 세네카의
<우정에 관하여>를 읽으면 좋을 것이다.
□ <뤼시스>에서 만나는 ‘우정’도 결코 만만치 않은 주제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싶지만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부제가 ‘우정에 관하여’이지만 ‘우정’을 ‘사랑’으로 대치(代置)해도 상관없다. 다만 여기에서의 사랑은 흔히 떠올리는 남녀의 사랑과는 좀 다르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그리고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대화가 <뤼시스>인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다룬다고? 사실이다. 한 청년(남자)이 한 소년(남자)를 사랑하는데, 나 홀로 사랑을 불태울 뿐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렇다고 이즈음 우리나라처럼 세인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 당시 그리스에서 동성(남자)끼리의 사랑은 사회 문제가 되지가 되지 않았다. 일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대를 갖지 못하는 처지가 안타깝고 뭇 사내들은 그런 사랑을 부러워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여성차별’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대의 동성애는 지금의 여자를 향한 남자의,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나아가 여기에서 다루는 ‘사랑’은 그것이 남녀 사이의 것이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것이든 ‘우정’에 포함된 혹은 우정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사랑 혹은 그 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로는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 사랑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표면상으로 <뤼시스>는 동성애에 따른 이야기를 다루는 대화편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8,9권 '우애'를 다룬 부분을 이어 읽으면 좋지 않을까?
□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에서) 고전번역가 천병희는 일관되게 남자끼리의 연애에서 남자 구실을 하는 쪽을 '연인'(戀人; erastes)으로, 여자 역할을 하는 쪽을 '연동'(戀童: ta paidika)으로 옮기고 있다. 대체로 연인은 연동보다는 연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인품, (경제적으로) 가진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랑하는 쪽’이다. 역으로 연동은 사랑을 받는, 곧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받는 상대이다. 소크라테스의 연동은 알키비아데스(15살차, 대화편 <향연> 참조)였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만물은 하나다’)의 연동은 자신의 이론을 충실하게 계승한 제자이기도 한 25살 연하의 제논이었다.
(이어서, 4조각의 글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