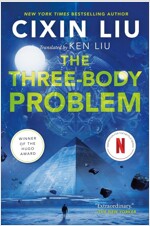The Three-Body Problem 을 읽은 지가 한참 전인데
워낙 읽어야 할 다른 책들이 쌓이고 쟁여진 탓인지
후속편은 사지도 않았고 솔직히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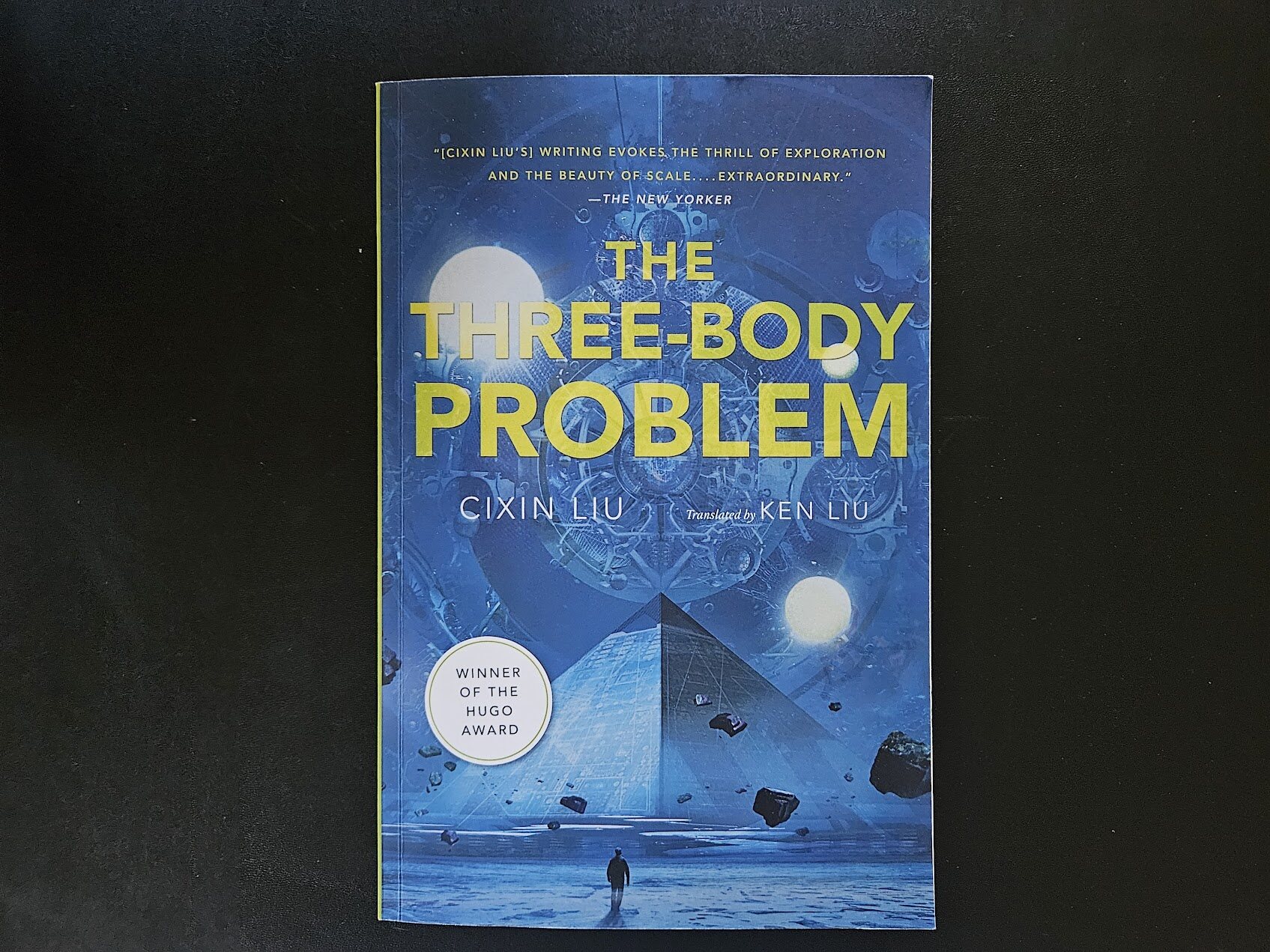
The Three-Body Problem by Liu Cixin <삼체 문제>
어차피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책을 원작으로 한 Drama 는 거의 안 보는 편이라
생각난 김에 책이나 사려고 Amazon Log In 했더니.
웬일, The Three-Body Problem 은
내가 예전에 샀던 책값의 반도 안 되는 헐값으로 떨어졌고
The Dark Forest (The Three-Body Problem Series, 2) 와
Death's End (The Three-Body Problem Series, 3),
2권의 가격을 합친 가격이 3권 다 포함된 Box Set 과 비교,
고작 $2 차이도 나지 않는다.
여기서 갈등: 후속편 두 권을 따로따로 구입하느냐,
(어차피 똑같은 책, 의미 없는 Box case)
3-Box Set: Trilogy 로 $2 더 내고 그냥 살 것이냐.
여분의 책, 선물로 줘봤자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The Three-Body Problem 을 누굴 줘야할 지도 고민.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같은 책 두 권,
아니지, 이젠 Netflix Seal 까지 찍힌 것 같으니까
겉표지만 약간 다른 책, 그냥 다 쟁이는거지, 뭐.
영어로 쓴 책은 그냥 영어로 읽고
읽은 그대로 즉각 Process 하기 때문에
따로 한국어로 뜨믄뜨믄 해석이란 걸 해 본 건
알라딘 서재에 글 쓰기 시작해서부터인데.
11살 쯤 미국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학벌로 보여지는 학업적 성취뿐 만 아니라
잘 나가는 작가로서 또한 번역자로서
나에게 늘 경이로움을 주는 Ken Liu 가
The Three-Body Problem 을 영어로 번역하며
짧게 쓴 말이 최근 내가 오역이라고 지적했던
Pain pills <고통의 알약> 과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 적어본다.
https://blog.aladin.co.kr/788030104/15546092
물론 이건 Overly literal translations 도 아닌, 그냥 오역.
일상 생활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단어의
Ridiculously far-fetched wrong translation.
Dependency 의존증과 중독을 일으키는
OxyContin 같은 Narcotics 도
처방전에 의한 진통제의 일종 (Analgesic: Painkiller) 이고
보통 <약물>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진짜 Negative connotation,
(Illegal) Drugs 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Overly literal translations, far from being faithful,
actually distort meaning by obscuring sense.”
― Ken Liu, The Three-Body Problem
Translator's Postscript (p. 398)
>>>지나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충실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식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왜곡한다.
특정한 외국어로 쓰인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Science Fiction Genre 에서 중국어를 영어로
Ken Liu 보다 더 문학적으로 잘 번역할 수 있는
대단한 번역자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문화권의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중 언어 번역자로서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하는 Ken Liu 의
이어지는 말 역시, Reasonable 하고 인상 깊다.
“The best translations into English do not, in fact,
read as if they were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The English words are arranged in such a way
that the reader sees a glimpse of
another culture’s patterns of thinking,
hears an echo of another language’s
rhythms and cadences,
and feels a tremor of another people’s
gestures and movements.”
― Ken Liu, The Three-Body Problem
Translator's Postscript (p. 398)
>>>최고의 영어 번역은
사실 원래부터 영어로 쓰인 것처럼 읽히지는 않는다.
영어 단어는 그저 독자가
다른 문화의 사고 방식을 엿보고,
다른 언어의 박자와 운율의 반향을 듣고,
다른 사람의 몸짓과 움직임의 떨림을
느낄 수 있도록 배열된다.
― Translated by Jeremy
이렇게 덜렁 끝내기는 허전하니까
책 속의 짧은 몇 문장만 인용해본다.
여전히 무리수지만, 몹시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의 발해석과 번역을 덧붙일 수 있는.
그리고 끝맺음은 작가의 P.S. 로.
“Intellectuals always make a fuss about nothing.”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25)
>>>지식인은 항상 쓸데없는 일로 소란을 피운다.
자칭 Intellectual 이라고 일컫기는 민망하지만
별 거 아닌 사소한 오역에 시간 많이 쓴 나한테
과히 어울리는 문장이 아닐까?
“Your lack of fear is based on your ignorance.”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 132)
>>>두려움의 결핍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You must know that a person’s ability
to discern the truth is directly proportional
to his knowledge.”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 64)
>>>진실을 분별하는 사람의 능력은
지식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n China, any idea that dared to take flight
would only crash back to the ground.
The gravity of reality is too strong.”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16)
>>>중국에서는 어떤 생각이든 감히 날아오르면
다시 땅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현실이란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Can the fundamental nature of matter
really be lawlessness?
Can the stability and order of the world be
but a temporary dynamic equilibrium achieved
in a corner of the universe,
a short-lived eddy in a chaotic current?”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 74)
>>>물질의 근본적인 본질이 정말 무법칙일 수 있을까?
세상의 안정과 질서는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일시적으로 달성된 동적 평형으로 혼돈의 흐름 속
잠깐의 소용돌이에 불과할 뿐인 걸까?
“No, emptiness is not nothingness.
Emptiness is a type of existence.
You must use this existential emptiness to fill yourself.”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 192)
>>>아니, 공허함은 허무가 아니다.
공허함은 존재의 한 유형이다.
이 실존적 공허함을 이용해 자신을 채워야한다.
“Should philosophy guide experiments,
or should experiments guide philosophy?”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17)
>>>철학이 실험을 이끌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험이 철학을 이끌어야 하는가?
“In the face of madness, rationality was powerless.”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p. 270)
>>>광기 앞에서는 이성이 무력했다.
“There’s a strange contradiction
revealed by the naïveté
and kindness demonstrated by humanity
when faced with the universe:
On Earth, humankind can step onto another continent,
and without a thought,
destroy the kindred civilizations found there
through warfare and disease.
But when they gaze up at the stars,
they turn sentimental and believe that
if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s exist,
they must be civilizations
bound by universal, noble, moral constraints,
as if cherishing and loving different forms of life
are parts of a self-evident universal code of conduct.
I think it should be precisely the opposite:
Let’s turn the kindness we show toward the stars
to members of the human race on Earth
and build up the trus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different peoples and civilizations
that make up humanity.”
― Liu Cixin, The Three-Body Problem
Author's Postscript for the American Edition (p. 395)
>>>인류가 우주를 마주할 때 드러나는 순진무구함과
보여지는 친절함에는 이상한 모순이 있다:
지구에서, 인류는 다른 대륙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전쟁과 질병을 통해
그 곳에 있는 동족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별을 응시할 땐 감상적으로 변하면서
외계 지성이 존재한다면, 마치 다른 형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명한 보편적 행동 규범의 일부인 양,
그것이 보편적이고 고귀하며
도덕적 제약에 묶인 문명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정확히 그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별들에게 보여준 친절을
지구상의 인류 구성원들에게 베풀고
인류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과 문명 간의
신뢰와 이해를 돈독히 하도록 하자.
― Translated by Jeremy
05-24-24 (F) 6:09 pm PST
Revised on 05-27-24 (M) 12:22 am 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