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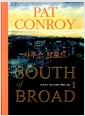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참 대단한 소설이다.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슬픈 소설이다. 그리고 대단히 웅장한 소설이다. 무척 재미있어서 책을 들면 다른 것을 하기 싫어지는 소설이다. 무척 몰입도가 높은 책이지만, 아름다운 글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싫어서 천천히 읽고 싶어지는 소설이다. 글들의 행간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궁금한 것들은 결국 책의 말미에서 풀어지겠지만, 그 결말을 알고 싶어서 조급증을 내면서 빨리 읽고 싶지 않은 소설이다.
미국적인 삶. 사람의 삶은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렇기에 미국인이 미국을 무대로 쓴 소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게다. 그러나 이 책의 무대가 된 미국 남부의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이나, LA 와는 사뭇 다른 도시이다. 다른 소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극, 사회적 비주류들이 겪는 고통들이 적나라 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모든 좋은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문제를 단지 까발리고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아픔에 함몰되어 시들어 갈 수 있는 청춘들이, 그 청춘의 빛과 아름다움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꽃 피워가는 것을 보여준다.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삶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고 우정이다.
세월은 티없이 아름답던 청춘을 서서히 잠식해간다. 아니 이 책에 나오는 청춘들은 하나같이 어려서 부터 세월의 아픔에 시들어오고, 길들여져 오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헤아리기 힘든 삶의 복잡함과,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폭력성에, 그들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연약하지만 용기있는 청춘들이다.
우연한 기회로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빠른 시간내에 서로에게서 자신들이 그리워하고 있던 그 무엇에 대한 냄새를 맡아버린다. 서로 다른 아픔속을 헤쳐왔던 그들은 미국 남동부의 그 납덩이처럼 무거운 분위기의 도시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면서 청춘의 아픔을 이기고, 삶의 메몰참과 당황스러운 상황의 출현에 함께 맞서기도 한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힘든 세상에 맞서 본 사람들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세월은 지나고 그들도 나이가 든다.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그들도 서로 자신들의 삶의 운명이 이끄는대로 자신의 삶을 찾아 나름대로의 둥지를 튼다. 화려하나 허무한 둥지, 크고 튼튼하지만 속이 텅빈 것 같은 둥지, 여전히 인생의 뒤안길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아픔에 절은 둥지. 삶이 원래 그런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삶이 더욱 지독한 것인지, 그 밝고 따뜻한 삶을 지향했던 그들에게 삶은 좀처럼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 주지 않는다.
삶은 원래 그렇게 아픈 것인가. 삶은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것인가. 삶이란 원래 그렇게 모진 것이어서, 조숙한 소년은 그토록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던가. 책은 끊임없이 삶에 대한 긍정과 아픔을 딪고 일어서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지만, 또한 섯부른 낙관이나 쉬운 행복을 펼쳐보이지도 않는다. 삶이란 끊임없이 아픔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고, 그 싸움에 함께 힘을 모은 여린 가슴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우정과 온기가 이 세상을 의미있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