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기만의 방 ㅣ 에프 클래식
버지니아 울프 지음, 김율희 옮김 / F(에프) / 2021년 3월
평점 :



봄밤은 괜히 기분이 좋아져 잠을 일찍 청할 수가 없다.
더구나 코로나로 외출마저 힘겨운 요즘 봄밤의 독서란 우울함을 극복하기에
안성맞춤인 취미생활이다.
표지 그림에 무언가를 감춘 듯한 책 한 권을 만났다.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지음, f에프 펴냄)"이 그 책인데, 커튼이 드리워진
창 밖은 짙푸른 밤의 색을 닮았다,
작은 꽃화분 뒤로 초록 가지가 오르는 창은 평화롭고 단조로운 느낌이다.
레이스 커튼을 보니 아마도 이 방의 주인은 여성인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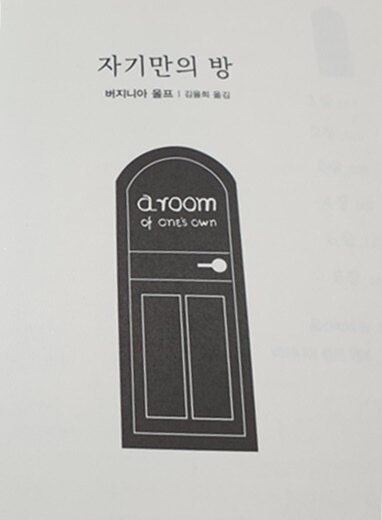
a room of one's own
굳게 닫힌 방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걸까?
공연히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해져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여성 작가로 잘 알려진 버지니아 울프는
지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돈이 정작 여성에게는 없다는 말을 하며 그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주 오래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나 경제활동 혹은 재산권 같은 권리들은 주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그저 살림을 하는 남편의 밑에서 가사 활동을 하는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나'는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 제체가 갈등의 씨앗이 될 뿐 그 누구도 그런 '나'의 생각에 호의적이지 않다.
'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자신의 길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친다.
"저녁이 되었는데 의미 있는 주장이나 믿을 만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오다니,
실망스러웟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난한데 그건,,,,,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어쩌면 이제는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용암처럼 뜨겁게 개숫물처럼 혼탁한,
눈사태처럼 덮쳐 오는 수많은 의견을 머리에 받아들이는 것도 표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 p. 64
남성과 달리 제약이 많았던 여성의 모습, 아마도 작가 본인이 느꼈던 불편한 편견과
성별에 따른 제약이 주는 답답함 등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다.
또한 이야기 속 '나'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저 메리 비턴이나 메리 시턴 또는 메리
카마이클 또는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말에서 '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닌
그녀들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녀들 중 그 누구면 혹은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녀이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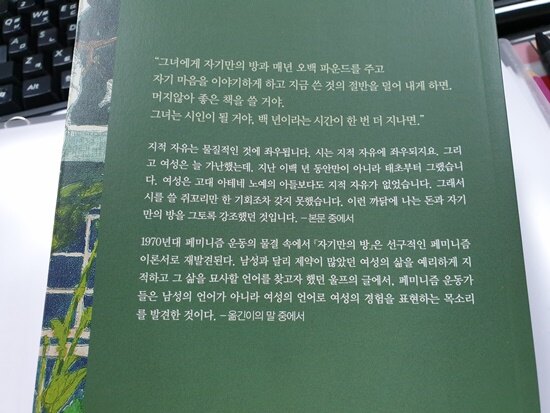
"그녀에게 자기만의 방과 매년 오백 파운드를 주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게 하고
지금 쓴 것의 절반을 덜어 내게 하면, 머지않아 좋은 책을 쓸 거야.
그녀는 시인이 될 거야. 백 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 더 지나면."
자기만의 방에서 글쓰기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 자신을 향한 끝임없는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녀는 행복했을까?
글을 써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닌 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직업, 경제적 자립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자기만의 방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장애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는지 모른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한 질문들을 하는 시간, 수많은 '나'의 발전을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