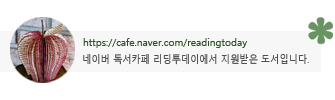-

-
풀잎관 3 - 2부 ㅣ 마스터스 오브 로마 2
콜린 매컬로 지음, 강선재 외 옮김 / 교유서가 / 2015년 11월
평점 :

품절


술라는 최초로 경험한 절대 권력의 힘을 만끽하며 세상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됐다. 국정 운영이라는 대의명분을 빌미로 윤리적 제약이나 도덕으로 자유로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호민관은 (술라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열 명 모두 술키피우스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술라는 정무관 직만큼은 반드시 강경파 보수주의자들로 채워야겠다고 작정했다. 사실 동방 원정을 앞두고 로마에 주둔하게 된 카푸아 군단의 불만도 해결해야할 문제였지만, 술라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로마 시민의 민심이었다. 로마가 아닌 술라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장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한 술라를, 불구의 노장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쫓아버린 그를 향한 보이지 않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어서 빨리 동방의 미트리다테스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거두어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구해내 마리우스의 명성을 뛰어넘어야만 시민들은 로마로 진군한 술라를 용서해줄 것이다. 술라는 1월, 로마를 떠났다. 포룸 로마눔 연단 벽에 술키피우스의 머리통을 긴 창 위에 꽂아 놓은 뒤에.
- 술라는 자식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 동지였던 퀸투스 폼페이우스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자신의 지지자를 끌어들여 가차없이 제거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 오직 적 아니면 지지자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