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르트 블랑슈 ㅣ 이언 플레밍의 007 시리즈
제프리 디버 지음, 박찬원 옮김 / 뿔(웅진) / 2011년 6월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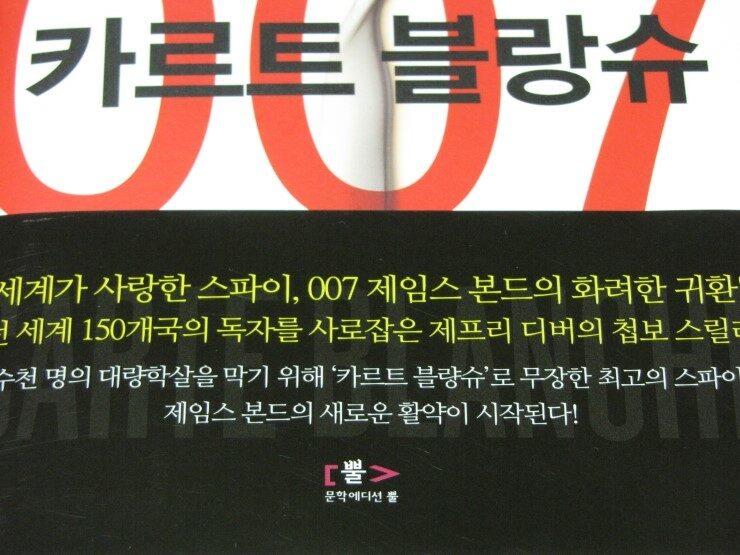
숀 코너리, 티모시 달튼 주연의 007 영화는 너무 어릴 적에 봐서인지 잘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007의 주연은 피어스 브로스넌이었다. 이언 플레밍의 소설인 007 시리즈, 주로 나는 영화로만 보았고, 원작 소설로는 단 한번도 읽어본 기억이 없었다. 화려한 액션과 그리고 본드걸로 불리우는 매력적인 여성들과의 염문, 첩보원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007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귀에 남을 작품들이었다.
실제로 지구상의 인구 다섯명중 한명꼴로 007 영화를 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그 인기는 상상을 넘어설 수준이다.
이 대단한 007 시리즈는 1964년 이언 플레밍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종결이 되어버렸다.
이언 플레밍 재단에서 제프리 디버에게 새로운 007 시리즈를 제안하기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제임스 본드가 탄생했다. 30대 초반의 나이 180을 넘는 훤칠한 키, 스마트폰 앱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2003년도의 르망 레이스도 직접 목격한 제임스 본드의 탄생을 말이다.
고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무척이나 인상깊게 보고 그 후속작 스칼렛을 볼 수 있었을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 역시 컸다.
어, 이게 아닌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득했다. 너무나 재미있게 본 전작의 후속편이 전편을 능가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드물다. 게다가 007은 이미 시리즈 전체가 인기를 끌었던 대단한 작품이었다. 본 콜렉터 등 유명 작품을 많이 쓴 제프리 디버였지만 아마 그 사명감과 중압감은 상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영화로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소설로 그의 007을 처음 만난 지금, 나는 그의 007 시리즈로서의 데뷔가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007 자네는 카르트 블랑슈, 백지 위임장을 가지고 자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임무를 수행해왔네. 자네는 독자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게 잘 맞아떨어졌지. 대부분은 말일세. 하지만 국내에서 자네 권한은 제한되어 있네. 그것도 상당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69p
언제나 홀로 활동하고, 거의 모든 재량권을 가진 그가 정작 그가 주력해야할 국내에서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있다는 아이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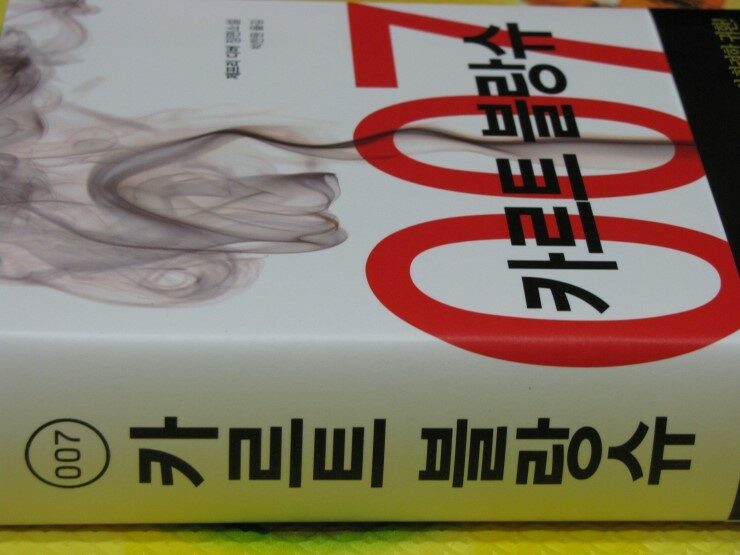
소설 두권 정도를 합쳐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두께에 읽기전부터 압도가 되었지만, 초반부터 질질 시간 끌기에 급급한 그런 소설들과 달리 초반부터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건의 탄생은 역시 007 시리즈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 영화 상에서도 그러지 않은가. 지루함없이 이끌어주는 그런 스토리들. 초반부터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스토리는 지루함을 날려버리고 책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읽는내내 놀랐던 것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책을 읽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뛰어난 필력이었다.
거사 20, 수천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음모를 파헤치고 막아내기 위해 본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국내에서의 권한 제한때문에 동업자의 힘을 구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진다.
초반에 유독성이 있는 기차를 전복시키려 했던 니얼 던이라는 인물을 놓치게 되고, 진정한 거사 20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희박한 단서 속에 보물찾기 같은 그런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니얼 던의 배후에 하이트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 사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끔찍하게도 그는 시체 애호가에 폐기물을 사랑하는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기계적이고도 완벽한 계획성을 자랑하는 니얼 던의 용이주도함에 사건 해결이 숱한 난항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제임스 본드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넘기며 사건에 더욱 접근해 나간다. 세르비아에서 시작된 본드의 추격은 영국, 두바이를 거쳐 남아공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남아프리카는 러시아 같습니다. 구체제가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이 점이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정치라든가 온갖 종류의 일들에 한몫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때로는 합법적으로, 때로는 반대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함께 많은 첩보원이 온다.' SAPS에서는 그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주 어깨 너머를 살고 있어요. 249P
중간부분까지도 상당히 재미있었지만, 결말에 가까운 후반으로 갈수록 몇번이나 뒤집어지는 반전에 반전의 거듭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타임스에서 말한 카르트 블랑슈는 그 어떤 본드 차의 추적보다도 고통스러운 반전과 역전으로 가득 찬 빠른 전개를 약속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결말이었다. 또한 스피디한 사건의 전개와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스릴 넘치는 액션 장면등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제임스 본드를 만났다는 확신에 마침표를 찍어주면서, 연이은 그의 후속작, 007의 활약상들에 부푼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