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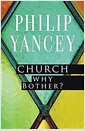
-
Church: Why Bother? (Paperback)
Philip Yancey / Zondervan / 2015년 10월
평점 :



원제인 ‘Church: Why Bother?’를 직역하면 ‘교회, 왜 굳이 성가시게 가야 하지?’라는 냉소적인 질문이 된다. 반면 우리말 도서명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은 애증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신앙인의 마음을 절묘하게 포착해냈다. 불신자가 교회에 갖는 의구심 또한 그 기저에는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비판을 성장을 위한 뼈아픈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따뜻한 해답을 건네준 이 책이 못내 고맙다.
필립 얀시의 책을 읽는 지금, 공교롭게도 그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선언이 서늘하게 다가온다. 작가의 이중성에 잠시 반감이 일기도 했으나, 이내 그의 티눈보다 내 눈 속의 들보가 더 무거움을 깨달았다. 소설 ‘주홍글자’의 딤즈데일 목사처럼, 그 역시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영혼의 가벼움을 얻었을까. 그의 인간적 얼룩이 이 책이 머금은 빛나는 가치까지 희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작가의 허물은 교회의 민낯과 닮아있다. 교회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위태로운 운명을 타고났다. 교회가 완성이 아니라 ‘공사 중인 시작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이며, 오랜 기다림의 시작이다. 실수투성이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어야 하듯, 부족함이 교회의 ‘기본값’임을 인정해야 한다. 작가는 관찰자의 시선을 거두고 시선의 방향을 하늘로(Up), 주변으로(Around), 밖으로(Outward), 그리고 안으로(Inward) 옮기라고 조언한다.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이며, 목사는 배우에게 대사를 상기시키는 ‘프롬프터(Prompter)’에 불과하다. 전령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표현이 다소 서툴거나 지루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본질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면, 우리에겐 설교의 기교를 채점하거나 목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간 주제넘게 설교를 판단했던 나의 오만함이 이 글 앞에서 뜨겁게 부끄러워졌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멜팅 팟(Melting Pot)’과 같다. 하나됨(Unity)은 획일성(Uniformity)이 아니며, 다양성(Diversity)은 분열(Division)의 동의어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결이 같은 사람에게 끌리겠지만, ‘같음’만 수용하는 곳에는 예수의 숨결이 머물 수 없다. 나와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교회는 ‘거름’과 같다. 한곳에 쌓여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넓게 나누고 펼쳐지면 세상을 비옥하게 일군다. 기독교를 ‘목발 종교’라 부르는 냉소적인 시선조차,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목발이 되어주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AA)이 교회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례는 뼈아픈 대목이다. 교회가 은혜의 등불이 되기는커녕, 판단의 잣대로 타인의 아픔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본다.
헌신에 있어서는 ‘신경과민’과 ‘굳은살’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필요하다. 타인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되, 내 눈물만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인간은 약함이라는 틈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다. 이웃에게 어깨를 빌려주어도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 우리는 지나친 예민함을 내려놓고 거룩한 굳은살이 돋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 사랑의 무게를 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교회가 나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해묵은 기대를 내려놓으려 한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가슴에 새긴다.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여, 공동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사랑의 흔적이 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