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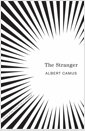
-
The Stranger (Paperback) - 『이방인』영문판
알베르 카뮈 지음, Ward, Matthew 옮김 / Vintage / 1989년 3월
평점 :



‘이방인’이란 제목만 들어도 차가운 느낌이 찾아든다. 제목이 내용과 너무나 잘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분량이 적고 쉬운 활자이지만 내용이 너무 무거워 책을 덮고도 여운이 크게 남아 다른 리뷰와 유투브 영상 여러개를 보았다. 화려한 수식어구 없이 간결하고 정갈하게 메세지를 던지니 사유는 내 몫으로 남았다. 어렵고 철학적인 책이다.
책에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습관때문인지 모르나 나 역시 올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사회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의 거리까지 두어야 할 지경으로 서로 간의 거리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프랑스 식민지 하에 있던 Algeria에서 태어난 Camus가 2차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에 출간한 책이다. COVID-19을 겪는 올 해도 이리 우울한데 전쟁 중에 알제리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이방인의 심정으로 대전을 겪으며 Camus가 어떤 마음으로 펜을 잡았을지 약간 이해가 되려한다.
도발적인 제목만큼 책의 첫 문장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마저 ‘학습된 연상’의 일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가? 감정 표현도 학습의 잔재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혹은 문화속에서 배운대로 표현되어야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다. 즉 주인공 Monsieur Meursault는 엄마 Maman의 죽음에 임하는 자세 때문에 결국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 그는, 엄마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 장례식에서 흘려야 하는 감정 표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서 모두 상식을 벗어난다.
물론,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저절로 눈물이 흐르거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소원했던 가족이라해도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식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인공은 재판장에서 인간적인 면모라고는 조금도 없는 범죄자의 영혼을 가진자로서 검사에게 기소되어 결국 배심원들은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법정에서의 검사의 논리가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분노하게 했다. 왜 아랍인을 죽였느냐는 질문에 주인공은 “햇살이 너무 강해서”라고 대답을 한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가 떠오른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 조르바를 닮았다. 정직하게 필터없이 말을 하지만 그건 법정에서 기대했던 답은 아닌 것이다. 그가 아랍인을 죽였다는 것때문에 법정에 섰는데 중심 논쟁은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으로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몰아가고, 법정에서 그는 그저 이방인으로 앉아 법정의 부조리를 침묵으로 마주한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Nothing, nothing mattered.) 살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엄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된다한들 어짜피 모두가 죽느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며 부드러운 무관심(gentle indifference)을 보이며 마치 형제애까지 느낀다고 했다.
그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만큼이나 세상을 향해서도 큰 욕심이나 애정이 없었다. Marie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녀가 원하면 결혼할 수 있었고, 이웃집 Raymond가 대필을 원하면 아니 써 줄 이유가 없었다. 세상을 향한 큰 애정, 미움, 거절, 반항도 없이 살았던 주인공은 죽음도 그렇게 맞이한다. 세상을 향한 부조리를 향해 그가 했던 최고의 저항이 아니었을까?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았으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왔다.
주인공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인물이다. 상식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인가? 보편적인 기준이나 도덕이라는 규범에 들지 않으면 비상식이 되고 이것이 굴레로 작용하고 엄청난 부조리의 무기까지 된다. 나 또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직면하는가? 어쩌면 주인공처럼 차라리 세상의 이방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거나 역겨워하지 않으며 죽음마저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방인으로 살면서 주인공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가? 그러면서 안고 가야하는 감정의 묵직한 찌꺼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방인으로 살았으나 세상을 향해 gentle indifference를 품을 수 있었던 주인공이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