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보는 사람들 - 버지니아 울프, 젤다 피츠제럴드 그리고 나의 아버지
샘 밀스 지음, 이승민 옮김 / 정은문고 / 2022년 7월
평점 :




도 서: 돌보는 사람들 / 저 자: 샘 밀스 / 출판사; 정은문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의 개인사를 안다면 질환의 그의 캐릭턱에 생긴 일시적 변화려니 하지만, 개인사를 모르면 질환 자체가 그의 캐릭터가 된다.
-본문 중-
책을 읽기 전까진 어느 내용인지 가늠하지 못했다. 버지니아 울프, 젤다 피츠제럴드 라는 이름 때문에 호기심을 읽게 된 도서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 이면서 동시에 과거 두 여성 작가가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친부의 간병과 함께 책은 섞어서 흘러간다. 첫 장은 아버지를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장황한 설명이 아니어도 상황이 어떤지 대략 가늠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자의 간병이야기....그렇다, 책은 바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다른 가족을 모습을 보여주며, 버지니아와 젤다 역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인물이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현재 저자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알려준다. 간병인 단어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긴 병에도 효자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으레 여성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만든다. 어떤 절차도 없이 말이다.
저자인 샘 역시 그랬다.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긴장증에서 조현증으로 발전해 병원을 수시로 오가고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보호자로 간병인으로 친부와 같이 살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슬픈 건 아버지의 병명이 아닌 친모의 죽음이다. 악착같이 아버지를 돌봤지만 병에 걸려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저자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아버지가 왜 조현증을 갖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하여튼, 이런 환경에서 작가로 글을 써야하는 즉,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하는 순간에도 오로지 간병인으로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또한, 만나던 연인과도 결국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오로지 상대방에 맞춰 간병을 했던 인물이 있는 데 바로 레너드 울프 즉, 버지니아의 남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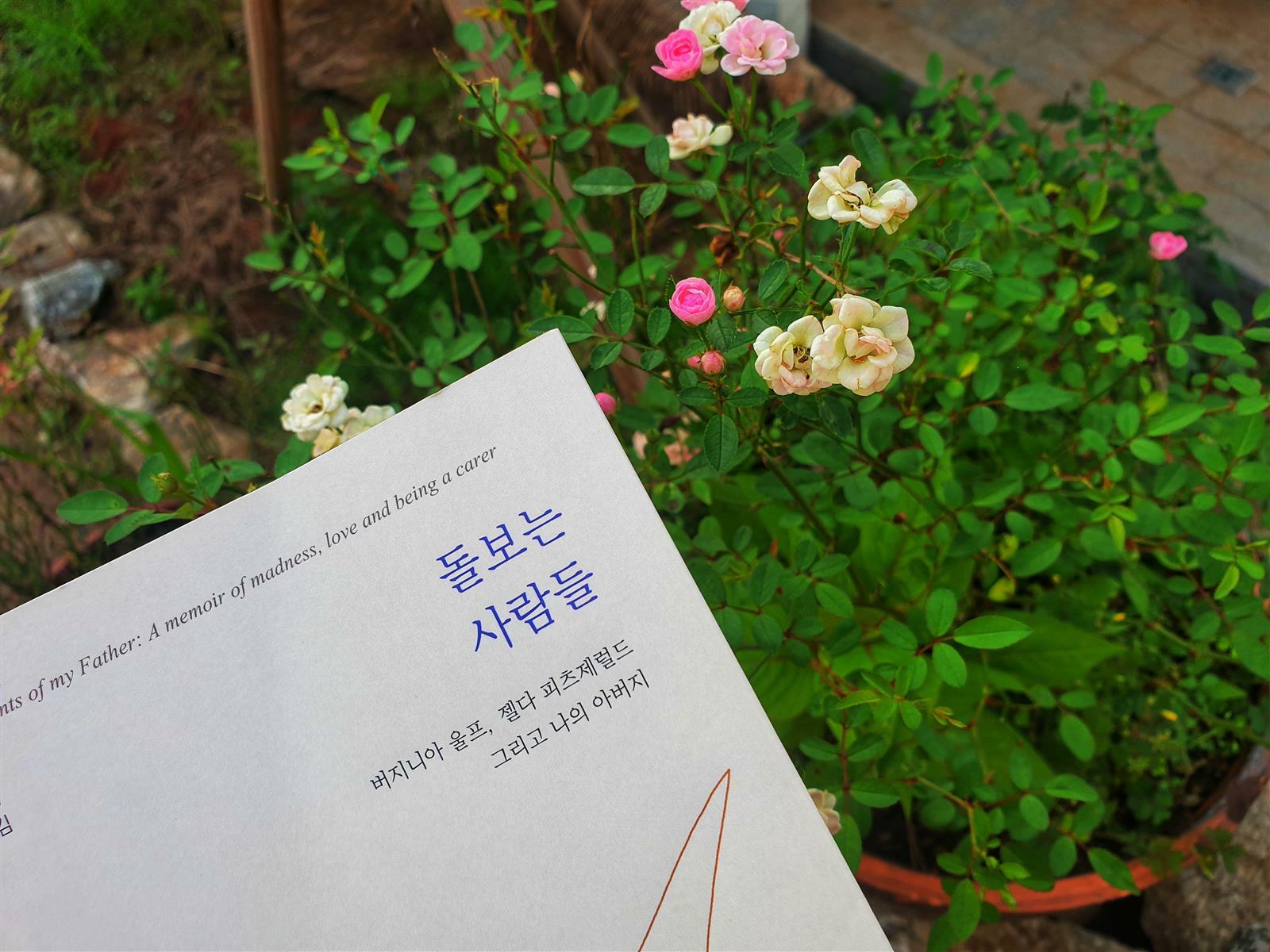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 전에 얼마만큼 시간을 함께 보냈든, 그것으로는 언제나 부족하다.
-본문 중-
책은 '돌봄'이라는 단어를 앞서 언급했었고, 저자는 여기서 레너드와 스콧 두 배우자를 비교하면서 간병인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려놓았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레너드야 말로 최고의 간병인으로 말하는 데 버지니아에게 몇 번의 청혼을 했었고 고민 끝에 버지니아는 승낙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그녀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 쇠약(통틀어서)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남편인 레너드는 아내를 위해 병원과 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정을 주기 위해 자신의 욕심(아이와 성적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아내 간병을 위해 1차 세계대전 징집을 피해야 했었고, 설령 살던 도시가 침략 당할 시 두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이런 전쟁이 더욱더 버지니아를 불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대로 레너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았는 데 신경이 쇠약해진 아내를 두고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최선의 안정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 역시 아버지를 돌보면서 새로운 환경 보다는 생활패턴이 비슷하고 안정을 주는 환경이 최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피츠제럴드 부부에게 강하게 끌린 이유는 지난 수년간 나를 따라다니던 물음을 그들이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본이라는 도전을 내가 도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본문 중-
레너드를 보면서 작가는 버지니아의 천재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력한 모습과 반대로 스콧은 아내 젤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치료에 집중하면서 창작에 대해선 외면하기 바랐다. 버지니아가 살았던 당시는 여성 인권(전체적으로)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레너드는 여성 인권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스콧은 여성이라면 아내라는 이름에 묶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질환을 가졌더라도 버지니아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젤다는 숨죽여야만 했었다. 두 남성의 간병의 모습 속에서 샘은 자신이 겪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했다. 레너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팔면서도 아내가 낫기를 바란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게 했다. 하지만, 저자는 프리랜서로 정규 수입도 없을 뿐더러 모든 시간을 아버지에게 할애해야만 했다는 점. 엄마가 아프게 되면서 부모님을 돌봐야했던 순간들...그리고 잘못된 만남으로 낭비해버린 시간들..내가 봐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발로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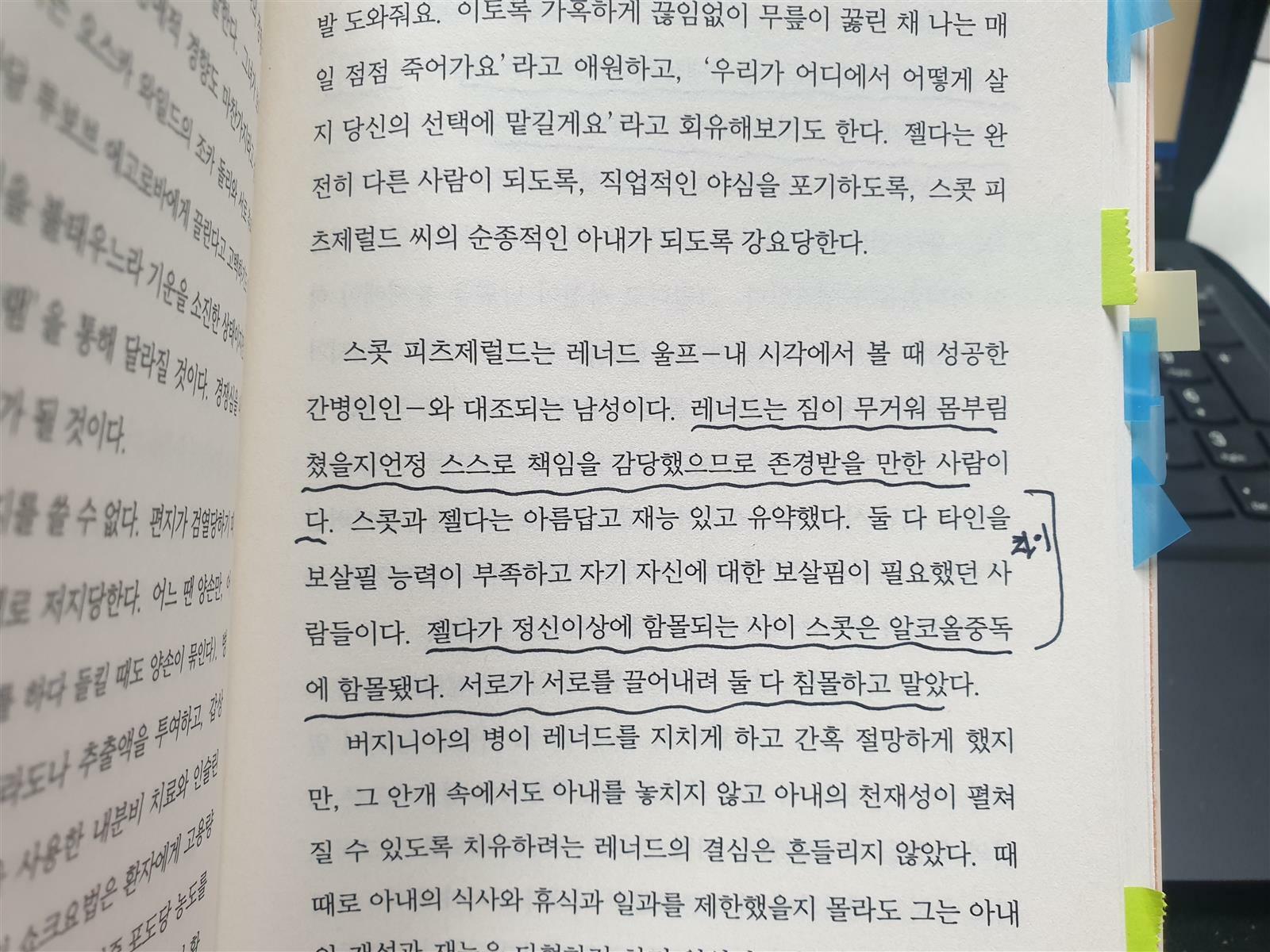

아버지의 안정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아버지가 밤낮으로 복용하는 무지개 색 알약들만이 아니었다. 안전하다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내가 곁에 있다는 확인, 이것 역시 필요했다.
-본문 중-
레너드는 마지막까지도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반면, 스콧은 아내와 같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렇다고 후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을 희생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 쉽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작가로 성공했고 병원비를 마련해야하는 입장이라면 말이다. 힘든 시간에 저자는 스콧이 겪은 그 마음이 자신과 같음을 인지하기도 했고, 반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삶을 붙잡기도 했다. 더 나아가 조현증에 대해 알아보고 각 나라마다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선진국 보다 개발 도상국이 차도가 있다고 하는 데 이건, 가난으로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서 서서히 호전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약물 치료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 돌봄 제공자 권리 운동 시작이 한 개인에서 시작되어 1970년에 복지 지원으로 간병인 수당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많다. 다행히 저자의 아버지는 불안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호전되어 간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에세이를 쓰게 된 <돌보는 사람들> ...힘든 감정과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을 버지니아와 젤다를 통해 이해와 용기를 갖기도 했다. 마지막 저자와 아버지의 사진속에 샘은 환하게 웃고 있는 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기에 지금의 아버지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비록 엄마와 약속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녀에게도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행복한 순간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