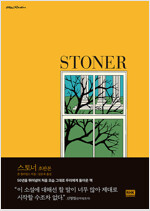
특이한 책이다. 1891년생 윌리엄 스토너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인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한 번 잡고 나서 다 읽을 때까지 놓지 못해서 저녁 6시에 읽기 시작해 자정에 다 읽었다.
처음에는 농투성이의 자식으로서 농사만 짓던 윌리엄이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농업에서 문학으로 전향하는 과정이 기대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것도 문학에 매혹되어서 그의 삶이 전복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것은 늘 매혹적인 일이므로.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윌리엄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의외로 극적이지 않았다. 윌리엄은 1,2차 세계대전 시기에 젊음을 보냈는데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대학에 남았고 친구를 잃었다는 언급 정도만 있고, 2차 대전의 격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물론 진주만 사태 등등은 언급이 되었지만.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내용에 괴리감이 느껴졌다. 1910년대 이후가 배경인데 너무 모던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잠깐 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미국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이 영문학도이고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영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교수 사회의 암투, 스승과 제자의 불륜 등 미국 대학교수 사회에 대해서도 꽤나 상세히 나오고 이 대목에서는 정말 시대를 잊게 만든다. 1965년 발표 당시의 상황과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감동했다. 옮긴이는 악인들에 대항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슬프다고 했고, 이 책의 저자는 윌리엄 스토너가 영웅이라고도 했단다. 그래서 영웅인 스토너의 삶과 죽음에 눈물짓는 독자들이 많아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견해에 다 반대한다. 스토너는 선인도 영웅도 아니고 그냥 필부다. 필부. 지극히 평범해서 서글픈. 필부 스토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다름 아님으로 서글픈 것이다. 그의 삶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므로.
원서 샘플을 읽어 보았는데 문장이 깔끔 담백했다. 다시 원서로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다. 발표 50년 후에나 주목을 받았다는 이 작품의 사연과 이 책의 주인공, 필부였던 윌리엄 스토너의 생애가 겹쳐져 더 눈물겹다. 우리네 삶은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스토너는 학문 세계에서도, 아내와도, 딸과도, 친구와도, 연인과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들을 맺어 왔고 그의 삶의 마무리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그러기에 더 사무치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필부들의 삶이기에.
존 윌리엄스 덕분에 나의 일상적 시공간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다. 실로 이런 기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다. full refreshment!!
더불어 점점 원서와 멀어지는 삶이 슬펐다. 스토너 원서 한 권 들고 방에 틀어박혀 이틀만 있다가 나왔으면 했다. 그런 이상적인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