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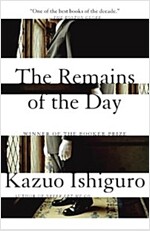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를 잇는 작품이라니 어떻게 기대없이 읽을 수 있나. '남아있는 나날'은 원서로 읽었고 '나를 보내지 마'는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읽으려고 했으나 그 발상이 너무나 처참해서 영화만 보고 말았었다. 하지만 그 둘을 잇는다니.
'남아있는 나날'은 내용보다는 그 만연하지만 아름다운 그의 영어 문장 때문에 끝까지 읽었다. 그 장중하고도 유려한 문체가 인상깊었다. 길게 이어져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그 문장을 하나하나 즐기며 읽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진전은 아주 느렸다. 그런데 이 작품도 그러하다.
번역이 많이 아쉽기도 했다. (물론 번역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는 알고 있다.) 합리적인 호텔, 등급이 높은 옷 등등의 문장들이 어색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price는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을 의미한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호텔이라니.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쓴다는 말인가. 등급이 높은 옷도 그렇고 많지는 않지만 읽어가면서 걸리는 것들이 꽤 있었다. 간간히 눈에 띄었다. 딱히 표시를 해 놓고 읽지는 않아서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못 하지만.
폴 오스터를 번역본으로 접하고도 감동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원서로 읽고 팬이 되었다. 가즈오 이시구로도 같은 결론이다. 어서 원서를 구해서 다시 읽어봐야겠지만 그래도 왠지 실망할 것 같다. 하지만 어서 읽어보고 싶기도 하다. 번역을 떠나서 내용 전개와 결말에 아쉬움이 많았다.

읽는 내내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이 떠올랐다. '천 개의 파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파릇파릇하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은 늘 뭔가 억눌린 듯한 느낌이다. 이번 작품이 AF(Artificial Friend)의 목소리로 전개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그만의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다.
인공지능 분야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감정을 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듯하다. 영화 '서복'도 그렇고.

오래 전 만화였던 '빅 히어로'에서부터였던가. 감정을 가진 로봇. 이것이 정말 가능하려나 보다. 미래에는. 인간이 이렇게 꿈꾸고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