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낙 평들이 좋아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다. 기대와는 다르게 이 책은 '집'에 대한 내용이 아닌 여러 집을 전전하며 살던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책은 저자의 말처럼 '집이 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집을 통해 본 한 여성의 성장기' 이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물리적 장소' 안에서 여성의 '상징적 자리'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집이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긴 하지만 한 인간의 성장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후자가 더 기대가 됐고 다 읽고 나서도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에 여기에 옮겨 본다.
저자는 '서구 사회의 전통은 결혼한 여성에게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통은 원래 성을 유지케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섞이지 않은 여성을 가족 안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부계 혈통주의에서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것이 아니라 감히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살며 나를 소개할 때 사뭇 자랑스럽게 '우리는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라고 말하며 다녔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얼마나 결혼한 여성에게 주체성을 부여했는가에는 회의적이다. 어차피 결혼 제도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편 성을 따르게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해 보이지 조차 않는다.
"여성의 삶을 방해하고 축소하는 가부장적 결혼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결혼"(에이드리언 리치) 이라는 인용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결혼은 없다고 본다. 결혼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자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가부장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여성이 자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결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뼈아픈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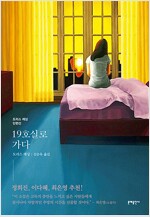
'자기만의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이 언제든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엄마의 독서, 사색, 휴식은 수시로 멈춰졌다. ...내가 엄마만의 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괜찮아, 집 전체가 다 내 방이지." 엄마의 뜻과 달리 그 말은 엄마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며느리-아내-엄마인 여자는 집 안의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하므로 집 안의 어느 곳도 소유해서는 안 되었다. 엄마는 장소 그 자체였다.' 하지만 엄마가 엄마의 방이 있었다고 해도 언제든 엄마는 방해받았을 것이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엄마는 '19호실로 가도' 결국 자살하고 만다. '19호실로 가다'의 수잔은 결혼 제도가 여성에게, 아내에게, 엄마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잔은 '나'이기도 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암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