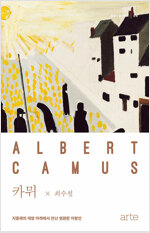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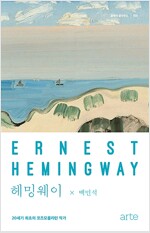

지금까지 총 26권이 출간된 아르떼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세 권 읽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까뮈, 헤밍웨이, 피츠제럴드가 다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쓴 최민석 '피츠제럴드' 편을 제일 먼저 읽었었다. 세 권을 다 읽고 난 지금 생각해 보니 최민석 작품을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작가가 서술해놓은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을 테니까.
이 세 작가들은 멋진 작품을 남겨 불멸의 작가가 됐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힘겨웠다. 우리네 인생이 힘겹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마는, 그들의 삶이 유독 고달퍼 보이는 것은 내 사심이 들어간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작가일지라도 개인적인 면면이 성자와 같다거나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었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방탕하거나 심각한 여성편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재삼재사 확인하고 나니 그들의 작품에 대한 감흥이 줄어들 정도였다. 이런 마초들이라니. 또 하나같이 그들의 죽음이 안타까웠다. 카뮈의 예상치 않은 죽음과 헤밍웨이의 전기치료 등으로 인한 후유증과 자살, 피츠제럴드의 병사 등등.
이 시리즈들은 유명 작가의 작품과 함께 그 작가들의 실제 삶을 추적해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글을 쓴 작가와 함께 이미 고인이 된 세계 작가들의 뒤를 쫓는 느낌이다. 기행문의 형식을 띠면서도 작품을 분석해 나가는 재미있는 형태의 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책도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보다 그것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 느낌에 큰 차이가 있었다. 픽션이 아니고 거의 논문 형태의 글이라 작가의 개성이 많이 눈에 띠지 않는 듯해 어떤 작가를 다루고 있느냐가 오히려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내게는 최수철 작가는 딱딱했고 백민석 작가는 무미했고 최민석 작가는 탁월하게 느껴졌으니 말이다. 이는 카뮈와 헤밍웨이와 피츠제럴드에 대한 나의 생각과는 별 연관이 없는 듯 했다.
최민석의 '피츠제럴드'를 읽고 예상외로 감동해서 부랴부랴 최수철의 '까뮈'와 백민석의 '헤밍웨이' 편을 찾아 읽었지만 최민석 작품과는 달리 나중에 접한 두 권의 책은 논문같은 느낌이 많고 소소한 재미나 감동, 고전 작가에 대한 현 작가들의 탁월한 해석, 그들을 뒤쫒는 과정에서의 작가만의 독특한 감회 등을 거의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웠다.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만 개인적 소회를 너무 절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근 삼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작가의 뒤를 쫒아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역량과 출판사의 기획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출간할 예정이라니 더더욱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 이다혜와 김사과를 좋아하는데 이다혜의 '코난 도일' 편은 이미 나왔고 김사과의 작품도 곧 나올 예정인가 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사과가 쓰고 있는 '헨리 제임스' 작품을 많이 안 접해 봤는데 이 시리즈를 읽기 위해 헨리 제임스에 대해서 예습을 하고 읽어야 할 것 같다. 아직 출간 전이니 시간을 벌었다고나 할까. 아니 이다혜의 '코난 도일'부터 읽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의 꼬꼬무 독서는 계속 되고 있다. 즐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