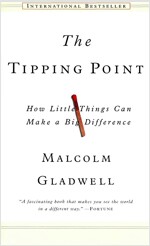

유독 말콤 글래드웰이 한국에서 인기있는 이유는 뭘까. 지역도서관에도 학교도서관에도 가장 눈이 띄는 영어원서는 단연 말콤 글래드웰 작품이다. 특히나 베스트셀러 픽션 이외의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왤까.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골라들었다. 그나마 대출할 수 있는 원서니까. (한국 원서 값은 매우 비싸다. 이래서 전자책을 선호하는 것이다. 특히 최신간 영어 원서는 전자책이 최고. 모르는 단어도 하나도 안 놓칠 수 있고. 물론 독서에 방해되기도 하지만.)
지난 주말에 갔던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도 말콤 글래드웰과 유발 하라리 판매 대전(?)을 하고 있었다. 유발 하라리 작품은 많지 않지만,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가 꽤 많은데 예전 것까지 다 모아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다. 왤까.
얼마 전 같은 그 이유-가장 구하기 쉬운 논픽션 영어원서- 로 그의 책 '블링크'를 읽었었다. 2005년 작품이라서 시대차가 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 왠지 역주행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 책은 2000년작. 말콤 글래드웰 글의 특징은 당대 나름 트렌디한 예시들을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삼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작품은 최대한 빨리 사보는 것이 좋다. 시류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시들의 맹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그 예시가 빛을 잃는다는 것. 1990년대의 예를 2020년에 읽자니 좀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팬데믹 시대에 'The Three Rules of Epidemic'이라니. 에피데믹이니 판데믹이니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닌가 싶어 끔찍했다. 20년 전에 앞으로 진정한 에피데믹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저자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유발 하라리는 그런 면에서 시대를 견디는 작품을 쓴 것 같다. 오랜 역사에서 예를 찾고 있으니. 지금이 언제인데 새서미 스트리트, 블루즈 클루라니. 허쉬 퍼피의 예나 소문을 내주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갑자기 티핑 포인트를 찾게 되는 이야기들은 정말 오래 되어 보였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읽은 '포노사피엔스'가 떠올랐다. 현대 마케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 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낡은 책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아닌가 한다. 입소문을 내주는 몇몇 때문에 갑자기 판매고가 오르는 것을 거칠게 비유하자면, sns를 타고, 인스타를 타고 넘나드는 소문과, 스토리가 스토리를 낳아 먹고 먹히는 유통 시장의 판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 방법이 달라졌지 그 바탕의 개념은 유사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내려 갔으나 끝까지 그 뭔가는 없었다.
왠지 기억에 남는 것은 쓸데없이 지엽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 좋은 동네에서 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나쁜 동네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등이었다. (A child is better off in a good neighborhood and a troubled family than he or she is in a troubled neighborhood and a good family. p.167, What it is saying is that whatever that environmental influence is, it doesn't have a lot to do with parents. It's something else, and what Judith Harris argues is that that something else is the influence of peers.p. 41) 그럼 좋은 동네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면 부모가 좀 잘 못 해도 되는 건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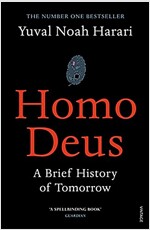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한국에서 유독 말콤 글래드웰이 인기일까. 마치 논픽션계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다. 한국어판 독자들에게 따로 인사를 전하는 그 베르나르말이다. 어휘는 말콤 글래드웰이 유발 하라리보다 쉽다. 유발 하라리의 영어 문체는 한국인에게 익숙하다. 문체나 어휘 면에서는 특이점이 없고 단연 특이하고 놀라운 예들을 종횡무진한다는 것이 말콤 글래드웰 작품의 특성인데 아쉽게도 이 점이 시대를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는 말콤 글래드웰보다는 빌 브라이슨을 더 좋아한다. 미국에서는 두 저자들이 신간을 내면 비슷하게 읽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콤 글래드웰이 조금 인지도가 높은가. 모르겠다. 하지만 시대를 견딘다는 점에서는 빌 브라이슨이 단연 앞선다. 그는 시대를 읽는 데는 관심이 일도 없다. 그렇다고 시대를 놓치고 있지도 않고. 문체도 정말 재미있고. 그래서 빌 브라이슨과 유발 하라리의 작품들을 나란히 놓고 프로모션을 벌이는 장면을 혼자 상상하고 웃었다. 물론 영역이 좀 다르긴 하다. 뭔가 시대를 읽으려 한다는 점에서 말콤과 유발을 함께 묶은 것이겠지.
이렇게 말콤이 약간 과대포장되어있다는 사실을 못 마땅해 하면서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대출한 또 다른 그의 책이 집에 있다. ㅠㅠ 바로 아웃라이어. 그래도 이 책은 2008년 책이니 그나마 낫겠지. 그런데 읽어야 하나. 읽을 수 있을까. 워낙 말콤이 한국에서 많이 인용되어서 더이상 그가 하는 이야기가 새롭지 않게 여겨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번역되기 전에 그의 최신간(타인의 해석)을 읽었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듯하다. 물론 예시들도 최첨단이고 말이다.
한국 와서 말콤 책만 읽다보니 빌 브라이슨이 더 그리워진다. 빌도 말콤만큼 자주 책을 내 주면 좋을 텐데..빌 브라이슨의 'The body'도 정말 좋은 책인데. 그의 넘치는 위트가 새삼 그립다. 그러고보니 한국인들은 시대를 읽고 싶은 것인가 싶기도 하다. 장강명 작가 말로는 한국에서 논픽션을 쓰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써도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그러한 이유로 한국에 논픽션 작가들이 많이 없어서 몇 안 되는 외국 저작들을 읽을 수 밖에 없어서 말콤이 인기인 것 같기도 하다.
투덜투덜 대도 말콤이 신작을 내면 또 샘플북을 보다가 바로 구매해서 쭉 이어서 읽어버릴 것이라는 걸 안다. 그래도 늘 말콤의 미로에 들어가 그가 말하는 진짜같은 궤변, 궤변같은 진짜에 솔깃하다가 다 읽고나서는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그래서 말콤의 작품을 읽으면 아. 개운하다. 이래서 이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쳇. '하는 찝찝함이 남고 한바탕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혹자는 그의 작품을 'brimming with new theories on the science of manipulation'이라고 했나보다. 그렇다. manipulation 바로 그 느낌이다. 또 그런데 이 느낌 때문에 욕하면서도 읽는 것 같기도 하다. 안 읽고 욕하는 것보다는 읽고 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논픽션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픽션의 세계로 몸을 빠뜨릴 시기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스릴러 작가의 신간이 두 권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읽을 책은 많고 시간은 늘 모자라고 체력은 쉽게 고갈된다. 그래도 책 속의 바다에 있는 것이 좋다.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