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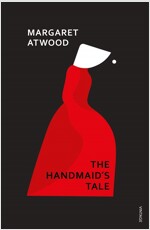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이야기(The handmaid's tale)'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것도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내용을 담고 있는 디스토피안 소설이다. 폭발적인 지구촌의 인구 증가가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 여성이 늘어날수록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골치아픈 일임은 각 나라가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 정책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대세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Happy singlehood)'의 비혼이나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Double Income No Kid-DINK)- 딩크족이다.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는 오지랖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매우 궁금했다. 거의 이들은 내 눈에 전사로 비쳤다. 그 많은 오지랖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물리치고 사나 싶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녀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에서 아이 낳고 싶은 날이 올까?'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 북유럽 어딘가에 정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고도 몽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말그대로 그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지만 서구 국가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들의 기막히고도 교묘한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발언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그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을 철저히 차별하거나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은 보장하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다. 또 미국은 출산에 그리 좋지 않은 한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예를 들어, 미국은(물론 이 책에서 미국을 출산에 이상적인 국가로 보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출산율이 줄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알고 보면 대부분 이민자들의 다출산 덕분이다.) 출산휴가를 주는 곳이 거의 없어 아이를 낳자마자 업무에 복귀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영아를 마음놓고 맡길 수는 있지만 보육 비용이 어마어마하고(물론 소득수준에 비례하지만 극빈층이 아니면 아주 비싸다. 평균 1500불 정도), 고군분투 키워서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보내놓아도 학부모의 참여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비정기적으로 학교문을 닫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히나 눈이 많이 오면 학교 문을 늦게 열거나 아예 닫아버려 미리 도우미를 구해놓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물론 스노우 데이에 아이들을 봐주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하루에 백불 정도. 경단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고장난 기차-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를 타고 계속 달려야 하는데 거기에 적자까지 난다면 과연 이 불완전한 운행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기 쉽다. ). 게다가 여름방학은 3개월이 넘고.
이래저래 작금의 사정을 훑어보면 우리의 미래는 '시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상황으로 치달아 갈지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는, 아무리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엄마와 아이를 돕는다해도, "비출산"이 답이고, 거칠게 말해서 비출산을 선택할 거라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라는 질문보다는 '언제 결혼할래, 결혼은 왜 안 하니?'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비혼을 선택할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인생 궤도를 수정당해도 좋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기에 . 어쩌면 비혼의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멸망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읽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는 부제 'The Rising Acceptance and Celebration of Solo Living'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비혼이 대세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자는 이야기인데 가장 통쾌했던 점은 아이를 안 낳으면 말년에 외롭다느니, 아이가 있어야 결혼생활이 오래 간다느니 하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통계 결과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쉬웠던 대목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얼마나 비혼자들이 여러 언어폭력에 시달리는지를 낱낱이 드러낼 때 그 어조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해 비혼주의자들의 넋두리처럼 들려 끝까지 읽어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비혼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지수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결혼할 때 아무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아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간은 이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결혼을 감행하기 때문이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하지만 비혼 유지보다 결혼 후 이혼의 후유증이 훨씬 크고 일생일대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각종 통계 수치를 볼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연애도 섹스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데 그들이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앞으로는 젊은 남녀 모두 애완동물이나 키우며 비혼생활을 하게 된다는데 어쩌면 그러한 삶이 가장 실패(?)의 위험이 적은 안온한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결혼/출산과 딩크와 비혼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 된다는 것은 여성들이 이제서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반증이라는 면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덧

픽션이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너무 리얼한 소설. 너무 빡빡하게 읽었으니 소설 좀 가볍게 읽어 볼까 하는 마음에 읽었지만..너무나 뼈있는 소설. 점점 영악해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예쁘다. 아름다운 시도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차마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한없이 공감하게 되는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82년생 김지영의 진보된 영 버전이랄까. 역사는 진보한다. 여성 인권의 역사도 진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