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끄럽지 않은 밥상 - 농부 시인의 흙냄새 물씬 나는 정직한 인생 이야기
서정홍 지음 / 우리교육 / 2010년 12월
평점 :




흙냄새 나는 길들이 어느새 새까만 아스팔트로 변했다. 돌담길이 어디에 있었던지, 내가 사는 지역엔 돌과 흙으로 만들어낸 돌담길도 없다. 그래서 돌담 사이에 풀한포기 자라는 것도 못봤다. 언젠가 시골에 갔을 때 기왓집이면서 대문없는 담벼락에 왠 풀한포기가 나 있는 걸 봤을때가 생각난다. 그땐 그 모습을 보면서 풀이 참 아무데나 잘 자란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런 광경이 희귀해져 버렸으니..... 도시 속에서 빙글빙글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중에서 고층건물로 가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들은 시골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내 몸이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발걸음을 떼어내면 흙을, 푸른 산을 찾는다. 우리는 흙에서 났다. 흙이 주는 양분을 먹고 자라고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살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아 책으로 엮어도 63빌딩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처럼 복잡하다면 최고로 복잡할텐데, 흙에서 나 흙으로 돌아가다니..... 이 단순한 원리를 알면서도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도데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성공, 명예를 위해? 아니면 우리 가족의 건강?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 행복을 쫓는 방정식은 없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기 농부시인 서정홍이 이야기하는 <부끄럽지 않은 밥상>속에서 소박하면서도 진실된 행복을 볼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로또처럼 당첨되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로또를 구매하면 된다. 아니면 행복이 지구 반대편 어느 박물관에 있는 것이라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보면 웃는 일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다. 결국 행복이라는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쉽고, 간단하다는 것.

농부시인이 무슨 말이지? 의야했다. 농부면 농부고 시인이면 시인이지 농부 시인은 뭔지..... 시인도 농부와 도시인 따로 있나? 곧이어 나는 책을 바삐 읽어 나갔다. 시인 서정홍은 사람은 모름지기 자연 속에서 자연을 따라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란 걸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농부가 되었다고 한다.
자연이 없는 교육은 죽음의 교육이고, 자연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는 1996년 1월 ’생명공동체운동’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말살리기운동’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함께 하면서 ’경남생태귀농학교’를 만들었다. 2005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황매산 기슭 작은 산골 마을에 작은 흙집을 짓는다. 적은 돈으로 집을 짓는다는게 쉽지 않았겠지만 아니, 집을 가진다는게 사치스러울 수도 있겠다 고민했지만 집한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흙집을 정성스럽게 지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먹거리를 도와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받아 지은 흙집. 그는 집을 짓고보니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크고 작은 돌과 흙으로 담을 쌓은 그의 집을 보고 있자니, 소박한 삶이라지만 왠지모르게 부럽다는 생각도 든다.

시를 쓰지 않는 시인이란 소단락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농사지으며 ’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때부터 시를 쓴다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누가 시인이라고 불러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십 년 남짓 세상이 어쩌니 양심이 어쩌니 하면서 시를 쓰며 살았는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가고 아이들은 한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P. 49)
농사지으며 눈도 귀도 없는 지렁이가 땅을 일구고, 물과 거름만 주었을 뿐인데 주인에게 커다란 결실을 주는 고추들. 심어 놓으면 저절로 쑥쑥 자라는 해바라기 같은 옥수수들은 어느새 영글어 알알이 노란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옥수수가 자기 옆의 고추밭의 고춧대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모습을 바라보니 감동적이였나보다. 나도, 베란다에 채소를 키워보니 초보라도 너무 어설픈 내 손길에도 불구하고 주먹만한 피망을 선사하는 녀석들에게 감사했으며 감격했었다. 그래서 나는 농사가 제격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말하곤 한다. 농작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사람보다 더 존경스러운 것이 농작물일 수도 있다는 과한 생각도 해본다.

저자가 어느날,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여성들 앞에서 무엇이 소중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페이지에서 나는 말을 잃었다.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돈과 지금의 남편과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고 많은 사람들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웃지 못했다. 돈에 노예라는 말. 어질고 착한 남자보단 능력있는 남자. 돈이 더 좋다는 것이 안타까운건 나 역시 마찬가지다. 돈에 연연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해 봐도, 결국 마트에서 좀 더 싸면서 좋은 물건을 고르고 조금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울컥 화가 오르니까 말이다. 무엇보다 착한 사람을 만나야 잘 산다는 어른의 충고에 선뜻 착하고 성실한 농촌 총각에게 시집 갈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농촌이 사라지면 우리의 먹거리가 당장 어려울텐데.... 공급자가 없는데 수요자만 늘어난다. 저자의 <부끄럽지 않은 밥상>을 읽으면 농촌의 어려운 삶이 다 보인다. 그러면서도 저자의 귀농에 대한 강의는 읽는 내내 감동적이니..... 귀농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십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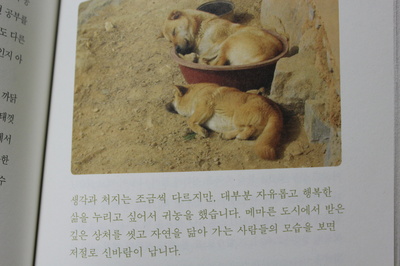
"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의사 천명이 나오는게 좋습니까? 농약 안 치고 농사짓는 농부 한명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판검사 천 명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
농부 시인 서정홍이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다. 어떤가? 당신들의 생각은?
머리로 하는 말과 가슴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것을 느끼는가....... 의사와 판검사가 좋지만, 가슴으로는 정직한 농부와 착한 사람이 더 좋은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정의와 진리가 머리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날,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록 우리의 세상은 아름다워 질 것 같다. 서정홍이 말하는 올곧고 약간 고지식하지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야기 한번 들어봄이 어떨지..... 읽고 나면 자기력 강한 도시 굴레에서 튕겨나갈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보고 싶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