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게 없는 미홍의 밝음 - 2017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안지숙 지음 / 산지니 / 2016년 12월
평점 : 


‘비정규직 독신 중년 여성들의 길 찾기.’
뒷 표지 소개 글이 내 관심을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던 안지숙 소설집, <내게 없는 미홍의 밝음>을 보았다.
‘독신 중년 여성들’은 무조건 당기는 힘. ‘독신’ ‘중년’ ‘여성’ 가운데 나는 ‘독신’말고 두 가지나 포함되니까. (사십 초반, 중년이 맞긴 한 걸까?) ‘비정규직’은 밀어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당기는 힘.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서러운 낱말인지라. (어쩌다 한 번 일이 생기는 귀촌 프리랜서는 비정규직 축에도 못 들지만.)

책을 다 읽고 보니, 나를 밀기도 당기기도 했던 낱말들, ‘비정규직, 독신, 중년, 여성’이 천천히 서로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섞인다. 누군가에게는 있을 법한, 또 누군가에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속으로 숨어 있기 더 쉬운, ‘평범하고도 평범치 않은’ 우리네 여성들의 삶, 사랑 그리고 아픔.
일곱 개 소설 차근차근 읽어 내고, 마지막에 나오는 ‘바리의 세월’까지 읽고 나니 마음이 답답하고도 뜨끈 애잔하다. 책 끝에 나오는 ‘작가의 말’까지 마저 보니 이 소설집이, 또 많은 소설들이 가진, 내게 없는 그 ‘밝음’과 ‘힘’이 무언지 조금 알 듯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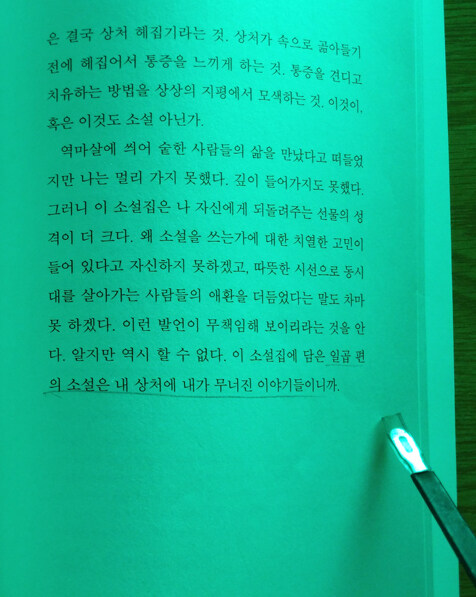
내게 없는 소설의 그 ‘힘’이란, 작가의 말을 대폭 베껴서 써 보자면……. (작가의 말이 꼭 내 마음 같아서, 그런데 작가의 말보다 더 생생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작가의 말을 아주 제대로 빌려 본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도 되고, 남의 상처가 헤집어진 이야기들 속에 어설픈 감정이입으로 빠져들며 통증도 같이 느껴 보고, 그러면서 내 이 상처란 놈은 곪을 건덕지도 없는, 밴드 몇 번 붙이고 말면 될 걸 째고 꼬매는 대형 수술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엄살 잔뜩 부린 나약함의 표시였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내 빈약한 상처에서 비롯된 통증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없던 철도 조금이나마 들게 되었다.’
백수에 준하는 중년 여성인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소설이 가진 ‘힘’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알량하게 살아온 여자의 자학개그
“하나같이 알량하게 살아온 여자의 자학개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글쓴이가 작가의 말에 남긴 저 글귀. 겸손함보다는 진실함이 느껴져서 좋다. 이 소설이 자학개그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도 아지매개그에 불과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허나 인생은 개그가 아니다. 이 책이 들려주듯 철저하게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네 삶 아니겠나.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는.)
글쓴이 스스로 ‘내 상처에 내가 무너진 이야기들’을 담았다는 이 책.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모퉁이에서 잔뜩 지쳐 사는 여성들의 삶은 덤덤하게 어둡다. 때론 칙칙하게 어둡다. 그러다가는 사무치게도 어둡다. 내가 미처 겪지 못한, 알지 못했던 ‘어두움’들이 많다. 내게 없는 이 소설의 어두움은, 나를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도록 이끄는 불빛 같은 어둠이다.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을 터. 어둠은 밝음을 있게 하는, 밝음을 비추는 불빛이나 마찬가지겠지. 특히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소설에서는.
‘체험은 작가의 밑천이고 맷집이다. 체험은 경험보다 몇 수 위이며 맷집은 현실과 소설을 버티는 힘이다.’
조갑상 소설가가 이 책에 남긴 헌사 가운데 한 구절. 맷집이라. 현실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맷집이 필요한 거였구나. 작가의 경험과 체험이 얽히고설킨 맷집으로 아로새겨진 소설. 그 소설을 읽는 행위는 경험일까, 체험일까.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눈으로 글자를 읽고, 글자 속 이면을 마음에 새기는 책 읽기. 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행위이니 소설을 읽는 것도 ‘체험’이라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소설을 읽는 것도 나약하고 엄살투성이인 내 현실을 버텨낼 맷집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으려나?

엄살투성이 현실을 버티게 해 주는 ‘맷집’
생각해 보니 삼십대까지는 소설이 없어도 살만 했다. 버틸 필요 같은 것도 없었다. 아픈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이 그보다 더 많아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밝았다. 더구나 십오 년 가까이 나는 정규직이었다. 소설을 펼쳐들 시간도, 소설이 필요한 시간도 없이 그저 잘 살아왔다.
사십대 초반, 그러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십대 안팎’이라고 말하는 그 ‘중년’이 된 지금, 행복한 일보다 아픈 일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말로는커녕 글로도 남기기 힘든,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들…….) 하물며 지금은 별 계획 없이 산골로 귀촌한 백수 아지매. 나이만 먹었지 실수는 그대로, 어쩌면 더 많아지기만 하는데 세상은 중년 여성인 나를 예전처럼 곱게 봐주지만은 않는다. 버텨낼 힘이 필요해졌다. ‘소설 체험’에 기대서라도 맷집을 키우는 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 <내게 없는 미홍의 밝음> 덕분에 그 맷집의 한 켜가 얕게나마 보태진 듯하다. 그게 참 고맙다. 소설에, 그리고 소설가에게.
책날개에 박힌 작가 소개 글, 뒤표지 추천하는 글을 두루 보니 오십대 중반에 쓴 이 책이 작가의 첫 소설집이란다. 대박! 이 책이 처음이면 오십년 넘는 인생살이의 맷집을 맛볼 기회가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내게 없는 소설의 ‘밝음’, 그리고 ‘힘’을 제대로 느끼게 해 준 안지숙 작가. 오랜 시간 그이의 몸과 마음에 새겨두었을 그 체험의 맷집을 새로운 이야기로 또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한 켜 한 켜 쌓아 보고 싶다. ‘소설 체험’만이 안겨줄 수 있는 바로 그 ‘맷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