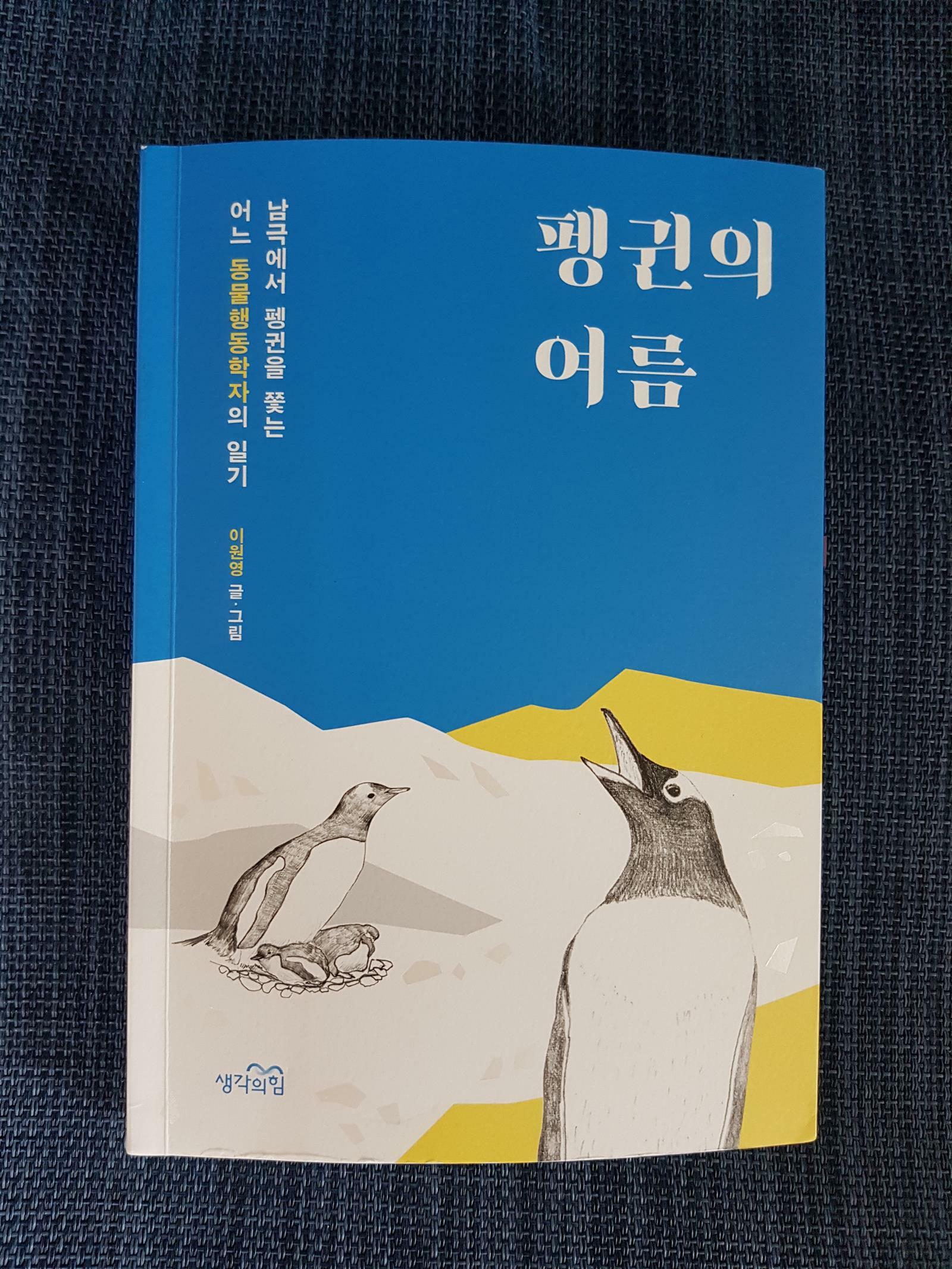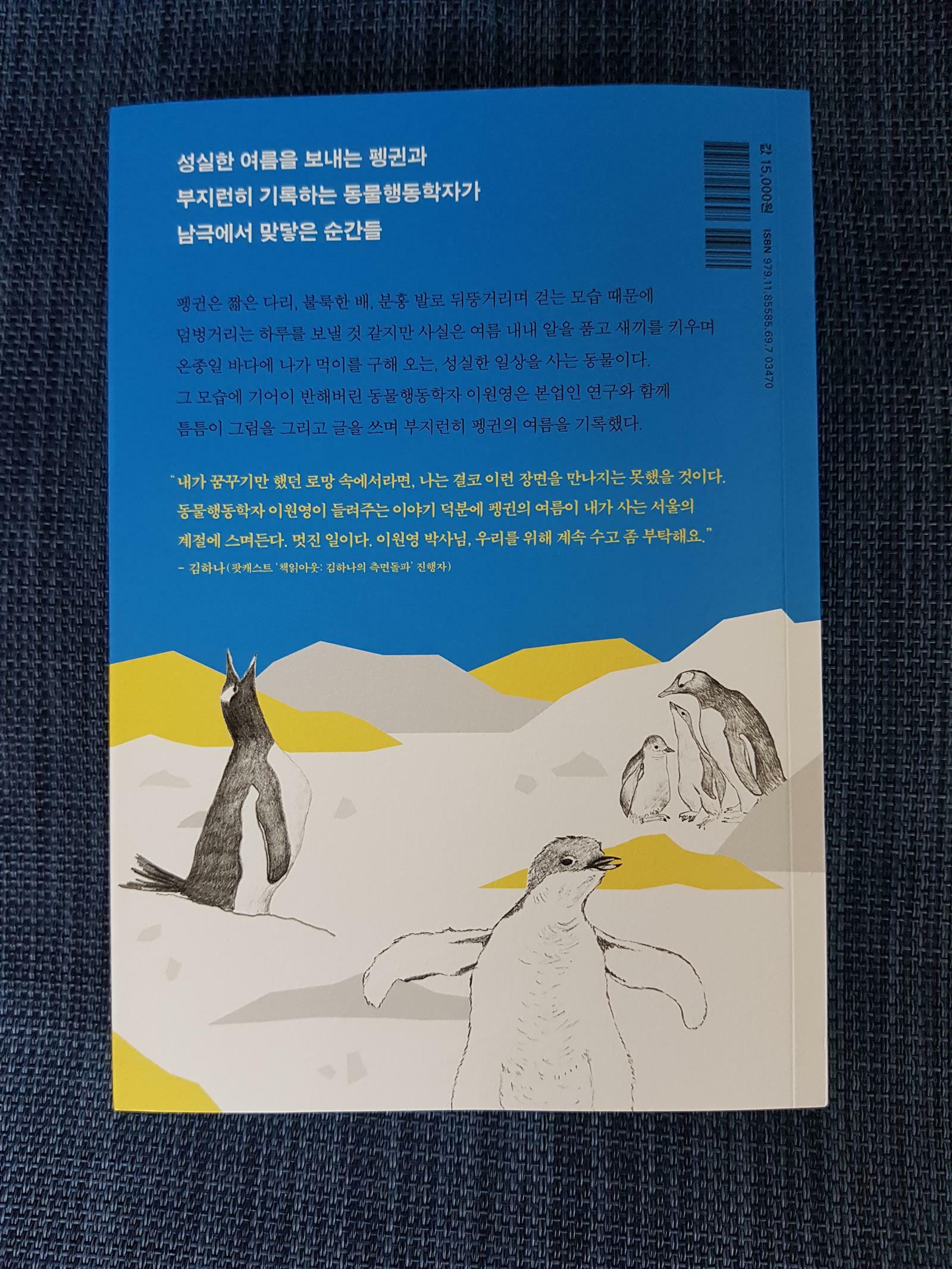-

-
펭귄의 여름 - 남극에서 펭귄을 쫓는 어느 동물행동학자의 일기
이원영 지음 / 생각의힘 / 2019년 6월
평점 :



남극에서 펭귄을 쫒는 어느 동물행동학자의 일기
성실한 여름을 보내는 펭귄과 부지런히 기록하는 동물행동학자가 남극에서 맞닿은 순간들
우리는 결국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남극에서 지낸 하루하루를 기록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펭귄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관찰일기이기도 하다. 펭귄이 알을 깨고 나와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싶었다."
저자는 극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동물행동학자이다. 여름엔 북극, 겨울엔 남극을 오가며 펭귄을 비롯한 동물의 행동 생태를 연구한다. 한국에선 한겨울인 12월,1월이 남극에선 여름이다. 지금 여름인 한국에서 남극의 얼음대륙을 생각하며 읽다보면 조금은 시원해진 기분도 들고, 애정어린 눈길로 펭귄을 관찰한 저자의 글들을 읽다보면 마음이 따듯해지기도 한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극지방 남극, 한여름의 최고기온이래야 영상 2도 안팎인 영하의 땅, 그곳에 세종기지가 있고 펭귄마을이 있다. 펭귄과 함께 보낸 43일의 기록은 짧다면 짧을수도 있지만 펭귄이 알에서 깨어나 둥지를 나오고 성채로 자라기까지 충분한 시간이라고 한다. 남극의 여름이라고 해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수시로 '블리자드' 라고 불리는 강한 눈보라가 분다고 한다. 12시간의 시차가 있는 남극에서 인터넷도 끊기고 핸드폰도 안터지는 곳에서 오롯이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은 우리가 수시로 흘려보내는 일상의 시간들보다 몇갑절 길게 느껴질까 몇갑절 짧게 느껴질까...
창문 밖으로 펭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라면을 먹었다. 대피소 안에서도 펭귄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풍경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텔레비전으로 펭귄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매년 남극에서 펭귄을 보는 저자도 창문밖 펭귄이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라면 길건 짧건 꿈같은 시간이 아닐까?ㅎㅎ
동물행동학자인만큼 동물에 대한 기본자세가 남달랐다.
물론 현재 사용하는 장비와 연구 방법은 동물 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의 펭귄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백 마리의 펭귄에게 괜찮았어도 1마리의 펭귄에겐 괜찮지 않았을 수 있다. 깃털에 붙은 이물질이 펭귄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연구지만,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동물 윤리의 핵심은 대상 동물의 관점에서 고통을 느끼는지의 여부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만약 고통을 준다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를 위해 작은 기계장치를 조심스럽게 펭귄깃털에 붙이고 나서 돌아오지 않은 한마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저자를 보며 동물학자들이 다 이정도의 마음만 가진다면 참 좋겠다 싶었다. 펭귄마을에 갈때마다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발소리를 죽이고 말소리를 삼가해가며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관찰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펭귄들의 분변을 몸으로 받아내며 애정어린 눈길로 펭귄을 아끼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남극에서 온난화를 목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당혹스럽다. 때로는 무력감도 느낀다. 기후는 실제로 변하고 있고, 남극의 생태계는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매년 빙하가 수십미터씩 줄어들고 있음을 직접 볼 수 있는 연구자이다. 기후변화는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인데,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기후협정을 탈퇴하는 선진국들에 대한 심정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그래도 작은 힘을 모아 일단 뭐라도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도 작은 마음이나마 보태본다.
극지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다보면, 더구나 연구가 마음처럼 잘 안되기라도 하면 더욱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을 때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이 지겹고 괴로울 수도 있을 테지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참고 기다렸을 때에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의미도 있다 는 것또한 배운다. 남극에서. 펭귄들에게서.
저자가 관찰한 펭귄가족이 있었다. 부부사이에 아기펭귄 두마리. 그러던 어느날 아기펭귄이 한마리만 남은 것을 보았다. 원인은 모르지만 죽은 아기펭귄을 보며 저자는 고민한다. 속으로 이름까지 붙여주고 다른 펭귄가족들보다 더 애정을 갖고 관찰하던 아기펭귄이었기때문에 마음은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대로 지나간다.
사체는 결국 도둑갈매기에게 먹히고 있었다. 늘 겪는 일이지만 날카로운 부리에 찢기는 모습은 차마 보기가 힘들다. 내가 개입해도 될까. 구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까? 도둑갈매기를 쫒아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자연은 자연그대로 둘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관찰일기이다 보니 시간순서대로 차분히 아기펭귄의 성장을 지켜보는 느낌이었는데, 번외로 붙여진 이야기들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도 있었다. 펭귄사회에서 동성애 라던가, 4일간 바다에서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 동안 어떻게 잠을 안 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
아기펭귄이 거의 성채크기로 자랐을 때 남극의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펭귄들은 깃갈이를 한다고 한다.
펭귄에게 깃은 일종의 방수복인데 늘 이 방수복을 입은 채로 생활하기 때문에 헤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펭귄은 1년에 한 번씩 깃갈이를 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깃갈이는 보통 2~3주 정도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펭귄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육지게 가만히 서서 깃털이 새로 나기만을 기다린다.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단식에 들어가는 셈이다. 깃갈이를 하는 동안 펭귄은 영양 공급이 끊긴 상태를 참아내며 체내에 축적된 지방과 단백질로 몸 상태를 유지하고 깃털을 만들어야 한다.
어린 펭귄은 깃갈이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부모에게서 먹이를 받아 먹었다. 그래서 부모펭귄은 새끼의 깃갈이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깃갈이를 시작한다. 자식에게 밥을 먹이고 옷도 다 갈아 입힌 뒤에 자기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자연은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알게되도 감동적인 것 같다.
부부펭귄이 번갈아 가며 알을 품느라 선채로 며칠씩 보내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사냥을 다녀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덩치가 부모만큼 커진 새끼의 마지막 옷입기까지 돌봐주고 나서야 펭귄부부의 여름은 끝난다. 이 여름은 매년 오고 펭귄들은 매년 새끼들을 키워낸다. 그런데 빙하가 녹고 먹이가 줄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펭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펭귄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펭귄들이 펭귄들의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때 인간들은 인간들의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가 지구온난화해결이 좀더 속도를 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