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서적 속독하기는 몇해전 한바탕 유행을 탔던 기억이 난다. EBS에서도 한번 다뤘던 거 같다. 네이버 동호회에서 아마 분당천 이란 이름으로 속독강의를 하던 분이 수강생들의 열화와같은 성원에 힘입어 강의내용을 출판하여 거의 대박이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의 책은 <스피드 리딩>이다(2007년 책이니 벌써 5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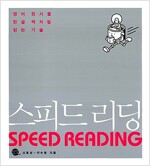
속독에 관련된 여러분야를 속독에 꼭 필요한만큼만 추려서 만들어진 재밌는 책이었다. 독서속도를 올리는 세세한 기술은 넘어가고, 요는 같은 책을 속도를 올려가며 회독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영문책 읽는 속도가 내용이해를 가로막을 만큼 늦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독서속도를 올리는 것이 일반 독자를 위한 스피드 리딩의 목적이다. 우리글로 읽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다양한 일들이 영문 독서에는 방해물로 작용한다.
말이 나온 김에 영문으로 읽든 국문으로 읽든 제대로 된 독서는 어떤 것일까? 독서법 안내책들은 수도없이 많지만 누가 뭐래도 고전은 모티모 애들러의 책이다. 독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독서법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영문책을 이 독서법으로 읽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속독이 애들러의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물론 속독이 취향에 맞다면 분당 천단어 이상을 목표로 추천합니다.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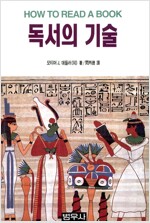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영어 알파벳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뇌 영역과 한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뇌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고나자마자 독서를 할 수 없고, 독서행위는 시각, 청각, 인지를 담당하는 뇌영역간의 협응을 필요로 한다. 매리언 울프 <책 읽는 뇌>에는 특히 한자를 보는 중국인, 한자와 가나를 보는 일본인, 알파벳을 보는 미국인이 독서행위를 할때 뇌를 촬영한 MRI 사진에 사용하는 뇌영역이 다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이를 보면 외국어독서에는 말그대로 새로운 두뇌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