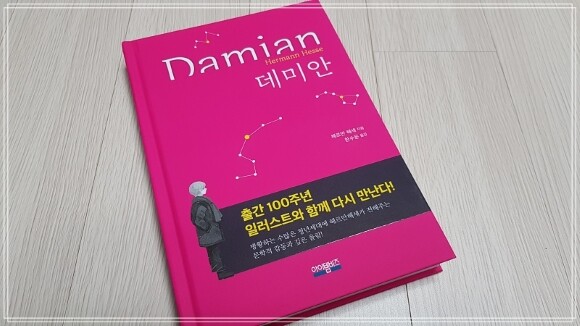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매우 유명한 데미안 속 구절입니다.
얼마전 모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다지요...
듣자마자 아~ 데미안~ 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기에 고민하며 찬찬히 읽어내려갔던 이 책을
어느덧 아이 엄마가 된 나이에 다시 보게 되니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처럼 엄마로부터 분리되며 첫번째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년기에는 따뜻한 부모의 품과 안락한 생활 속에
살게되지요.
하지만 어느덧 성장해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또 다른 알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처음의 알을 깨는 것이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면
두번째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부모 혹은 안락한 세계를 떠나 온전히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성장소설인 데미안...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아닌 데미안이 이 소설의 제목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고뇌하며 찾아가고픈 내면의 소리,
진정한 자아를 표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 속 일러스트입니다.
어려운 단어들과 철학적인 문장들이 난무하는 이 책과는
조금 동덜어진 느낌일 수도 있는 이 일러스트가
득인지 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안되는 이 예쁜 일러스트가 짠~하고 등장할 때마다
한번씩 숨을 고르고 다시 책 속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히려 일러스트보다 더 자주 보는 느낌인
헤르만 헤세의 수채화 작품들...
훌륭한 명화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잔잔한 이 수채화들이 헤르만 헤세에개
힐링이 되었던 이유를 알 것도같습니다.
책 속엔 계속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등장합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선과 악과 같은 두가지 개념...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아프락사스, 선과 악의 공존, 그 두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나 자신을 찾는
것...
어쩌면 데미안은 마지막 말처럼 싱클레어 내면의 이상향 같은
존재이고,
싱클레어가 찾고자 한 진짜 내면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전문학이 클래식이 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에
그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의견 또한 내가 만난 데미안이고,
또 다른 이들에겐 또 다른 데미안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지요.
다시 만난 데미안은 나 자신 뿐 아니라,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아이의 입장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