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인종의 요리책
카를로스 발마세다 지음, 김수진 옮김 / 비채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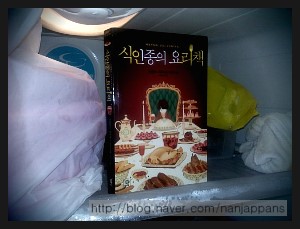
한번씩 책을 보다보면 그 속에 나오는 지명이 무척이나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소한 나라인 경우에는 더욱더 궁금해지죠.. 개인적으로는 남미쪽이 무척이나 생소하면서도 궁금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하면 역시 축구와 후안 페론의 에비타가 생각나는 나라인데 말이죠.. 이때껏 이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쯤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네요.. 잘은 모르지만 수십개국이 땅따먹기식으로 붙어있는 유럽의 나라들은 대강 위치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 몇개 되지도 않은 남반구의 남미지역은 잘 몰랐네요..이번참에 대서양에 접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이고 저번 지진으로 고생이 많았던 칠레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를 파라과이와 브라질등이 위치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이번 작품은 독서의 즐거움보다는 독서로 인해 알게된 남미에 대한 생경한 지식들이 더 즐거웠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짜믄 저 나라를 한번 가볼까라는 끝모를 여행에 대한 욕망이 솟아오르는건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아따 이 작품 한 권 때문에 가당치도 않은 남미여행이라는 목표가 생겨버렸으니 이거 출판사에서 책임지실랑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까요?.. 제목인 "식인종의 요리책"은 아주 자극적 느낌의 감성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식인종이니께요.. 일종의 카니발리즘과 관련된 이야기이겠거니하고 미리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표지이미지의 감성조차도 아주 서늘하거덩요.. 아니나다를까 책을 펼치자마자 네이팜탄같은 폭탄의 위력의 충격적 설정이 이루어져있습니다..아주 충격적이죠.. 밝히지를 못하겠습니다.. 대단한 서막이라고밖에는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마센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건물의 유래에 대한 설명과 이 건물을 만든 이와 이 곳에서 요리를 해왔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왜 서두의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어느시점까지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의 유래와 그 상황이 벌어진 한 배경의 과거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있는거죠..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라는 휴양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검색을 해보시면 여행가고 싶을 마음이 생길만한 지역입니다.. 이 곳에 19세말에 쌍둥이형제가 도착하여 요리사로서 명성을 쌓고 유명한 식당을 열게 됩니다 그 곳이 바로 알마센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알마센식당속의 인물들과 요리들과 아르헨티나의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롬브로소라는 성을 가진 요리사들의 대를 이은 비극과 아픔과 요리적 천재성과 상황을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그러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다시 서두의 충격적 사건과 맞이하게 되는거죠.. 중간부분의 맛난 요리적 설명과 아르헨티나의 알마센에 정착하는 이탈리아인들의 이주나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지리한 상황들을 그럭저럭 잘 넘기신다면 읽을만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식인종의 요리책"이라는 제목에서 주는 장르적 즐거움의 예상은 처음 폭탄을 터트리고 시작하면서 기대의 극대치를 보여주더군요.. 하지만 연이어 이루어지는 유래와 과거의 상황 설명은 가면 갈수록 저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더 이어질수록 뭥미?에서 도대체?로 바뀌게 되고 후반부에 도달하기전에 접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주실려고 노력을 하시더군요.. 굳이 알마센을 세우고 이어오신 수많은 위인들(?)까지 들먹여가면서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으셔도 독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만큼의 독서력은 되지싶은데 작가님께서 그걸 잘 모르셨거나 굳이 작가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역사관에 대한 멋모르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더많으셨거나 또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시거나 아님 작품속에 써먹으려고 수집한 자료들을 그냥 내버리기 아까우셔서 군데군데 넣어주시는 센스까지 발휘해 주신거죠.. 근데 그 맛이 별로더군요.. 너무 등장인물이 많았구요.. 하물며 그 인물들의 이동경로까지 설명할 정도로 그 인물들이 이 소설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어 보였구요.. 뭐 역할이 있었다치더라도 굳이 역사의 흐름속에 금방 사라지실 분들의 생애를 하나하나 설명들을만큼 참을성이 또 많은 것도 아니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님께서 말하고 싶은 주제나 의도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는데 그걸 중구난방식으로 나열해놓은 느낌이 많았다는거죠.. 뭔가 좀 더 철학적인 카니발리즘이 있을까 싶어 고민까지 해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못느끼겠구요.. 세계문학인데다가 그래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도착한 생경한 문학이기에 뭔가 다를것이라 느꼈는데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장르소설도 아니고 순문학도 아니여..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카를로스 발마세다라는 작가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두 번 읽을것 같지는 않구요 제목이 주는 장르적 감성만 보고 책을 택하시면 사기라고 외칠 수도 있을겁니다..하지만 분명 초반과 후반의 느낌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초중반의 흐름이 문제였다는거지요.. 대중소설적 재미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설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리의 유래와 남미적 감성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이 책이 주는 재미보다 이 책으로 인해 찾아본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훨씬 좋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