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죽음본능
제드 러벤펠드 지음, 박현주 옮김 / 현대문학 / 2011년 6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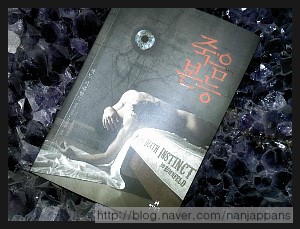
요즘처럼 이런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면 마음도 축 쳐져버리고 하는 일들도 제대로 되질 않죠.. 전 그러네요.. 뭐랄까요, 비가 와서 날씨는 서늘한데 조금만 움직여도 후덥지근한 열기가 습기와 함께 와닿는 그 찝찝함이 자꾸 뭘 할려고 할때마다 부셔버리고 싶은 욕망이 불끈합니다.. 하는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후욱하니 밀려 들어와 파괴해버리고 싶은 마음 있잖습니까?..어제는 그게 좀 많이 심하더군요.. 밤 늦게 컴퓨터로 서평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자꾸만 꺼져버리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습기와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쌍둥이들이 건드려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참기가 어렵더군요.. 결국 발로 차버린 컴퓨터 본체에 분명 문제가발생했지 싶네요.. 뭔 말을 하는거냐구요?.. 인간의 파괴적 본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과한 압박적 감성이 몰아닥치면 인간은 그것을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위의 것들을 파괴하고자하는 본능에 눈을 돌리게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인간의 역사속에 가장 중심적 근간이 되었던게 이 파괴적 본능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너무 과하게 오바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일개 개인의 이런 작은 적대적 반응들이 모여서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몰락시키면서 일종의 위안과 쾌락을 맛보질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번 맛보게 된 이런 본능적 카타르시스는 인간의 본능적 경험으로 축적되어 선과 악의 축으로 대변되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사랑과 전쟁".. 사실 짜증날때 샌드백이라도 실컷 두드리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샌드백이 회사 사장이라는 최면을 걸면 더 신나지요..
"죽음본능"이라는 제목으로 볼때 뭔가 심리학적 미스터리의 악의적 범죄를 다룬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미리짐작으로 책을 펼쳤지만 시작은 액션 스릴러의 느낌이더군요.. 폭탄이 월스트리트의 J.P모건 건물에서 터져버리니까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하드 뚜리에서처럼 말이죠.. 그자리에서 테러를 목격했던 세 사람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경찰과 의사와 학자입니다..리틀모어와 영거와 콜레트라는 이름을 가진.. 일단 이야기는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리틀모어라는 형사가 담당하는 테러 사건과 콜레트의 납치사건과 함께 영거와 콜레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는거죠..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사건은 일단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두 방향의 사건의 구성이 동떨어진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가는거죠...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리틀모어는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나갑니다.. 이게 아주 거대한 정치적 음모로 이어져 나가는군요... 1920년의 24시를 보는 듯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거와 콜레트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이야기하려는 중심주제와 맞닿아는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말이죠..프로이트와 마리 퀴리부인이 나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라듐이라는 소재가 등장(미래에 방사능이 어떤 파괴적 행위를 하게되는지는 아시죠?)하고 프로이트는 콜레트의 동생인 뤽의 실어증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전체적 주제와 관련된 정신 분석학중에서 "죽음 본능"이라는 새로운 명제가 등장하게 되니 말이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볼때 사분오열된 이런 내용적 어지러움이 따로국밥처럼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가님의 전작인 "살인의 해석"이 로또 맞아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겠습니까?..
상당히 두꺼운 분량이고 어떻게 보면 읽기에 버거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만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심리적 미스터리치고는 긴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20세기 초의 미국과 유럽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정치음모전쟁첩보액션심리미스터리스릴러(?)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건의 내용들도 스릴러적 감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아주 높죠.. 일단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폭탄이 꽝!하고 터져주니까요.. 9월의 테러가 1919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 테러와 연관된 정치적 음모를 중심으로 주인공들의 개인적 사건이 시계 태엽속의 연동장치처럼 맞물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허구를 덧붙여 만들어진 팩션인거죠.. 게다가 중간중간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묘사적 방식과 문장의 재미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트가 영거에게 비엔나로 가야하는 이유와 구구절절한 부탁을 하는 편지에서 영거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싫어" 이런 영거와 콜레트의 심리적 묘사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물론 리틀모어가 펼쳐 나가는 진정한 경찰의 모습과 법질서를 중시하는 바른 뉴욕아저씨의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습니다.. 영거라는 주인공은 작가의 전작인 "살인의 해석"에서 프로이트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리즈이군요.. 아직 읽어보질 못해서 궁금합니다만 이 작품속의 영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나옵니다.. 일종의 시니컬한 영웅인거죠.. 진짜 남자라는게 이런건가라꼬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똑똑하고 쌈잘하고 돈 잘쓰고 배려 깊고 게다가 영웅호걸의 모습까지.. 다 갖췄습니다.. 리틀모어도 빼놓을수는 없죠.. 둘 다 영웅적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 모습은 읽어보시면 아실겝니다.
많은 내용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결국은 한데 묶는 구성은 아주 좋습니다.. 소설적 집중도를 높여줄수도 있고 내용을 계속 상기시켜주니까요..하지만 너무 반복적인 구성의 묘미를 살려가다보면 중심적 내용의 인지가 흐트러질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장면 그 상황에 집중하다보면 이 작품이 뭔 야그를 할려고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쉽게 말해서 테러로 폭탄이 미국의 중심부에서 터졌는데 또 한 편으로는 납치사건이 발생하고 또 그들의 과거의 전쟁상황과 개인적 생활에서의 미스터리가 번갈아 나온다면 읽는 동안(물론 마지막은 뭉쳐지겠지만) 이 소설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책이 길거덩요..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뭐 국내 장르소설 독자님들은 워낙 똑똑하히고 연상작용이 뛰어난 인지력을 가지고 계셔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는거니까요..
제드 러벤펠드 작가의 전작인 "살인의 해석"을 아직 읽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작품만으로 볼때는 재미있는거 같습니다.. 역사적 팩션의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시켜주시는 듯 하구요.. 미국적 영웅의 모습도 뭐 흔히 봐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여울 정도입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면 아니 지금도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만.. 이럴때 자신의 파괴적 본능을 딴곳에 풀지 마시고 소설속 문장을 잘근잘근 씹어서 뜯어서 찢어서 머리속에서 맛보시면 즐거운 그리고 션한 여름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