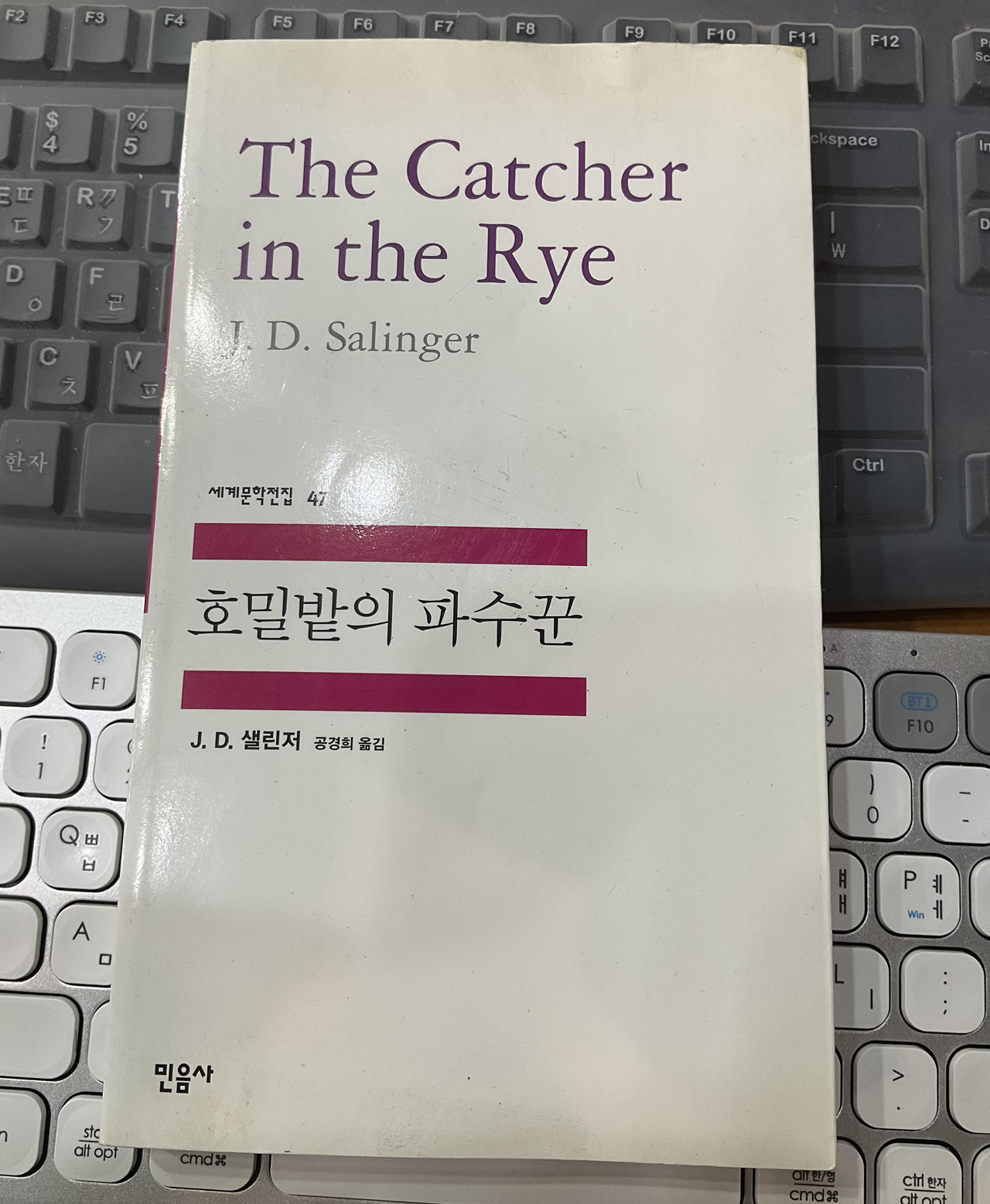
하루키는 에세이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에세이에도 말하지만(맨 밑의 사진) 호밀밭의 파수꾼은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앨범과 맞먹을 정도로 무지하게 팔렸다.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는 이유는 아직 아이 같은 마음이 강하게 남은 사람들이 많아서일지도 모른다. 홀든 녀석의 욕설을 듣고 있으면 그 녀석의 행동에 이입이 되어 버리고 마는 마법에 빠져든다.
샐린저는 이 소설을 적을 때 마치 정신이 나간 놈처럼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군인으로 2차 대전에도 참전했는데 막사가 폭격을 맞아서 허물어지는데도 책상 밑에서 타자기로 홀든 녀석의 이야기를 적고 있었다.
이 같은 샐린저의 일대기는 니콜라스 홀트가 샐린저로 분한 영화 ‘호밀밭의 반항아’를 보면 잘 나온다. 무척 재미있다. 샐린저가 왜 홀든 콜필드 녀석의 이야기에 빠져 드는지, 어째서 샐린저는 그 고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걸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아주 잘했다. 영화는 실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되었다.



"제리, 거절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쓰고 또 거절을 당하고 그다음 또 다른 거, 거절, 또 다른 거, 안타깝게도,라는 거절의 편지. 샐린저는 출판을 하고 싶지만 출판사에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고 교수(캐빈 스페이시)는 왜 글이 쓰고 싶냐고 묻는다. 제리는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글을 쓰면 그것이 풀린다고 한다. 그리고 교수는 그걸 글에 녹아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평생 출판을 못 할 수도 있다.
영원히 출판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물어봐,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평생을 글 쓰는 데에 바칠 수 있느냐,
아니다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먹고 살 딴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왜냐면 진정한 작가가 아니니까
샐린저는 전쟁에 차출되어 나가게 되어서도 홀든을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홀든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었다, 글 쓸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다, 마음은 계속 이야기를 써 나간다는 점이다, 손에 펜이 들렸던 총이 들렸던 창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샐린저는 장편을 쓰기 위해 막사에서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홀든을 썼다.
샐린저는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거기서 포탄으로 전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다.
제리 제발 날 죽여줘, 샐린저는 그 악몽 같은 시간을 홀든을 생각하며 보낸다.
‘계속 쓰기 위해 별짓을 다했다. 정말이다. 펜도 타자기도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홀든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비록 혼잣말이라도’
추위에 양말을 챙겨주던 친구는 동사하고 샐린저는 점점 홀든과 자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홀든 콜필드는 반 정도 쓰고 못 쓰게 된다.
제대를 한 후 교수를 만나서 이제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되살려서요.
이미 샐린저는 홀든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한 사람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
유대인의 학살
나치를 잡는 순간
고문
다리가 잘린 전우
얼어 죽은 친구
무엇보다 실수로 그 지점에 늦게 도착하여 혼자만 살아난 샐린저.
영화는 제리가 호밀밭의 파수꾼, 홀든 콜필드의 이야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비화와 홀든 콜필드의 출간 이후 샐린저가 겪은 변화를 보여준다. 재미있다. 여담이지만 니콜라스 홀트는 또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 톨킨의 학창 시절의 이야기도 주연을 맡아서 했다. 뭔가 작가들의 내면을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를 잘하는 모양이다. 이 영화보다는 샐린저를 연기한 호밀밭의 반항아가 더 좋았다 개인적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은 존 레논을 죽인 마크의 손에도 들려 있었고,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의 ‘컨스피러시’에서 멜 깁슨의 집 책장에는 호밀밭의 파수꾼만 가득 꽂혀 있다. 이 영화는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영화학도들은 반드시 보고 연구를 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것에 샐린저의 이 소설이 있다.
하루키의 이 에세이의 이 부분은(밑의 사진) 영어의 번역이나 해석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책에도 나오지만 소설 속에는 270개의 ‘제기랄’과 58개의 ‘사생아’가 나오지만 ‘성교’나 ‘똥’은 0개로 나와있다고 하는데, 에세이에서도 말하지만 샐린저의 이 소설은 50년대에 가장 ‘지저분한 문체’를 이유로 박해당한 걸 보면 순 개 뻥 같은 이야기다.
요컨대 비틀스의 ‘노르지안느 우드’는 영국에서는 노르웨이산 가구라고 받아들이지만 미국에서는 노르웨이 숲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은 그저 하루키의 소설쯤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욕이 난무한다고 해서 저질이나 저급은 아니다. 욕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봤다. 어쨌거나 한국에서만 제목을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불리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제목이 다 다르다.
이탈리아: 한 남자의 인생
일본: 인생의 위험한 순간들
노르웨이: 모두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악마는 최후 순간을 취한다
스웨덴: 기억의 순간에 나타나는 구원자
덴마트: 추방당한 젊은이
독일: 호밀밭의 남자
네덜란드: 사춘기
사람들과 제목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며 이야기를 해도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소설 속에는 12월을 마녀의 젖꼭지처럼 춥다고 할 정도로 멋지고 좋은 문장이 많은데 나는 이 문장이 참 좋았다. 그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든다.
난 하품했다.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멈추질 않는다.
이 방이 지나치게 따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졸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루키는 이 소설을 번역하여 일본에 출판하면서 “꽤나 이상한 소설이에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했다.

하루키의 에세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