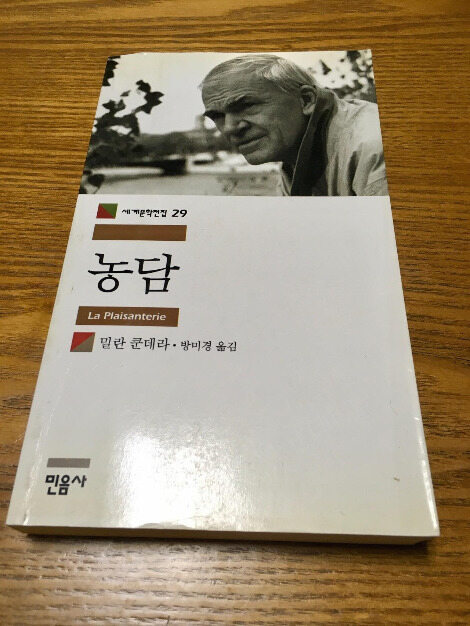
2016년 보브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탔다. 하루키는 그때에도 노벨문학상에 거론이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년 노벨문학상에 거론되는 한국문인 중에 고은 시인이 있었다. 한국시는 외국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한다. 노벨문학상은 노벨상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보브 딜런 이전에도 문학 이외의 주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경우가 일곱 명이나 있었다. 그중에는 윈스턴 처칠도 있었는데 회고록으로 문학상을 받았다. 자신도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전해진다. 또 대부분의 철학가들이 철학서적을 통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사르트르가 노벨문학상을 거절하면서 그 뒤로는 묘하게도 아직 철학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한림원에서 흥! 하며 철학가들에게 벽을 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한국의 시는 한국(만)의 정서를 가득 담고 있어서 외국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동주의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은 터무니없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아니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때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를 (상을 받기 전에)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영미문학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한강의 독특하고 돌을 삼키고 걸음을 걷는듯한 그 문체를 어떻게 영어로 가능한 것인가. 게다가 번역을 했던 데버라 스미스는 한국말은 거의 하지도 못 했다. 하지만 영어로 번역이 가능했다. 언어가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을 번역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하지만 해냈다.
하루키의 결락이 가득한 문체는 영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로, 체코어로, 덴마크어로 번역이 되어 나가고 있다. 당연하지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루키 문학이 한국으로는 늦게 들어왔다. 이미 전 세계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하루키의 문학으로 머릿속에 맛있는 밥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 세계는 의역의 시대다. 정서를 운운하지만 결국에는 상을 받을 시기가 되면 관계자들은 읍소와 약간의 강압으로 그들에게 어필하지만 문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펜의 끝을 통해 사람을 그려내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는 몹시 고통스러운 흐름과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야기, 상상을 통해 창작된 이야기의 성립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 벽을 허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시는 타국어로 번역이 안 돼, 불가능해, 표현이 아쉬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한국의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시인의 시집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풀이를 하면 자국민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시인의 시를 다른 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여할 만큼 가치를 높여주는가에 접근해봐야 한다.
한림원에서도 보수주의가 가장 강한 분야인 노벨문학상을 보브 딜런에게 수여를 했다. 이미 보브 딜런은 미국인들을 넘어 자유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들어와 있었다. 하루키 역시 자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있다. 물론 우파는 제외하고. 그가 책을 한 권 내면 기본적으로 10만 부가 금방 동나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2015년 한 해 시집은 총 2000권 정도가 나왔고 300권이 팔렸다고 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김영하의 소설도 4만 부가 팔리기 어려운 곳이 우리나라다. 각종 도서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10위 안을 채우는 건 대체로 자기 개발서다. 매년 노벨문학상 시기가 되면 우리는 후보자를 달달 볶는다. 그 시간에 시상을 떠올리고 시를 적게 놔둬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후보자를 고기 볶듯 볶아댄다. 하루키도 마찬가지다. 이제 하루키의 장편을 몇 편이나 읽을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성숙’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김남조 시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나는 노년이 되어서 얼마간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인의 언어가 너무 과장되고 엄살도 많고 색깔을 입힌 게 많아요. 사랑이라는 말도 눈부신 광채일 수는 없다는 걸 알아갑니다. 이번에 이걸(영인문학관 전시회) 준비하느라 오래된 인쇄 글자를 찾아보니 종이라 바스러지고 활자가 뭉개져 있더군요. 종이와 글씨도 늙는다는 것, 결국 소멸에 이른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참 숙연해요. 안 죽어 봤기 때문에 죽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종이의 종말을 보고 내 종말이 현실감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사랑은 눈부신 광채 일 수만은 없다. 뱅크의 노래 '가질 수 없는 너'에서도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라는 가사처럼 사랑의 다른 말은 고통과 아픔이다. 우리는 살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 시인은 종이의 종말에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죽음을 본 것이다. 정말 이런 심안은 시인 만이 가능한 것일까. 시인이 아닌 일반인인 나는 어째서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없을까. 900편의 시를 적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나는 언제 성숙해져 있을까.
김남조 시인의 말을 들으며 성숙의 길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려면 그러한, 최소한 우리나라의 시인이나 소설가를 좋아하고 그들의 글을 탐독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인과 소설가들의 문학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