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자벌레도 아닌데
마른 나뭇잎을 나눠주었다
염소도 아닌데
마른 나뭇잎을 나눠주었다
나뭇잎 두 장을 이어붙인
나뭇잎 접시.
거기 흰 밥을 담아주었다
거기 찐콩을 담아주었다
거기 야채카레를 담아주었다
그걸 숟갈 대신 손으로
비비고 또 비비는데
거기 햇살도 듬뿍 얹어주었다
거기 맑은 공기도 섞어주었다
거기 청량한 새소리도 얹어주었다
나무 그늘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나뭇잎 접시를 다 비웠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설거지꾼들이 나타났다
나뭇잎 접시를 얼른 내주었더니
버석버석 단숨에 먹어치웠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P.16 )
새가 울면 시를 짓지 않는다
벵골 땅에서 만난 늙은 인도 가수가
시타르를 켜며 막 노래 부르려 할 때
창가에 새 한 마리 날아와 울자
가수는 악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저 새가 내 노래의 원조라오.
그리고 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울음을 그치고 날아갈 때까지
노래 부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도
새가 울면
시를 짓지 않는다. (P.29 )
꽃 먹는 소
인도의 소읍. 어느 성인의 탄신을 기리는 축제라던가?
떠들썩 떠들썩한 축제 행렬 막 지나간 길, 꽃으로 가
득한 트럭 위에서 사내들이 던진 꽃들 질펀하게 깔려
있네
흠! 흠!
붐비는 재스민 금잔화 향기 맡고 나타났을까. 난데없
이 어슬렁거리며 등장한 흑소 몇 마리.
더 넓을 수 없는 여물통, 뜨겁게 끓는 아스팔트에 깔
린 꽃들 우적우적 씹고 있네
갈비뼈 아른아른 비쩍 마른 흑소들, 야윈 신들.
꽃으로 주림을 채우고 있네 오. 공양(供養)? 맞네! 저
석조사원의 죽은 신들 보다 죽은 성인들보다
살아 있는 신들을 먹여야 하리
무엇보다 꽃으로 먹여야 하리
꽃으로! (P.30 )
-고진하 詩集, <꽃 먹는 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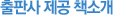
한 잎 고통과 한 잎 황홀이 포개지는 방랑의 문장
자연 사물에 깃들인 신성(神聖)을 탐구하는 시세계를 펼쳐온 고진하 시인의 신작 시집 『꽃 먹는 소』(문예중앙시선 028)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인도 시편’이다. 고진하 시인은 지난 10년이란 세월 동안 매년 인도를 여행하며 길어 올린 “한 잎 고통과 또 한 잎 황홀이 포개지던 방랑의 긴 문장”(「시인의 말」)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냈다. 시인이면서 목사이기도 한 그는 1987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신이 부재한 시대의 신성을 발견”하는 시세계를 펼쳐 보이며 “종교적 사유와 생태적 사유의 결합”(유성호 문학평론가)을 추구해왔다.
이번 시집에서 고진하 시인은 기독교, 불교, 도교 등을 아우르는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과 사물의 내면과 깊이를 흡입하여 형이상학적 사유를 작품 곳곳에 부려놓는다. 인도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이나 체험기가 아닌, ‘인도적인 것’을 넘어선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사유를 ‘인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땡볕”과 “소나기”(「집시의 뜰」) 같은 시간 속, 일상의 견고한 질서에 금이 가버리는 어떤 한순간의 체험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과 어떤 심연을 발견하여, 이를 자각하고 성찰해나간다. 그는 그 방랑의 10년간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아열대의 태양 아래/삶과 죽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던/어느 날의 새벽 강/흐느끼는 강의 눈물샘에/저를 빠뜨린 채 울부짖던 신들린 어린 소리꾼이/왜 그토록 오래 잊히지 않는지//모르겠네!”
―「시인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