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 ㅣ 문지 푸른 문학
김숨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09년 8월
평점 :



정말 질긴 게 사람 목숨이다. 라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혀를 차대며 하던 말이 떠오른다. 한결같이 궁상스럽고 구질구질하게 연명하는 이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지 끊어질듯 가늘게 그러나 오래도록 살았다. 아직은 삶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사람의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리고 미숙함과 무지함으로 그 구차한 삶을 그만 청산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반백년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욱 두렵고 싫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와 나란히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같은 크기만큼 깊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작품의 화자(話者)인 일곱 살 계집아이‘동화(冬花)’의 말처럼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징글징글할 만큼 질긴 목숨을 타고났다는 것이, 나는 괜히 기분 나쁘고 싫기만 했다.”는 그 생명력이 사실 가증스럽기만 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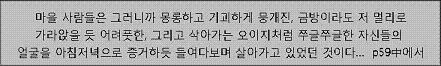
이 처럼 찌들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로 부터도 소외된 움막집과 축사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모두가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을 어느 때 부터인가 알게 되었고, 아무리 닦아도 흐려터지기만 한‘거울’처럼 사람이란 비밀스럽고 의뭉스러우며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도 알아버렸다.
곁에 있어주어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아빠와 함께했다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자란 어린아이의 불안이 느껴진다. 훌쩍 떠나버린 엄마, 아파트를 지으러 떠났다는 아빠가 맡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란 아마 독한 년이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골방에 누워만 있는 전신불수의 할아버지, 외팔이 방앗간 할마, 초라한 구멍가게의 하얀 백태가 낀 눈을 한 옥천 할마, 움막에 살며 노예처럼 담배 잎을 수확하는 간질병 장대아저씨, 아비도 없는 아이를 배어 학교에서 쫓겨나 마을로 돌아온 정수언니, 아들을 먼저 보내고 실성한 인자 아줌마, 양은대야 공장장하고 바람나 집을 나간 춘자 고모, 얼굴이 사란 진 것만 같은 태식이 삼촌의 아내...그리고 축사에 사는 양은대야 공장의 비밀스런 노동자들....
“넌 얼굴이 못생겨서 공순이나 되어야겠구나.”하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하는 아이에게 세상의 저주 말고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진정“천년만년 재수 없게”라는 말이 찰싹 들러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무성하다. 그러나 모질게도 이들의 구질구질한 삶은 길기기만 하다. 그러니 아무리 핥아대도 사라지지 않는 수저에 새겨진 목숨‘수(壽)’자가 왜 혐오스럽지 않았을까. 온통 백랍을 칠해 놓은 듯 흐려터지기만 한 마을의 거울들이 사람들의 그 의뭉함과 겹쳐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세상인 듯만 하다. 그럼에도 우린 그네들 속에서 그네들과 울고 웃으며, 세월을 이겨나간다. 어느 순간 뿌옇기만 했던 거울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오듯이.
“살고 보니 백년이 하루다...백년이 하루다...”하는 옥천 할마의 마지막 운명의 한마디처럼.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질기디 질긴 사람의 목숨은 떠나간다.
엄동설한 속에 피어난 꽃, 동화의 꾸밈없는 시선과 우리네 어느 고향의 언어로 소박하게 빚어낸 이 작품은 그렇게 우리들의 가슴에 조용히 들어앉는다. 가난을 비참하지만은 않게, 음흉한 사람의 속을 사악하지만은 않게, 기형적인 사람들을 마냥 기이하지만은 않게 하는 평온하고 아련한 추억의 이야기가 되어 들려온다. 그래 마냥 지속 될 것만 같던 상처와 불운, 좌절과 절망감도 어느 순간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우린 그래서 살아가는 것일 게다. 모처럼 번잡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기분을 갖는다. 작가의 사랑이 그득 배어있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