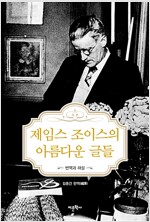누가 초록빛 숲 사이로 지나가느뇨.
봄 물결로 그녀를 온통 치장하고?
누가 경쾌하게 초록빛 숲 사이로 지나가느뇨.
그걸 한층 즐겁게 하려고?
누가 햇빛 속으로 지나가느뇨.
가벼운 발걸음 알아채는 길로?
누가 경쾌한 햇빛 속으로 지나가느뇨.
그토록 순결한 용모를 하고?
수풀의 길들이
포근하고 금빛 불로 온통 번쩍이니...
(이하 생략)
<실내악> 제 VIII수 中에서
참, 하나 재밌는 얘기로 시작해야겠다. 그의 시집 『실내악』의 제목이 정해진 에피소드인데, 제임스 조이스는 한 여인에게 ‘실내악’에 수록된 몇 편의 시를 읊어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여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방의 칸막이 뒤에 있던 요기(尿器)에서 소리가 나더란다. 아이쿠! 시집 제목을 ‘실내악’이라하자. 라고 했다나?....ㅋㅋ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를 읽기에 앞서 일종의 워밍업을 시작했다. 그의 시집인 『실내악 (Chamber Music)』부터 중편 시(詩)인 「지아코모 조이스」, 그리고 '꼼꼼한 비속성‘의 문체라 불리는 『더블린 사람들』, ’스티븐 데덜러스‘라는 유명한 소설 속 인물을 낳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거쳐 『율리시즈』의 몇 장(章)을 읽는 사전 학습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작품들이 상호 문체와 주제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독서 행위에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내 딴에는 야심찬 도전인데, 수많은 외래어들의 중첩과 언어유희, 텍스트의 복잡성 등 『피네간의 경야』를 읽어 내겠다는 소심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다. 영문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전혀 지니지 않은 내겐 올 한 해를 꼬박 넘기는 지리한 독서 행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사전적 독서 중, 생각지 못한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1914년 쓰여진 조이스의 자전적 경험이 배어있는 「지아코모 조이스(Giacomo Joyce)」 라는 산문시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고려대 김종건 교수가 편역한 『제임스 조이스의 아름다운 글들』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조이스의 여느 소설들과는 달리 섬세하고 평이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친근하게 읽어 낼 수 있다는 반가움이랄 수 있다.
자신에게 영어과외를 받던 학생에 대한 연정을 그리려 했던 듯 한 작품이다. 영문학사에 있어서도 “산문시의 새로운 창조로 문학적 혁신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받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탈고하고 『율리시즈』를 쓰기 시작할 무렵인 그의 성숙기 산물이어서 아주 잘 익은 과일을 먹는 느낌을 준다.
미지의 여학생을 향한 조이스의 에로틱한 감정의 관찰과 표현이 단연 압권이다. 아래의 시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누구? 짙고 향기 어린 모피에 둘러싸인 창백한 얼굴, 그녀의 동작이 수줍고 신경질 적이다.”
아주 작은 움직임에까지 미세한 관찰의 시선이 느껴진다. 사랑에 빠진 누군가의...., 그러니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목소리는 유식함으로 여겨지고, 작은 깜빡임조차 그의 시선을 장악하곤 떨림으로 어쩔 줄 모르게 한다.
“맥 빠진 비엔나식 이태리어로 가르랑 거린다: 정말 유식하지! 긴 눈꺼풀이 깜박이며 치뜬다: 따끔한 바늘 끝이 벨벳 홍채 속을 찌르며 전율한다.”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자책하는, 대상의 순결과 무심한 아름다움이 반어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그렇게 그녀는 단테 곁에 순진한 자만심으로 걸었다. 그리고 그렇게, 피와 폭력에 결백한 채, 첸치의 딸, 비아트리체는 그녀의 죽음을 향해:”
“나의 수치가 그 위에 영원히 이글거릴, 불결하고 아름다운, 책장들을 매만졌다. 부드럽고, 차갑고, 순결한 손가락들, 저들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가?”
“결구: 나를 사랑하라. 나의 우산을 사랑하라.”
- 『제임스 조이스의 아름다운 글들』 김종건 편역(어문학사, 2012.10刊) 中에서
이제 “나의 조국의 도덕사”이자 “나의 사랑하는 불결한 더블린(Dear Dirty Dublin)"의 15작품의 독서로 생각을 옮겨야겠다. 가끔은 예기치 않은 문학적 수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