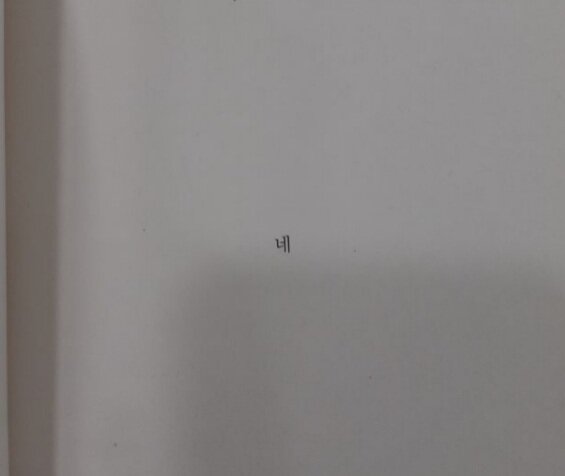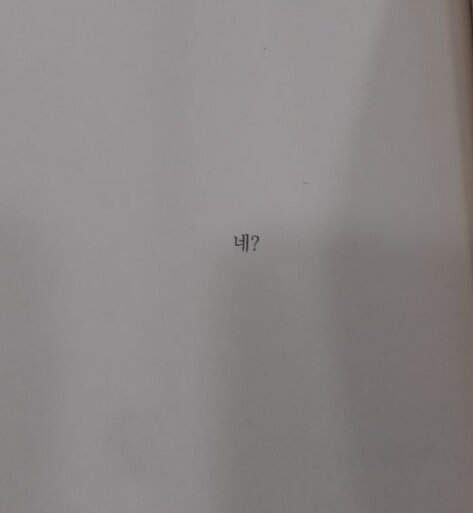2017년 ˝부록;낱장의 형태˝라는 개인전과 연계해 발간된 책이다. 작가 박지나의 글과 전시했던 작품의 사진, 객원필자의 글이 묶여있다. 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도록이나 전시회의 팜플릿 외에) 전시와 연계한 책이 주는 색다른 경험이 신선했다. 전시가 한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데에 반해, 책은 몇년이 지난 후에도 감상이 가능하다.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날 수 있고, 글과 작품을 모두 접하면서 작품과 더 밀도있게 만나는 느낌이었다. 워낙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 전시 가기 전에 작가에 대해 책을 읽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이렇게 책이 하나의 전시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래서 책도 실물 전시도 같이 경험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조금 아쉬웠다.
˝낱장˝을 강조하는 전시를 하고, ˝낱장˝들의 묶음인 책을 냈다는 점에서 해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낱장을 개인으로 치환하면, 전체 구조 속에 편안하게 눌려있지 않고 떨어져나와 위태롭게 흔들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겹치기도 한다.
˝불안정하게,서 있는 이 낱장들은 앞의 부록과 달리 아예 아무 내용이 없지만 자신의 무게에 못 이겨 등이 굽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종이는 단지 그 스스로의 무게에만 못 이긴 것이 아니다.˝ -87p
˝네˝라고 쓰인 낱장들의 전시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직장인이라면, 넵병에 걸려본 일이 있는 을이라면 누구든, 그 이미지에서 조금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이 와중에 뭔가 알 것 같이 보이는 낱장의 ‘네‘, ‘네‘들이 벽에 둥둥 떠 걸려 있다. 어떤 네가 가만히 대답할 때를 기다리고, 어떤 네가 빙빙 돌아가고, 어떤 네가 획획돌아가며, 응답 중이다. 작가는 이 작품이 ˝나를 가능하게 하는 선재적 타자를 위한 응답˝이라고 한다. ‘네‘들은 내가 올 것을 알지 못했지만 작품 앞에 서서 응답을 받는 우리들을 타자로 만든다. 작품 앞에서 나는 작가가 미리 응답을 내고 기다렸던 타자가 된다.˝ 89p
˝타자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작가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90p
˝책˝이라는 글자에 저항하지 못하고 펼쳤다가, 전시 하나를 감상한 기분 좋은 독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