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도다
다빙 지음, 최인애 옮김 / 라이팅하우스 / 2017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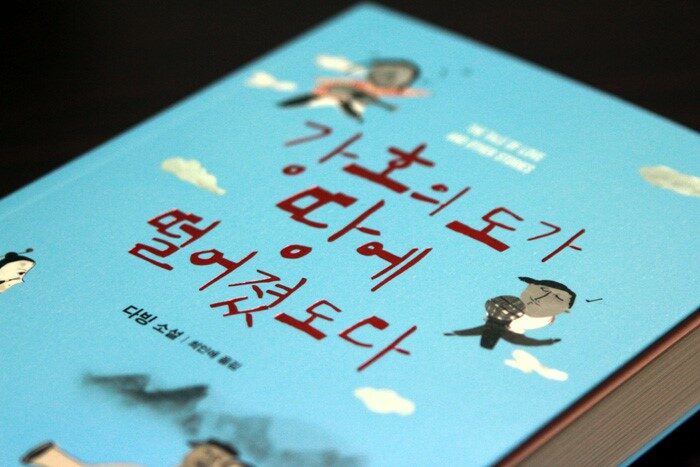
지난 겨울의 끝자락이었던 2월에는 중국 작가들의 책에 꽂혀 한동아 정신없이 그들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주로 옌롄커와 류전윈 작가의 책들이었는데 문혁 시절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어두운 중국사를 엿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 읽은 자칭 ‘야생 작가’이자 중국의 신세대격인 바링허우 세대 다빙 작가의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도다>는 기존 중국 작가들이 구사하는 엄숙한 시대상을 다룬 소설들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기성 작가들이 고난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을 문제의식으로 삼았다면, 산둥 미술학원 출신으로 리장 주점의 주인장이자 배낭여행가라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진 바링허우 세대 다빙 작가는 실화소설이라는 장르로 독자의 마음을 폭격한다.
모두 다섯 편의 실화소설이 담긴 소설집 가운데 역시 타이틀로 선정된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도다>부터 읽었다. 제목만 봐서는 무협지 수준의 일대 활극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기대감부터 들었다. 하지만 내용은 다빙 작가가 서슴지 않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희소라는 남자는 게이다. 자신이 무명이었던 시절부터 돌봐준 상남자 스타일의 희소의 커미아웃에 다빙은 그만 망연자실하고 만다. 희소가 게이라니. 그의 도움을 받아 문인의 길을 걷게 된 다빙이 인세를 받아 절친의 털어 놓을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역설적이게도 강호의 도가 떨어졌노라고 작가는 고백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결혼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형제를 위해 싸아니 다빙은 결혼식 사회를 봐주겠노라고 약속했다지. 소설을 쓰기 위해 강호를 주유하면서 정작 자신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와 반성 등이 이어진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를 돕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는 따뜻한 닭고기 수프보다 쓰디쓴 탕국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고 했던가.
중국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골 출신으로 시인이 되겠다는 라오셰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유랑가수로 그 넓디넓은 대륙이라는 이름의 강호를 누비며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남자의 이야기에 그만 뻑이 가버렸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이타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남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 이식된 천민자본주의로 하루가 다르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언젠가 시집을 발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유랑하는 싸나이 라오셰의 이야기 또한 비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화소설이라고 해도 감동이고, 군바리라는 동명의 이름을 다빙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감동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오, 이 작가 제법 글 좀 쓸 줄 아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집에서 최고의 이야기는 <은방울>이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모처에서 은세공 장인의 도제가 되어 은세공품을 만들던 시절의 이야기였던가. 잘 나가는 산둥 미술학원 출신의 미술지망생이 어찌 멋진 은세공품 하나 만들지 못할 것인가 하는 자만심에 도전한 은방울 만들기는 처참한 결말을 불러온다. 싸부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 않고, 한 번 보고 만들라고 하셨던가.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같은 싸부님 휘하에 있던 사저의 이야기였다. 남성판 피그말리온이라고나 할까. 어려서부터 짝사랑하던 남자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결국 바보 온달이를 장군 온달이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직장에서 찌질이 남친을 보필해서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사저의 첫사랑은 비극으로 귀결된다. 그는 항성이었고, 그녀는 그의 주변을 도는 이름 없는 소행성이라고 했던가. <은방울>은 누가 봐도 뻔한 신파조의 사랑과 배신의 드라마지만, 그만큼 재밌었고 결말에서는 찡한 감동이 전해져왔다. 다빙이 만든 은방울을 걸고 있던 소년과 만나는 씬은 이 소설집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다.
<은방울>에서 정점을 찍어서일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흥미가 덜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동굴잠수를 하다가 죽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다이버에 대한 추모, 그래서 삶에서 모험을 즐기는 건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제일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평범한 건축가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멀리 뉴질랜드로 워홀러가 되어 떠나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게 된 S씨 이야기. 문득 퀸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거리예술가로 거듭난 S씨가 어떤 나라 말로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해졌다. 예전에 보스턴에서 일본말로 노래를 부르던 일본 아가씨와 밴드에게 영어로 노래를 부르라고 핀잔을 주던 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말이다. 어쨌든 정해진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을 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빙 작가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별별 이야기가 많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사냥에 나설 다빙과 수많은 청춘들의 삶의 이야기에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