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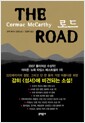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마치 지구 멸망의 날을 겪은 것 같은 그 곳에서 그 둘은 살아남기 위해 따뜻할 거라고 생각되는 남쪽 바닷가로 향한다. 그 둘은 단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식과 부모의 관계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물자들은 하나도 없다. 도대체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 <로드>의 저자 코맥 매카시는 독자들에게 어떤 유추를 해낼만한 그 어떠한 정보도 허락하지 않는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잿빛으로 가득하고, 사방에 죽음이 널려 있다는 것 정도다. 어쩌면 그렇게 저자의 의도대로 책을 읽는 이들은, 그런 인과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죽음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아버지는 사방을 경계하고, 유사 이래 모든 아버지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게임에 나선다. 연명을 위한 식량 확보와 가족의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이 부자(父子)의 일상적인 약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리고 역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어린 아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준다. 죽음을 꿈꾸는 이가 역설적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외부로부터 얻고 싶어 하는 생존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 외에는 모두가 적대적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또래의 사내아이도 모두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정적인 위험요소들이다. 물론 총과 칼 혹은 원시적인 화살로 무장한 이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식량과 보잘 것 없는 물건들을 노리고 있다. 내부는 안전하고, 외부는 위험하다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이분법적 사고는 오늘날을 사는 미국인들의 그것을 닮아 보인다. 9-11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깜짝 놀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대응 말이다.
삶 가운데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듯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우연히 음식과 각종 물자로 가득 찬 벙커를 발견하고 부자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아버지. 왜 이 소설에서 여성성은 제거되고, 남자들만이 등장할게 되었을까? 아마 아버지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어머니가 존재했더라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이야기는 복잡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부장적 시스템’은 노인과 자기 또래의 소년에 대한 인도적인 아들의 발언들에 대해 어떠한 여지도 남겨 두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은 따라야만 하다. 왜? 늘 그래왔으니까.
어쩌면 저자 코맥 매카시는 소설 <로드>를 통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시된 세상의 끝에서 오늘날의 디스토피아를 말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의 해결이나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화는 부재한 가운데, 일방적인 의사소통만이 넘쳐흐르는 현재의 모습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 약육강식 같은 삶의 전쟁터에서 먹고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는 <로드>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이다. 이 소설이 현재, 코엔 형제의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이어 다시 영화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자꾸만 윌 스미스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 <나는 전설이다>와 <행복을 찾아서>의 이미지들이 중첩되는지 모르겠다.
사족으로 카피에 ‘<성서>에 비견되었던 소설’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