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 1%가 기획한 환상에 대하여, 2022 우수환경도서
반다나 시바.카르티케이 시바 지음, 추선영 옮김 / 책과함께 / 2022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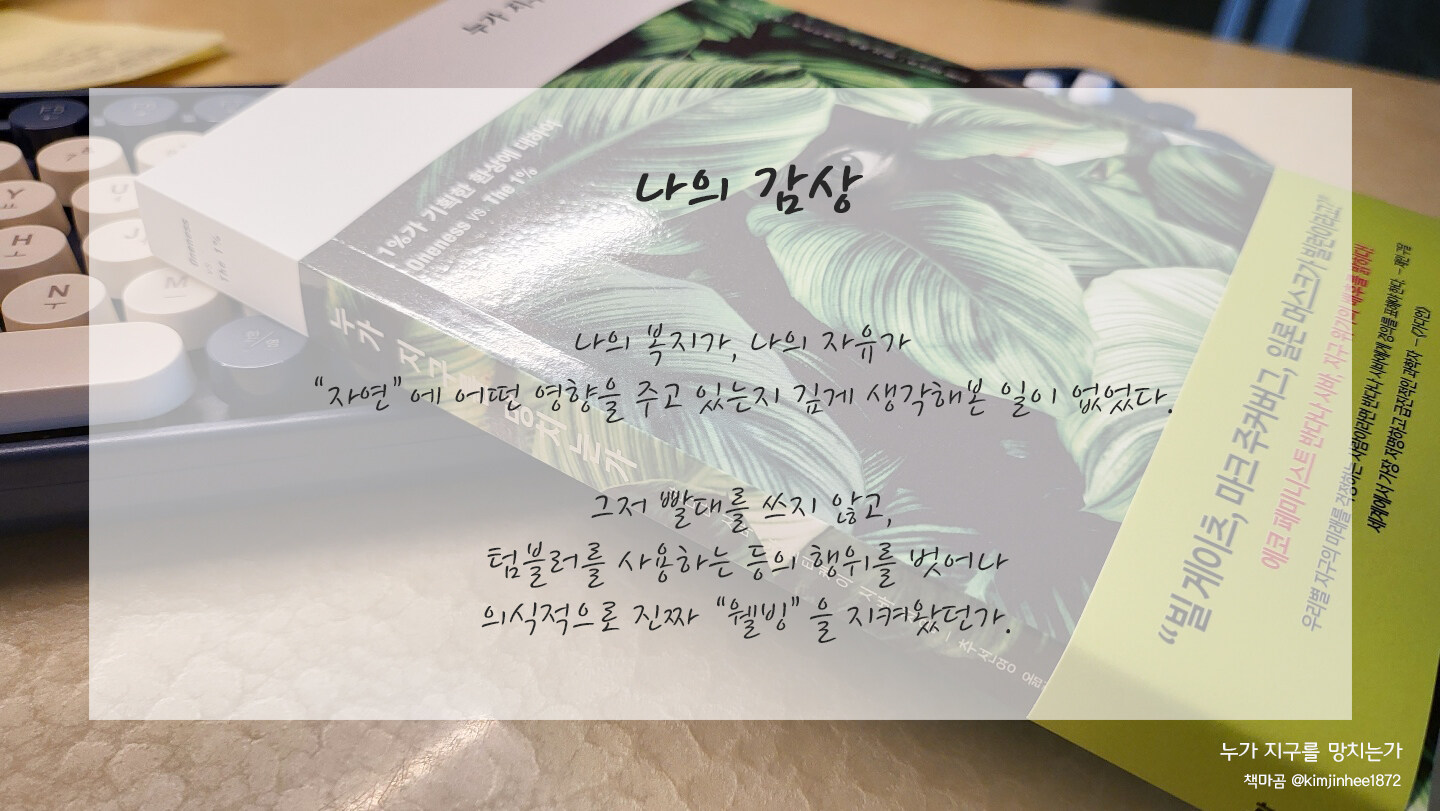
산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의 머리말로 이 리뷰를 시작하는 것은 책을 읽은 후 이 말이 내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꽤 많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편이기는 하나 정말 나의 복지가, 나의 자유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저 빨대를 쓰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벗어나 의식적으로 진짜 “웰빙”을 지켜왔던가.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반성문이 될 지 모른다는 말로, 또 함께 진짜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권유로 시작하고 싶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체계는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을 진보의 길이라고 간주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일이 오늘날의 '발전' 모델에서 가장 폭력적인 측면으로 자리 잡았다. (p.44)
저자를 급진주의자라 불러야 할지 보수주의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저자는 극과 극,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녀는 둘 다라고 말하는 편이 맞겠다.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자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강인함은 급진적임에 가깝다. 사실 환경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나의 시야는 딱 거기까지였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우물 안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기도 했고, 인류가 만나게 될 심각한 미래에 대해 서늘함이 들기도 했다.
진정한 지성, 진정한 종자, 진정한 식량, 진정한 부, 진정한 자유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각할 때 우리의 상상력을 못 쓰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 1퍼센트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p.53)
그렇다면 그 1%는 누구인가? 맞다. 금융이고 기술이다. 물론 조금 보태자면 자연이 인간의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일부 금융과 기술로, 우리에게 깊숙이 교육된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잠재력을 축소해 모든 자연이나 인간을 “금융의 원료”로 환원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잡으면 기술과 금융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공상과학에서 늘 이야기해왔듯, 화성 등 “지구의 대체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혹자는 이 책을 읽으며 다소 불편한 마음을 느낄지도 모르고, '빌런'처럼 거론된 몇몇은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언제인가 지구가 그 생명을 다하면 화성 등의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날 만큼 과학이 발전했으리라고 학습 당해왔다. 그러나 지구가 목숨을 다한 시점에 인류가 살아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또 다른 행성은 지구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보장은? (만약 내가 지구라면 그 행성에 카톡을 보내줄 것 같다. 나를 이렇게 만든 빌런들이 너에게 가고 있다고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구에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자연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 역시 재화로 평가되고 있음도 씁쓸했고.
나는 '보호주의'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구, 가정, 가족,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p.223)
이 문단을 풀어보자면 지구, 가정, 가족,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나의 삶을 생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탱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내가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살아가려면 지구를, 가정을, 가족을, 문화를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환상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쉬이 배워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와 같은 방향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저 우리와 지구의 상관관계만큼은 다시 정립해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해졌다.
자. 이제 당신에게도 이 책을 권하는 나의 당부와 함께 질문을 하나 던진다.
“산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