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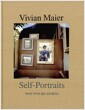
-
비비안 마이어 : 셀프 포트레이트 ㅣ 비비안 마이어 시리즈
비비안 마이어 사진, 존 말루프 외 글, 박여진 옮김 / 윌북 / 2015년 8월
평점 :

품절

내가 어렸을 때에 사진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였다.
공식행사때나 기념으로 찍는 정도?
내가 나이가 많음이 아니라, 문화적 혜택을 그리 많이 받지 못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골집 황토방 천장 한 구석에 나란히 놓여있는 가족들의 사진은 동네의 당연한 인테리어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나에게는 아직 사진은 역사이고, 기록이고, 추억이다.
비비안 마이어.
시카고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생 독신으로 산 그녀의 취미(지금은 특기로 변했다)는 바로 사진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자신만의 기록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무려 12만장..
이렇게 찍은 사진은 그녀가 전문 사진작가로 나서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혼자 간직하기 위함이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녀의 사진들은 그녀의 사후에 발견된 것들이다.
진정으로 사진을 사랑했고, 사진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사진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만을 모은 사진집이다.
요즘이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셀카를 많이들 찍지만, 필름 카메라로 셀카를 찍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진집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사진 구도는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유리, 거울을 이용한 셀프 포토들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그녀의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들이였다.
그림자를 통해 자신이 앵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 무척이나 멋지다.
오히려 이런 사진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다.
그녀의 사진은 멋진 풍경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평범한 우리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의 사진은 그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매력이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사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항상 얼굴이 나와야 하고 멋진 풍경이나 의미있는 무언가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진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그녀가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있지만 난 그녀의 프레임을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어느 공화파 병사의 죽음'으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의미,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진속에 남이 아닌 나를 통해, 나의 앞모습이 아닌 그림자를 통해 또다른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