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희망의 혁명 - 인간적인 기술을 위하여
에리히 프롬 지음, 김성훈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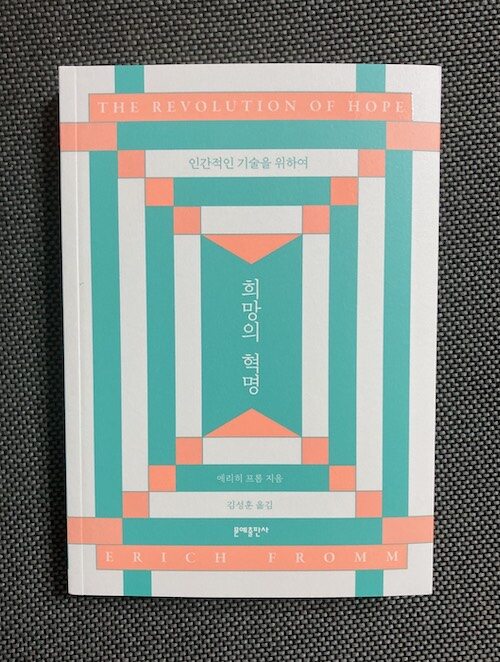
에리히 프롬의 책이다.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보며 에리히 프롬의 글에 빠졌던 적이 있다.
오랫만에 그의 새로운 글을 만났다.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1960년대임을 생각한다면 무척 놀랍다.
방금 전에 쓴 책이라해도 믿겨질 것 같다.
반세기 넘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글은 현 시대에도 유효하다.
책 앞부분의 글이다.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을 의심했다.
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당시에도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기계화를 걱정했던 것이다.
희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희망일까?
그렇다면 더 좋은 차와 집, 가전제품 등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소비를 욕망하는 사람일 뿐이다.
희망의 대상이 어떤 사물이 아니라 더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일 때, 끝없는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해방일 때 진정한 희망이 된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저자는 원하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일 때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희망은 역설적이다.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도 아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비현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희망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희망이 약한 사람은 안락이나 폭력에 안주한다.
하지만 희망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모든 신호를 눈으로 보아내고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태어나려 하는 것의 탄생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희망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꿈이다.
희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꿈은 꾸지만, 희망은 갖는다고 말한다.
지금 꿈만 꾸고 있는가, 희망을 품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부활이다.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의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어제와 같은 나는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은 상태이다.
오늘날 이 시스템의 지침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원칙은 무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최대 효율과 최대 출력의 원칙이다.
이 원리를 반세기 전에 생각했던 것도 놀랍고, 그 원리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더 놀랍다.
오늘날에는 이 원리가 더욱 강해져 보인다.
첫 번째 원칙은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 원칙은 사회,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원칙을 잘 따르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이 시스템은 누가 정하고, 만들었을까?
이 시스템은 옳은가? 다른 시스템은 없을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인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을 가져본다.
책의 마지막 글이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까?
남아있다고 본다. 그렇게 믿고 싶다.
기술은 인간이 편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자.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란 단어로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박식하고 깊은 통찰을 볼 수 있다.
그의 유려한 문체는 덤이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