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소설>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처음으로 신간평가단 되고나서 처음 신간 추천 페이퍼 썼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끝자락에 도달해 있다. 개인적으로 폭풍같은 한 주와 우울로 아슴아슴해지는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분노도 그대로고 슬픔도 그대로다. 그러면서 가는 거겠지. 이러면서 안고들 가는 거겠지. 그렇게 버티고만 있다. 지금은 바닥없는 공간을 유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된다. 둥둥 떠다닐 수록 내 몸은 더욱 더 예민해지고 내가 했던 것들과 보았던 것들을 더 잘 기억하게 해주니까.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
어쩌면 그런 내게 조금의 중력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8월의 신간 다섯 편을 꼽아 본다.

'이민자들'을 읽고나서 제발트에 빠지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을유에서 '아우스터리츠'가 나오더니 드디어 '토성의 고리'가 세번째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제발트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죽기전(왜 정말 반할만한 작가들은 일찍 죽는 것인지...) 네 편의 소설만 세상에 남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될 것도 단 하나만 남은 셈이다. 그렇게까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니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어쩐지 지구에서 토성까지 파이오니어호가 갔던 그 세월 만큼 천천히 읽고픈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사무치게 그리웠던 제발트의 육성을 코 앞에 두고 있으니 그 유혹을 어찌 견딜까 싶기도 하다.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멸'과 더불어 아마도 오래도록 곱씹게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존 코널리의 데뷔작이다. 사립탐정 찰리 파커 시리즈의 첫 작품이기도 한 이 소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하나는 주인공의 이름이 내가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의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의 매력을 알고 싶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버드'를 볼 것.) 다른 하나는 사립탐정물이라는 것이다. 가족 모두를 살해한 연쇄살인마를 추적하는 복수의 여정은 많이 반복된 소재이긴 하지만 사립탐정에게 새겨진 상처는 그것 자체가 매력이 되므로 어떻게 살려나갈지 기대가 된다. 사립탐정에게 범인이란 늘 그 자신이 풀어야 할 삶의 숙제와도 같다. 찰리 파커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시선과 사유의 선율을 들려줄 것인가?

'독서의 역사' '밤의 도서관'등 책을 좋아하는 이들로서는 참으로 지나치기 어려운 책을 써내었던 알베르토 망구엘이 이번에는 소설로 다가왔다. 대략의 소개글을 보니 아무래도 '밤의 도서관'의 소설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물이 되었달까? 왜냐하면 '밤의 도서관'에서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혹은 지닐 수 있는 모든 의미에서 마치 거미줄을 뻗치듯 촘촘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나갔던 것과 똑같이 이 소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인물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망구엘의 얼기설기 엮어내는 태피스트리 기법이 소설로는 어떻게 펼쳐질런지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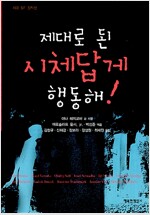
체코의 SF라면 카렐 차펙 밖에는 모르지만 선집한 이가 야로슬라프 올사 쥬니어와 박상준이라면 한 번 읽어보고 싶다. 거기다 강렬하면서도 마구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저 제목이 기꺼이 그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게 만든다. 세월이 좀 흐른 것에서 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그지없이 생소하기만한 이 10편의 작품들이 과연 어떤 맛을 느끼게 해 줄 지 기대가 된다.

내가 이 소설을 선택한 것은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의 대상 수상작이라서가 절대 아니다. 순전히 순정만화가의 일상에 대한 리얼한 묘사가 담겨 있다는 한 서평가의 말 때문이다. 예전부터 그 일상이 궁금했었는데 제대로 한 번 엿볼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