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그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드러난 자취지요. 그린 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는 이도 그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립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공감은 그린 이와 보는 이의 욕구가 겹칠 때 일어나는 작용이겠지요.(9쪽)
감상이란 공감이나 소통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글, 음악, 춤 그 밖에 사소하게 보이지만 마음을 담아내는 창작활동이라면 그림과 마찬가지 아닐까?
(자연의 이치나 과학적 언어로 얘기하는 글을 제외하고)
서로 그리운 거,
그래서 공감하는 거,
이건, 손철주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림을 그린 이와 보는 이의 욕구가 겹칠 때,
글을 쓴 이와 읽는 이의 욕구가 겹칠때,
노래를 부르는 이와 듣는 이의 욕구가 겹칠 때,
춤을 추는 이와 즐기는 이의 욕구가 겹칠 때,
서로 그리워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마찬가지로, 손철주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림, 글, 음악, 춤 그 밖의 창작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움이 걷히고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욕구가 겹치는 누군가를 만났을때,
서로 그리워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이를 위해 화장을 한다.(士爲知己者用, 女爲悅己者容)`는 말이 나온게 아닌가? 아님, 말고~ㅠ.ㅠ
암튼, 나는 내 리뷰나 페이퍼에 공감과 추천과 댓글을 남겨주는 이들 덕에...내 허름한 일상을 끄적거릴 수 있는거다.
그게 눈물나게 고마운거다, Thank you.

다, 그림이다
손철주.이주은 지음 /
이봄 / 2011년 11월
<다, 그림이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삶과 개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씌여지다 보니,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 미술의 완전한 만남`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도,
글에서 느껴지는 공감과 욕구의 정도, 즉 몰입할 수 있는 정도가 달랐다.
한사람은 모두 비워내고 공허하게 웃고 넉넉하게 풀어낸다.
`색즉시공(色即是空)`과 `빙심(冰心)`을 넘나든다.
다른 한사람은 새침떨며 움켜쥐고는 어쩔 줄 몰라한다.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돈과, 아이와 남편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독립된 방`을 얘기한 `버지니아 울프`를 예로 드는가 싶다가는,
그녀의 불우한 결론을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영혼의 자유를 위해 사람들은 또 다른 구속을 끊임없이 선택합니다.`라며 얼버무리는 듯 하다가,
이내 `현실에서 보헤미안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하며 그 선택마저 다른 이에게 넘겨버리고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인용하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지, 내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바람이 부니까요.
Anyone can see, nothing really matters to me. Anyway the wind blows.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anyone은 everyone이 아니라는 거다.
처음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너무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그 둘을 한꺼번에 감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을때는 버거웠었는데,
(감상은 공감이나 소통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는 위에서 얘기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행인것 같다.
공감이나 소통이라는 건, 다시 말해 감상이라는 건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둘의 것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둘의 것이 모범 답안이어서 우리의 것이 그것에 일치여부에 따라서 O나, X가 매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는데,
그게 어떤 이의 욕구와 마침 겹쳐 공감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의 욕구와는 어긋날 뿐인 것이다.
감상이란, 공감이나 소통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다.
먼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
한사람은,
`전부를 볼 수 있는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눈과 다름없어요.`라고도 하고,
`삶인가 싶은데 죽음 같기도 하고, 이것인가 했는데 저것을 말하기도 하는 그림들에, 또 그러한 삶의 모습에 저의 눈길이 머뭅니다.`라고도 한다.
어찌보면 이건 경계 없음, 즉 초월이나 해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자의 그것은 혼돈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사람은, `이인상`의 `와운`을 혹애한다며 예로 든다.
화가는 취필이라며 얼버무리는 그림에서,
비길 데 없는 생애의 고통을 읽어내고는,
슬픔을 노골화하지 않고 눌러담는 화가의 심정을 못내 애처롭고 아름다워 한다.
먹구름은 잔뜩 물방울을 머금고 있다가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린다.
햇살을 보려면, 먹구름을 참고 견뎌야 한다.
비장미(억눌러서 장한 아름다움)-이것이 그가 삶을, 그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리움이 되면 시선과 입장의 차이가 좀더 명확해진다.
한사람의 그리움은 기다림이 되고,
그게 깊어지면 怨이 되거나 恨이 된다.
원한, 원망으로 뭉친 그리움은 서글프고 안쓰럽다.
당연 가슴 설레는 그리움도 있고, 헛된 기다림도 있다.
모진 기다림 끝에 병을 앓기도 한다.
다른 한사람의 기다림은 가녀린 달빛이거나 야윈 달이다.
잡을 수 없는 꽃잎, 텅빈 풍경이기도 하다.
`트로이 전쟁`의 전설과 관련된 고흐의 `아몬드꽃`,
어느날 아침 신문에서 보았던 어느 부녀의 어릴 적 사진,
첫사랑을 찾으러다니는 영화 `김종욱 찾기` 등
설렘과 떨림과 오랜 기다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더 이상 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애틋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
다시말해,
한사람의 그것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앓아본 사람의 그것이어서 쉽게 와 닿았다면,
다른 한사람의 그것들은 자신도 경험해본적 없어 책이나 신문이나 영화를 인용하는 간접 경험이다.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데요? 끝을 내지 않으면 좋은 느낌 그대로 두고두고 남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언젠가는 빛바래질까 봐, 또 행여 끝이 보일까 봐 두려워서, 도저히 사랑을 지속할 용기가 없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사랑하기를 멈추어요. 마치 벚꽃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꽃잎을 모두 떨어뜨려 흔적더 없이 공중에 흩어 버리듯 말입니다. 시꺼멓게 시들어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으려고 생살을 잘라내듯 아까운 꽃잎들을 바람에 내맡겨 버리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상처가 될 지도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겁한가요.(48쪽)
사랑과 마찬가지로 상처란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도, 무뎌질 수 없음을 아마 모르나 보다.
유혹에서도 두사람의 입장은 차이가 난다.
한사람은 유혹을 치명적이나 너그럽고 또 슬픈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사람은 아예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빗대어서 시작한다.
`가끔, 특히, 정말, 문득, 아주, 바로, 늘, 모든, 너무` 등의 부사를 남발하여,
(부사가 하는 일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거지, 주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언으로 표현되는 감정들이 아니라, 주어인 그를 과장되게 수식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나마 그 부사의 남발로도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들은 편지를 쓸 때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꽃이나 풀을 말려 편지지에 붙이곤 했는데, 편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라도 집집마다 꽃말사전 하나쯤은 기본으로 있어야 했다`고 얼버무리는 겁쟁이다.
꽃보다는 과일이 좀 더 농염한 성적 유혹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
바쿠스의 포도주를 권하며 어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 본능대로, 감정가는대로 살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
실천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말뿐이다.
성공과 좌절 부분부터 다른 한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리기 시작한다.
성공이나 좌절 같은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고서라도,
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성실함으로 답이 찾아지지 않는데도, 계속 성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은 또 다른 내 모습이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감상이 공감이나 소통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감이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면에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리라.
한사람은 자화상과 초상화를 보면 그 인물의 마음 밑바닥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걸로 미루어,
자신 또한 내면의 밑바닥에 이미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사람은 `아직 제 마음속의 자화상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얘기가 뜬구름 잡는 식이다.
나이와 관련하여,
한사람은 사람의 한평생을 70쪽으로 나누고 앞 40쪽은 본문, 뒤 30쪽은 `주석`이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에서 강윤후의 시 `불혹 혹은 부록`이 생각났다.
한사람은 나이 듦의 씁쓸함을 넘어 해학 또는 해탈을 얘기한다.
신선놀음쯤으로 승화시킨 것 같다.
다른 한사람은 노인의 탐욕과 추함을 앞에 내세운다.
이쯤되면 나이 듦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리고는 젊음과 나이듦, 삶과 죽음,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대조를 통하여...
젊음의 발산과 늙음의 그냥 다 써버리고 모두 내어주는 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찌 좀 억지스럽다.
일탈은 취미와 취향과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옛사람의 일탈은 일탈이라기보다는 유머감각에 가까웠나 보다.
기껏해야 술을 빙자한 술탈 정도.
하지만, 예술이 일탈에서 태어난다는 것 또한 모르지 않는다.
고치기 힘든 취미를 `벽癖`이라고 하는데, 일탈의 연장선 상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옛글을 보면 `아름다운 옥일수록 흠집이 많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벽이 많다`고 해서 이 벽을 기특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단다.
중국의 문인 장대張岱는 이런 글도 남겼단다.
`사람이 벽이 없으면 사귈 수 없다. 깊은 정이 없기에 그렇다. 사람이 흠이 없으면 사귈 수 없다. 참된 정이 없기에 그렇다.` (207쪽)
그동안 벽이 있다거나 취향이 독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공감하거나 소통하기 힘들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옛글과 장대의 문장을 들이밀어야겠다, ㅋ~.
하루종일 주워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들어야 하지만, 그 말들은 어느 하나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빙빙 맴돈다.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주고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춥고 등이 시려운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편견이나 원칙을 사람보다 앞에 두고, 의심과 이기심으로 소통을 방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화가가 그려놓은 동그라미를 가지고,
"원이요."
"해님이요."
"無요."
"마음이요."
답도 없는 해석에 연연하여 소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왜 김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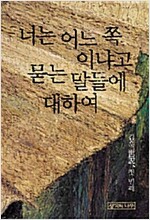
젊은 날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분간하지 못했다.
말하기의 어려움과
말하기의 위태로움과
말하기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형적 질서에 하자가 없으면 다 말인줄 알았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김훈 지음 / 생각의나무 / 2007년 12월

강허달림 1집 - 기다림, 설레임
강허달림 노래 /
씨제이 이앤엠 (구 엠넷) /
2008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