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폭설이다.
근처 학교에서 불이야~ 가 아니라 눈이야~ 외치는 남자고등학생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편한테 전화.
눈 엄청 와.
그러게.
나 어떻게 가지?
살살 와야지. 사알살.
못 가. 앞이 보이지도 않고 미끄러질 것 같고 이 날씨에 어떻게 운전을... 주절주절...
조금 늦을텐데.
안돼. 네시 삼십분까지 우리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도록 해욧!
...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운전 베테랑인 남편이라 해도 차마 바퀴를 떼지 못할 눈이다. 폭설이다.
집에 어떻게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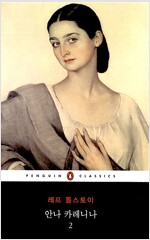
요즘 펭귄클래식에서 나온 <안나 카레니나>를 읽는 중이다. 밤에 짬짬이 읽는 맛이 일품이다. 원래 작가정신에서 출간된 책을 갖고 있었는데 서점에서 이 책을 몇 장 넘겨보고 유려하고 깔끔한 문장이 새롭게 보여 또 구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얼마 전 <어느 책 중독자의 고백>을 읽으며 나는 이 정도는 아니네, 하면서 안도와 동시에 질투를 느꼈는데 그 질투심이 어째 불안불안 하더니만 진정한 중독자의 반열에 들어서려나 보다. 있는 책 또 사기. 이번이 몇번째인지.
하여간 대단한 책. 인간이란 19세기든 20세기든 21세기든 어찌 그리 똑같은지. 당신이 만약 폭설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면 어떤 책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않고 안나 카레니나요! 하겠지만은 마침 그러고 나니 다른 책들이 모락모락 떠오르고. 기왕이면 도서관이나 영풍문고 같은 데 갇히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영달이가 보고싶고... 그나저나 집에 어떻게 가지?

다락방님 서재에서 보니 너무 반가웠다. 마침 이 책을 주문해서 읽고 있었기에. 카뮈가 그르니에 선생님에게 예를 갖추며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노심초사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실망을 안길까봐 소심해하는 인상이, 참말로 새롭다. 촘촘하고 완고한 그의 책을 읽을 때보다 어째 더 긴장하는 내 모습도 새롭고.
어느 광고 문구처럼 '같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서한집이다.
나랑 같이 편지 친구하실 분? 또박또박 편지 쓰고 싶다. 정말.